본문내용
투펭귄
킹펭귄
턱끈펭귄
피오르드랜드펭귄
황제펭귄
훔볼트펭귄
펭귄과의 바다새로서 6속 18종이 있다.
압테노디테스펭귄속 :황제펭귄, 킹펭귄이 이에 속하며 키가 약 80~90cm이고 아남극권에서 집단 번식한다.
젠투펭귄속 :아델리펭귄, 젠투펭귄, 턱끈펭귄이 이에 속하며, 남극 및 아남극에서 분포하며 갑각류나 플랑크톤 등을 잡아먹으며 알은 보통 한배에 2개 낳는다.
마카로니펭귄 :피오르드랜드펭귄, 스테어스펭귄, 볏왕관펭귄, 남부바위뛰기펭귄, 북부바위뛰기펭귄, 마카로니펭귄, 로열펭귄이 이에 속하며, 눈 위에 금색을 띤 연노랑 깃다발이 있으며 아남극권의 섬에 번식하며 한배에 2개의 알을 낳는다.
노란눈펭귄속 :노란눈펭귄이 이에 속하며, 뉴질랜드 남부와 그 주변 해역에 번식한다. 풀이 있는 바닷가 비탈진 곳에 2개의 알을 낳는다.
쇠푸른펭귄속 :쇠푸른펭귄이 이에 속하며, 키 40cm 미만으로 펭귄 중에서 키가 가장 작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분포하고 있다.
훔볼트펭귄속 :자카스펭귄, 훔볼트펭귄, 마제란펭귄, 갈라파고스펭귄이 이에 속하며,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아카의 온난한 해역에서 생활한다.
곧추 서서 걸으며 헤엄치기에 알맞게 날개가 지느러미 모양이고 앞다리의 날개깃은 변형되어 있다. 깃털은 짧고 온몸을 덮는다. 골격을 구성하는 뼈는 일반 조류와 마찬가지이지만 결합 부위가 편평하고 어깨뼈가 발달했다. 가슴뼈에는 낮은 용골돌기가 있는데, 이는 날개가 물속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화하면서 가슴 및 목 근육의 구성이 달라진 것과도 관계가 있는 듯하다. 다리 및 허리 부위의 골격과 근육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정강이뼈와 발가락 사이의 부척골(蹠骨)이 몹시 짧다. 헤엄칠 때에는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장기의 경우, 장(腸)이 긴 것과 앞쪽 위(胃)에 잔돌이 많이 들어 있거나, 다른 새와 달리 뼈에 공기가 들어 있지 않는 등 잠수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었다. 또 호흡·순환계도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과 같이 잠수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펭귄은 바다새 가운데 날 줄 아는 슴새목과 계통적으로 먼 친척 관계인데, 머리뼈의 몇몇 특징과 땅속에 알을 낳는 점, 디스플레이 유형, 날개를 이용하여 잠수하는 것 등의 면에서 비슷하다. 한편 북반구의 잠수성 바다새인 바다쇠오리목은 날개가 작고 날개를 이용하여 잠수하며 땅 위에서는 곧추 선다는 점 등에서 펭귄과 비슷하지만, 유연 관계는 없고 남북반구에서 두 가지 비슷한 생활형의 바다새가 진화한 예로 알려져 있다. 남극의 겨울에 알을 낳고 양육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부화하고 3년 정도가 지나면 번식이 가능해진다. 3, 4월에 집단을 형성하고 5, 6월초에 알을 낳는다. 이때 집단의 규모는 수십 마리에서 최대 수천 마리에 이른다. 암컷이 알을 낳고 먹이를 몸에 비축하기 위해 바다로 떠나면 수컷이 발 위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넣고 품는다. 알을 품고 있는 2~4개월 동안 수컷은 수분 섭취를 위해 눈을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다. 알을 품고 있는 수십~수백 마리의 수컷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고 서서 천천히 주위를 돌다가 바깥 쪽에 서 있는 개체가 체온이 낮아지면 안쪽에 있는 개체와 자리를 바꾸면서 전체 집단의 체온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를 허들(Huddle)이라고 한다. 부화기간은 약 64일이다. 부화한 새끼에게 수컷 펭귄은 자신의 위 속에 있는 소화된 먹이를 토해서 먹인다. 새끼가 부화한지 열흘 정도 후에 암컷이 돌아와 같은 방식으로 먹이를 주고, 이후로 수컷과 암컷은 번갈아 가며 바다로 나가 먹이를 비축해 돌아온다. 생후 40~50일이 지나면 부모 펭귄 모두 바다로 나가 먹이를 비축하고, 남은 새끼들이 집단을 이루어 허들 행위를 한다. 12월, 1월이 되면 집단 전체가 바다로 나간다. 하지만 지금 펭귄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란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기후와 동식물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환경이 바뀌고 있는 현상이다. 제일 큰 문제점은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녹아서 바다로 흘러드는 바람에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해수면 상승은 섬이나 해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해안에 가까운 도시에는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북극곰이나 펭귄을 비롯한 여러 동물이나 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이 사라지고 사막이 생길 수 있으며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의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킹펭귄
턱끈펭귄
피오르드랜드펭귄
황제펭귄
훔볼트펭귄
펭귄과의 바다새로서 6속 18종이 있다.
압테노디테스펭귄속 :황제펭귄, 킹펭귄이 이에 속하며 키가 약 80~90cm이고 아남극권에서 집단 번식한다.
젠투펭귄속 :아델리펭귄, 젠투펭귄, 턱끈펭귄이 이에 속하며, 남극 및 아남극에서 분포하며 갑각류나 플랑크톤 등을 잡아먹으며 알은 보통 한배에 2개 낳는다.
마카로니펭귄 :피오르드랜드펭귄, 스테어스펭귄, 볏왕관펭귄, 남부바위뛰기펭귄, 북부바위뛰기펭귄, 마카로니펭귄, 로열펭귄이 이에 속하며, 눈 위에 금색을 띤 연노랑 깃다발이 있으며 아남극권의 섬에 번식하며 한배에 2개의 알을 낳는다.
노란눈펭귄속 :노란눈펭귄이 이에 속하며, 뉴질랜드 남부와 그 주변 해역에 번식한다. 풀이 있는 바닷가 비탈진 곳에 2개의 알을 낳는다.
쇠푸른펭귄속 :쇠푸른펭귄이 이에 속하며, 키 40cm 미만으로 펭귄 중에서 키가 가장 작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분포하고 있다.
훔볼트펭귄속 :자카스펭귄, 훔볼트펭귄, 마제란펭귄, 갈라파고스펭귄이 이에 속하며,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아카의 온난한 해역에서 생활한다.
곧추 서서 걸으며 헤엄치기에 알맞게 날개가 지느러미 모양이고 앞다리의 날개깃은 변형되어 있다. 깃털은 짧고 온몸을 덮는다. 골격을 구성하는 뼈는 일반 조류와 마찬가지이지만 결합 부위가 편평하고 어깨뼈가 발달했다. 가슴뼈에는 낮은 용골돌기가 있는데, 이는 날개가 물속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화하면서 가슴 및 목 근육의 구성이 달라진 것과도 관계가 있는 듯하다. 다리 및 허리 부위의 골격과 근육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정강이뼈와 발가락 사이의 부척골(蹠骨)이 몹시 짧다. 헤엄칠 때에는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장기의 경우, 장(腸)이 긴 것과 앞쪽 위(胃)에 잔돌이 많이 들어 있거나, 다른 새와 달리 뼈에 공기가 들어 있지 않는 등 잠수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었다. 또 호흡·순환계도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과 같이 잠수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펭귄은 바다새 가운데 날 줄 아는 슴새목과 계통적으로 먼 친척 관계인데, 머리뼈의 몇몇 특징과 땅속에 알을 낳는 점, 디스플레이 유형, 날개를 이용하여 잠수하는 것 등의 면에서 비슷하다. 한편 북반구의 잠수성 바다새인 바다쇠오리목은 날개가 작고 날개를 이용하여 잠수하며 땅 위에서는 곧추 선다는 점 등에서 펭귄과 비슷하지만, 유연 관계는 없고 남북반구에서 두 가지 비슷한 생활형의 바다새가 진화한 예로 알려져 있다. 남극의 겨울에 알을 낳고 양육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부화하고 3년 정도가 지나면 번식이 가능해진다. 3, 4월에 집단을 형성하고 5, 6월초에 알을 낳는다. 이때 집단의 규모는 수십 마리에서 최대 수천 마리에 이른다. 암컷이 알을 낳고 먹이를 몸에 비축하기 위해 바다로 떠나면 수컷이 발 위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넣고 품는다. 알을 품고 있는 2~4개월 동안 수컷은 수분 섭취를 위해 눈을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다. 알을 품고 있는 수십~수백 마리의 수컷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고 서서 천천히 주위를 돌다가 바깥 쪽에 서 있는 개체가 체온이 낮아지면 안쪽에 있는 개체와 자리를 바꾸면서 전체 집단의 체온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를 허들(Huddle)이라고 한다. 부화기간은 약 64일이다. 부화한 새끼에게 수컷 펭귄은 자신의 위 속에 있는 소화된 먹이를 토해서 먹인다. 새끼가 부화한지 열흘 정도 후에 암컷이 돌아와 같은 방식으로 먹이를 주고, 이후로 수컷과 암컷은 번갈아 가며 바다로 나가 먹이를 비축해 돌아온다. 생후 40~50일이 지나면 부모 펭귄 모두 바다로 나가 먹이를 비축하고, 남은 새끼들이 집단을 이루어 허들 행위를 한다. 12월, 1월이 되면 집단 전체가 바다로 나간다. 하지만 지금 펭귄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란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기후와 동식물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환경이 바뀌고 있는 현상이다. 제일 큰 문제점은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녹아서 바다로 흘러드는 바람에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해수면 상승은 섬이나 해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해안에 가까운 도시에는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북극곰이나 펭귄을 비롯한 여러 동물이나 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이 사라지고 사막이 생길 수 있으며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의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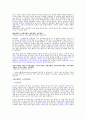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