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영웅 신화와 아더왕 이야기: <킹덤 오브 헤븐>
III. 중세 이미지의 차용: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IV. 중세 이미지의 차용: 수도사
V. 결론
II. 영웅 신화와 아더왕 이야기: <킹덤 오브 헤븐>
III. 중세 이미지의 차용: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IV. 중세 이미지의 차용: 수도사
V. 결론
본문내용
음의 춤(Danse macabre)으로 유명하다. 이 영화가 다루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 즉 십자군과 흑사병은 같은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영화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중세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중세에 일어난 특정 사건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며, 삶과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중세를 차용한 것일 뿐이다.
맨 처음 장면에서 블로크가 해변에 누워있는데, 이는 그가 두 종류의 사건, 혹은 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삶과 죽음, 혹은 십자군과 흑사병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독인 베리만에게 있어서 십자군은 대량학살이라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고, 흑사병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계시라는 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이나 핵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흑사병은 600년이 지난 후에도 핵전쟁에 비견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유럽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만약 베리만이 21세기에 살았다면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을 흑사병에 비유했을 것이다. 논쟁적인 논평자들은 오늘날 제작되는 영화들을 9/11 테러나 미국-이라크 전쟁과 관련짓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킹 아더>와 같은 영화조차 이라크 전쟁과 관련짓는 견해도 있다. <킹 아더>의 각본을 쓴 Franzoni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베트남 참전 용사임을 밝히며, 사이공 함락을 염두에 두고 극본을 쓰기는 했지만 이라크 전쟁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썼다고 했다. 즉 멀린이 호치민과 같은 인물이며 아더왕이 베트콩 지역에 침투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Caroline Jewers, \"Mission Historical, or\'[T]here were a hell of a lot of knights\': Ethnicity and Alterity in Jerry Bruckheimer\'s King Arthur\", in Race, Class, and Gender in \"Medieval\" Cinema, ed. by Lynn T. Ramey and Tison Pug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p.102-103.
이외에도 <제7의 봉인>에는 죽음의 춤, 마녀사냥, 고행자들의 행렬 등 중세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중세라는 시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무엇으로 비유를 하든, 베리만은 현재가 핵전쟁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으므로 미래를 “탈출구 없는 세계”로 표현했던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중세의 여러 사건이나 이미지를 이용했던 것이다. 결국 베리만에게 있어서도 중세는 어두운 시대였던 셈이다.
이 영화의 중요성은 감독인 베리만이 중세를 부정적인 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출발에 불과했다. 이 흑백영화가 보여준 죽음의 사자와 죽음의 춤의 이미지가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영화들에서 종종 죽음을 암시하거나 처형자를 나타내는 것들은 수도사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공포영화로 유명한 <스크림 1, 2, 3>(1996, 1997, 2000)의 살인자는 기묘한 복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가면은 뭉크의 <절규>를 차용한 것이고 검은 옷은 수도사의 복장을 차용한 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무의식적인 자기 복제를 통하여 기존의 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수도사에 대한 기존의 관념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장미의 이름>에서 기괴한 얼굴의 수도사들은 모두 베네딕투스 수도회 소속으로서 전통적 가톨릭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윌리엄은 같은 수도사이지만, 영화 내내 합리적 추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즉 신앙을 내세우는 중세의 수도사가 아니라 합리성과 과학적 방법을 앞세우는 근대인인 셈이다. 결국 수도사 복장이 상징하는 바는 신앙과 비합리성이며, 이것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중세를 다룬 영화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히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논문이나 저서로 출간해야 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본 논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중세의 사건을 영화로 만든 <킹덤 오브 헤븐>은 현대적 가치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영화는 캠벨이 제시한 영웅 신화의 패턴이라는 보편성을 따르고 있다. 즉 영웅이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시련을 극복한 후 원래의 사회로 귀환한다는 패턴이다. 다른 한편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영화는 아더왕 이야기와 성배 이야기라는 서양 중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중세의 이미지만을 차용한 영화로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비롯한 공상 과학 영화를 들 수 있는데, 이 영화들의 특징은 미래 세계를 그리면서 중세와 관련된 이미지를 차용한다는 데에 있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전망을 나타내기 위해 중세의 이미지를 차용한다는 것은 중세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비관적인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적인 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낭만주의적인 중세관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외하고 중세로부터 차용된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죽음의 춤, 일그러진 얼굴의 수도사, 흑사병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다른 영화에 다시 이용됨으로써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근대적 합리성의 기준에서 중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양 중세는 근대적이지 않은 시대라는 점에서 지리적으로는 서양에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동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맨 처음 장면에서 블로크가 해변에 누워있는데, 이는 그가 두 종류의 사건, 혹은 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삶과 죽음, 혹은 십자군과 흑사병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독인 베리만에게 있어서 십자군은 대량학살이라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고, 흑사병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계시라는 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이나 핵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흑사병은 600년이 지난 후에도 핵전쟁에 비견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유럽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만약 베리만이 21세기에 살았다면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을 흑사병에 비유했을 것이다. 논쟁적인 논평자들은 오늘날 제작되는 영화들을 9/11 테러나 미국-이라크 전쟁과 관련짓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킹 아더>와 같은 영화조차 이라크 전쟁과 관련짓는 견해도 있다. <킹 아더>의 각본을 쓴 Franzoni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베트남 참전 용사임을 밝히며, 사이공 함락을 염두에 두고 극본을 쓰기는 했지만 이라크 전쟁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썼다고 했다. 즉 멀린이 호치민과 같은 인물이며 아더왕이 베트콩 지역에 침투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Caroline Jewers, \"Mission Historical, or\'[T]here were a hell of a lot of knights\': Ethnicity and Alterity in Jerry Bruckheimer\'s King Arthur\", in Race, Class, and Gender in \"Medieval\" Cinema, ed. by Lynn T. Ramey and Tison Pug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p.102-103.
이외에도 <제7의 봉인>에는 죽음의 춤, 마녀사냥, 고행자들의 행렬 등 중세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중세라는 시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무엇으로 비유를 하든, 베리만은 현재가 핵전쟁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으므로 미래를 “탈출구 없는 세계”로 표현했던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중세의 여러 사건이나 이미지를 이용했던 것이다. 결국 베리만에게 있어서도 중세는 어두운 시대였던 셈이다.
이 영화의 중요성은 감독인 베리만이 중세를 부정적인 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출발에 불과했다. 이 흑백영화가 보여준 죽음의 사자와 죽음의 춤의 이미지가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영화들에서 종종 죽음을 암시하거나 처형자를 나타내는 것들은 수도사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공포영화로 유명한 <스크림 1, 2, 3>(1996, 1997, 2000)의 살인자는 기묘한 복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가면은 뭉크의 <절규>를 차용한 것이고 검은 옷은 수도사의 복장을 차용한 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무의식적인 자기 복제를 통하여 기존의 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수도사에 대한 기존의 관념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장미의 이름>에서 기괴한 얼굴의 수도사들은 모두 베네딕투스 수도회 소속으로서 전통적 가톨릭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윌리엄은 같은 수도사이지만, 영화 내내 합리적 추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즉 신앙을 내세우는 중세의 수도사가 아니라 합리성과 과학적 방법을 앞세우는 근대인인 셈이다. 결국 수도사 복장이 상징하는 바는 신앙과 비합리성이며, 이것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중세를 다룬 영화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히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논문이나 저서로 출간해야 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본 논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중세의 사건을 영화로 만든 <킹덤 오브 헤븐>은 현대적 가치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영화는 캠벨이 제시한 영웅 신화의 패턴이라는 보편성을 따르고 있다. 즉 영웅이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시련을 극복한 후 원래의 사회로 귀환한다는 패턴이다. 다른 한편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영화는 아더왕 이야기와 성배 이야기라는 서양 중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중세의 이미지만을 차용한 영화로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비롯한 공상 과학 영화를 들 수 있는데, 이 영화들의 특징은 미래 세계를 그리면서 중세와 관련된 이미지를 차용한다는 데에 있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전망을 나타내기 위해 중세의 이미지를 차용한다는 것은 중세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비관적인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적인 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낭만주의적인 중세관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외하고 중세로부터 차용된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죽음의 춤, 일그러진 얼굴의 수도사, 흑사병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다른 영화에 다시 이용됨으로써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근대적 합리성의 기준에서 중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양 중세는 근대적이지 않은 시대라는 점에서 지리적으로는 서양에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동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천자료
 이데올로기 - 영화로 본 여성,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 영화로 본 여성, 페미니즘 장미의 이름과 종교개혁
장미의 이름과 종교개혁 <크루서블> 감상문
<크루서블> 감상문 브레이브 하트를 보고
브레이브 하트를 보고 문화예술이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 콜버그, 칸트, 메를로-퐁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 콜버그, 칸트, 메를로-퐁티를 중심으로 [우수 독후감] 장미의 이름
[우수 독후감] 장미의 이름 이생규장전과 현대작품의 비교연구 - 환생모티브를 중심으로
이생규장전과 현대작품의 비교연구 - 환생모티브를 중심으로 대중매체속의 동성애적 문화 코드
대중매체속의 동성애적 문화 코드 진주목걸이를 건 소녀
진주목걸이를 건 소녀 밀양 감상문
밀양 감상문 '여왕마고'에 나타난 프랑스의 종교와 권력투쟁 관계
'여왕마고'에 나타난 프랑스의 종교와 권력투쟁 관계 장미의 이름 (Le Nom De La Rose/The Name Of The Rose) & 대부 (The Godfather)
장미의 이름 (Le Nom De La Rose/The Name Of The Rose) & 대부 (The Godfather)  영화 속의 수학
영화 속의 수학 귀목걸이를 한 소녀 report
귀목걸이를 한 소녀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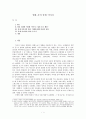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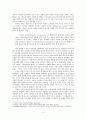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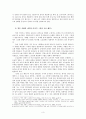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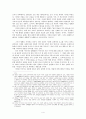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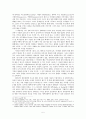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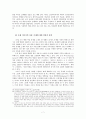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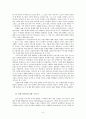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