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상의 자유,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
2.‘신나치’- 정치화되지 못한 극우 세력
3.‘피의 순수’로부터 ‘내 밥그릇’의 문제로
4. 관용, 연대의 다른 이름, 약한 진보에로 나아가는
5. 옳은 것은 옳은 방법으로 지켜내야
2.‘신나치’- 정치화되지 못한 극우 세력
3.‘피의 순수’로부터 ‘내 밥그릇’의 문제로
4. 관용, 연대의 다른 이름, 약한 진보에로 나아가는
5. 옳은 것은 옳은 방법으로 지켜내야
본문내용
활동 전반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극우의 내용적 ‘현대화’는 기존의 보수정당과의 접점을 넓히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대중의 상식과 정서에 파고들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 신나치의 활동은 아직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그 파급 범위를 한정시킬 수는 없다.
5. 옳은 것은 옳은 방법으로 지켜내야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신나치 사상-나아가 극좌든 극우든 소위 ‘위험한 사상’ 일반-이라 해도 그것이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장이 되어야 할까. 적어도 ‘자유 민주적’ 법 원리를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이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이 기존의 사회 질서에 ‘명명백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면 예컨대 파시즘적 가치를 법 규범화하여 일체의 반체제, 반정부 활동을 극단적으로 탄압하는 법률, 예컨대 극우적 국가보안법에서처럼, 극좌적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이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양자 모두는 나치 독재와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장 기대할 만한 방법은 극우적 당론마저도 사회적 공공 영역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여과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보편적-정치적 기본권, 그것의 표현인 사상의 자유야말로 어떤 특정한 이념과 사상에 기초한 정치적 신념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사상의 자유 일반이 특정 사상의 자유에 우선해야 한다면,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담론 외적’ 방법(법적 제재)의 개입을 통해 배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 ‘위험한 사상’을 억압함으로써 사상의 자유 일반이 훼손되는 것보다는, 그 위험한 사상을 공론화 과정에 회부하여, 시민 사회적 판단을 통해 여과함으로써 사상의 자유를 방어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또 모든 담론의 본성상 담론 외적 방법으로 그것이 무 베듯 잘려나가리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결국 ‘어떤 한 사람의 견해’라는 이름으로 눌러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사상의 자유 문제를 인간의 기본권, 나아가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적 자율성의 확대와 방어라는 입장에서 사고할 때, 결정적인 문제는 ‘위험한’ 소수 의견에 대해 다수 의견의 건강성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는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즉 다수에 의해 합의 가능한 사회적 판정 기준을 형성해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를 현대적으로 구성해 가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이 때 ‘일반 의지’는 어떤 고정된, 역사적, 사회적으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부단히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의 결과로 형성된 일반 의지와 특수 의지의 관계, 진정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관계는 물론 관용의 원리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이 모든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사회적 담론에 있어 다수 의견의 배후에는 언제나 정치적계급적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5. 옳은 것은 옳은 방법으로 지켜내야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신나치 사상-나아가 극좌든 극우든 소위 ‘위험한 사상’ 일반-이라 해도 그것이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장이 되어야 할까. 적어도 ‘자유 민주적’ 법 원리를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이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이 기존의 사회 질서에 ‘명명백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면 예컨대 파시즘적 가치를 법 규범화하여 일체의 반체제, 반정부 활동을 극단적으로 탄압하는 법률, 예컨대 극우적 국가보안법에서처럼, 극좌적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이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양자 모두는 나치 독재와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장 기대할 만한 방법은 극우적 당론마저도 사회적 공공 영역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여과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보편적-정치적 기본권, 그것의 표현인 사상의 자유야말로 어떤 특정한 이념과 사상에 기초한 정치적 신념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사상의 자유 일반이 특정 사상의 자유에 우선해야 한다면,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담론 외적’ 방법(법적 제재)의 개입을 통해 배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 ‘위험한 사상’을 억압함으로써 사상의 자유 일반이 훼손되는 것보다는, 그 위험한 사상을 공론화 과정에 회부하여, 시민 사회적 판단을 통해 여과함으로써 사상의 자유를 방어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또 모든 담론의 본성상 담론 외적 방법으로 그것이 무 베듯 잘려나가리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결국 ‘어떤 한 사람의 견해’라는 이름으로 눌러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사상의 자유 문제를 인간의 기본권, 나아가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적 자율성의 확대와 방어라는 입장에서 사고할 때, 결정적인 문제는 ‘위험한’ 소수 의견에 대해 다수 의견의 건강성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는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즉 다수에 의해 합의 가능한 사회적 판정 기준을 형성해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를 현대적으로 구성해 가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이 때 ‘일반 의지’는 어떤 고정된, 역사적, 사회적으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부단히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의 결과로 형성된 일반 의지와 특수 의지의 관계, 진정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관계는 물론 관용의 원리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이 모든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사회적 담론에 있어 다수 의견의 배후에는 언제나 정치적계급적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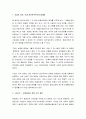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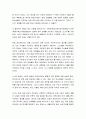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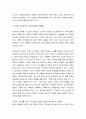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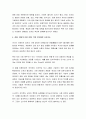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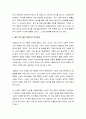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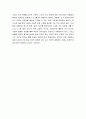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