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치학 등과 같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제 자아 자체는 현대의 철학적 개념에 의해서도 납득할 만한 도덕적 근원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자아에게 의미 있는 질서감을 부여해주던 전통적 도덕 유형들에 대신하는 유용한 도덕적 대안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 상황이 바로 모던의 합리주의적 윤리론이 기초하고 있는 배경이다.
테일러는 이와 같은 상황들, 곧 의미 있는 삶의 배경이 되는 지평을 상실하고, 따라서 더욱더 자아의 내성에 침잠해 들어가 탈맥락화되고 원자화된 위상을 부여받게 된 모던 자아의 상황을 자신이 복구하고자 하는 ‘진정성의 윤리(ethics of authenticity)’의 잠재적 가능성이 편향적으로 전개된 상황으로 본다(Taylor 1989, 25-29, 66-68). 진정성의 윤리의 이상적 모델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데카르트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어거스틴의 윤리관에서 찾아진다.
이미 언급했듯이, 테일러는 소위 보수주의적 공동체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이성의 긍정적 측면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때문에, 진정성의 윤리 개념이 함의하는 도덕 주체의 자기 준거적 자유와 위엄의 관념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그가 제시하는 진정성의 윤리라는 이상의 실현은 그 동안 모던의 합리주의적 윤리론의 시각에 따라 자아의 자기 성찰의 성향만을 편향적으로 강조하던 경향, 곧 자아 밖의 외적 권위에 대신하여 자아의 내면적 자유와 위엄에 기초하여 원자론적 의미의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의 능력만을 ‘진정적’ 본성으로 강조하던 편향적 경향성의 극복을 전제로 한다. 진정성의 실현은 내면적 자아와의 도덕적 대면이 사회 공동체적으로 형성된 의미의 지평과의 융합점을 공유할 때 가능해진다(Kitchen, 1999:31-32; Morris, 1996:228-232).
이 조건이 바로 진정성의 윤리가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 조건인 것이다(유홍림, 1996:8-14). 이는 바로 공동체의 ‘원심력의 차원’의 중요성만을 강조해오던 자유주의적 윤리관에 따라 도덕적 자아의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주변으로 밀렸던 공동체의 ‘구심력의 차원’에 대한 복구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따라서 질서와 통합의 차원과 자율성의 차원이 어느 일방의 압착을 수반하지 않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구성되어 유지 존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테일러는 이와 같은 상황들, 곧 의미 있는 삶의 배경이 되는 지평을 상실하고, 따라서 더욱더 자아의 내성에 침잠해 들어가 탈맥락화되고 원자화된 위상을 부여받게 된 모던 자아의 상황을 자신이 복구하고자 하는 ‘진정성의 윤리(ethics of authenticity)’의 잠재적 가능성이 편향적으로 전개된 상황으로 본다(Taylor 1989, 25-29, 66-68). 진정성의 윤리의 이상적 모델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데카르트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어거스틴의 윤리관에서 찾아진다.
이미 언급했듯이, 테일러는 소위 보수주의적 공동체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이성의 긍정적 측면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때문에, 진정성의 윤리 개념이 함의하는 도덕 주체의 자기 준거적 자유와 위엄의 관념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그가 제시하는 진정성의 윤리라는 이상의 실현은 그 동안 모던의 합리주의적 윤리론의 시각에 따라 자아의 자기 성찰의 성향만을 편향적으로 강조하던 경향, 곧 자아 밖의 외적 권위에 대신하여 자아의 내면적 자유와 위엄에 기초하여 원자론적 의미의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의 능력만을 ‘진정적’ 본성으로 강조하던 편향적 경향성의 극복을 전제로 한다. 진정성의 실현은 내면적 자아와의 도덕적 대면이 사회 공동체적으로 형성된 의미의 지평과의 융합점을 공유할 때 가능해진다(Kitchen, 1999:31-32; Morris, 1996:228-232).
이 조건이 바로 진정성의 윤리가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 조건인 것이다(유홍림, 1996:8-14). 이는 바로 공동체의 ‘원심력의 차원’의 중요성만을 강조해오던 자유주의적 윤리관에 따라 도덕적 자아의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주변으로 밀렸던 공동체의 ‘구심력의 차원’에 대한 복구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따라서 질서와 통합의 차원과 자율성의 차원이 어느 일방의 압착을 수반하지 않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구성되어 유지 존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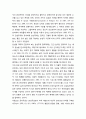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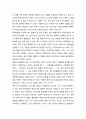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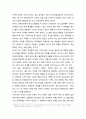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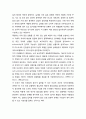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