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로 만든 늑건(허리띠)을 매었다. 이 허리띠는 사이사이에 금실과 푸른실로 수를 놓았다. 중국의 황제 색인 황색포를 착용하여 조선시대의 왕이 황색을 입을 수 없었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자주성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 평상복
: 왕이 집무에서 벗어났을 때의 차림이다. 연복, 편복이라고도 한다. 서민과 똑같이 백 저포(흰색 포)를 입고 포백대를 허리에 둘렀는데 백저포는 고려의 기본적인 복식으로 남녀상하가 모두 입었던 옷이다. 길이가 길고 넓은 소매일 때는 포로, 길이가 짧고 좁은 소매일 때는 의로 구별된다. 머리에는 검은색 건을 쓰고 이를 신었다.
② 왕비
왕비복은 색이 홍색이며 그림을 그리고 수를 놓았고 서민은 하지 못했다는 \'고려도경\' 의 기록에 의거하여 불화 관경서분변상도의 왕비의 옷을 왕비복으로 추정한다.
한편 고려 말 명나라에서 공민왕비의 적의(왕비복)를 받았다. 왕비복은 청색 비단으로 지은 적의에 상(치마), 중단, 폐슬, 대대, 혁대, 패옥, 수, 청말(청색 버선), 청석(청색 신), 칠휘이봉관 등을 함께 착용하였다.
③ 백관
고려시대 백관복에는 제복, 조복, 공복, 상복이 있었다.
- 제복
: 의종조의 제도에 따르면 백관 제복은 각 계급에 따라 칠류관(7줄로 된 관)과 일곱 문 양의 옷에서부터 술이 없는 관과 문양이 없는 옷까지 있었다.
- 조복
: 조복에 대하여 자세한 제도는 알 수 없고 송나라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본다.
- 공복
: 공복은 문무백관이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예복이며 집무복으로도 착용하였다. 둥근 깃 과 커다란 소매가 달린 포를 입었으며 복두를 쓰고 대(허리 띠), 화(신)를 착용하였으 며 손에는 홀을 들었다. 포의 색, 대와 홀의 재료에 따라 신분이 구별되었다.
- 상복
: 상복에 대해 뚜렷이 문헌에 나타난 바가 없으나 고려 공신 정몽주상에서 각이 아래로 향한 사모에 단령포를 입고 대를 띤 상복의 예를 볼 수 있다. 둥근 옷깃 때문에 단령, 원령이라고도 한다.
④ 사인
사인이란 일반적으로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말하지만 사인 복식은 관직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관직자일지라도 집안에 기거하거나 평거시에 착용하는 의복을 포함하여 말한다. 즉 문무백관의 편복에서부터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진사의 양 반복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반수포(답호)
: \'고려도경\' 제19권에서, 왕도 평소에는 조건(검은색 건)을 쓰고, 소저포를 착용하였고 백관도 사택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편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삼국 이래 별 변화 없이 내려온 전통 복식은 형태나 색에 있어 왕은 물론 백관, 사민 사이의 구 별이 없었다고 본다. 소저포는 반소매의 반수포로 이중 깃이고 옆이 터졌다.
- 철릭
: 고려시대에 원나라에서 들어왔다. 의(윗옷)와 상(치마)을 따로 재단하여 봉재한 옷이 다. 허리에 선을 넣어 장식한 주름진 철릭을 요선철릭이라고 한다. 세련된 이중 깃 과 곧게 뻗은 주름선, 소매배래선 등은 섬세하고 정교한 고려 복식의 아름다움을 느 낄 수 있다.
- 자의
: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의 예복이다.
- 중의
: 자의 안에 입었던 옷으로 소매는 자의의 소매 길이보다 더 길다. 예복은 중의 의 소매를 겉으로 내어 입었다.
- 장수의
: 자의와 중의에 비해 전체적인 치수는 작으나 중의로서 겉옷 안에 입었을 가능성이 있 다. 소매의 중간은 다른 천으로 덧대었는데 이는 천이 모자란 탓이라 여겨지며 소매 는 길어 손을 덮는 길이이다.
⑤ 귀부녀
- 유(저고리)
: 수월관음도 공양자들을 보면 옅은 황색 저고리에 홍색 상(치마)를 입고 있다. 저고리 겨드랑이 양옆이 트여져 있으며 허리에 대(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 여밈 부 분에 고름을 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저고리는 앞 시대의 대가 고름으로 바뀌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저고리의 길이가 차츰 짧아졌음을 볼 수 있다.
저고리와 치마라는 용어는 고려 말에 생긴 것이다.
- 포(두루마기)
: 치마, 저고리 위에 포를 덧입었다.
- 상(치마)
: 엷고 짙은 황색 치마를 즐겨 입었으며 귀부녀의 치마의 길이는 매우 길어 보행시 겨 드랑이에 끼고 다녔다고 한다.
- 고(바지)
: 바지는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통 넓은 것을 입었는데 생초로 안을 대어 옷이 몸 에 붙지 않게 하였다.
⑥ 장신구
- 말(버선)과 이(신)
: 버선이나 신의 형태가 발의 형태와 비슷하여 조선시대와 비슷하다.
- 머리, 기타 장신구
: 머리는 틀어올려 붉은 비단으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았다. 고려 귀부녀의 머리 장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몽수, 족두리, 화관이 있다. 몽수는 개두라고도 하는데 부인들이 외출할 때 착용하던 것으로 머리 위에서 드리워 얼굴만 내놓고 나머지는 땅에 끌리게 하고 다녔다. 동곳은 틀어 올린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끼워 고정하는 장신구이다. 비치개는 여인들이 머리 가르마를 탈 때 쓰고 올린 머리를 고착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게 꽂았던 것이다. 대개 은으로 만들었으며 족두리비녀로도 사용했다. 비녀는 쪽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장신구이다.
⑦ 서민(남)
고려 상류층 복식은 중국 복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일반 서민의 복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풍속을 그대로 반영하며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는 남녀귀천의 차이 없이 백저포에 검은 건을 착용하였다.
남자 서민복은 포(두루마기), 유(저고리), 고(바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려의 유는 오늘날의 저고리보다 약간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건은 귀족층은 두 가닥 띠의 건을 착용하였으나 서민은 사대오건(네 가닥 띠의 검은 건)을 착용하였다.
한편 주인(뱃사람)은 머리에 죽관(대나무 관모)을 썼다.
⑧ 서민(녀)
여자 서민들은 삼국시대 기본 복식인 상(치마)과 유(저고리)를 계속 입어 치마, 저고리 가 되었다. 이 명칭은 고려 말에 생긴 용어이다. 치마, 저고리 위에 포를 입었다. 귀부녀에서 서민, 처녀,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았다고 했으나 귀부녀보다 옷감의 질이 나쁘고 길이가 짧으며 폭이 좁았다고 본다.
1) 한국 생활사 박물관 _사계절 출판사_
2) http://user.chol.com/~juyada/
- 평상복
: 왕이 집무에서 벗어났을 때의 차림이다. 연복, 편복이라고도 한다. 서민과 똑같이 백 저포(흰색 포)를 입고 포백대를 허리에 둘렀는데 백저포는 고려의 기본적인 복식으로 남녀상하가 모두 입었던 옷이다. 길이가 길고 넓은 소매일 때는 포로, 길이가 짧고 좁은 소매일 때는 의로 구별된다. 머리에는 검은색 건을 쓰고 이를 신었다.
② 왕비
왕비복은 색이 홍색이며 그림을 그리고 수를 놓았고 서민은 하지 못했다는 \'고려도경\' 의 기록에 의거하여 불화 관경서분변상도의 왕비의 옷을 왕비복으로 추정한다.
한편 고려 말 명나라에서 공민왕비의 적의(왕비복)를 받았다. 왕비복은 청색 비단으로 지은 적의에 상(치마), 중단, 폐슬, 대대, 혁대, 패옥, 수, 청말(청색 버선), 청석(청색 신), 칠휘이봉관 등을 함께 착용하였다.
③ 백관
고려시대 백관복에는 제복, 조복, 공복, 상복이 있었다.
- 제복
: 의종조의 제도에 따르면 백관 제복은 각 계급에 따라 칠류관(7줄로 된 관)과 일곱 문 양의 옷에서부터 술이 없는 관과 문양이 없는 옷까지 있었다.
- 조복
: 조복에 대하여 자세한 제도는 알 수 없고 송나라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본다.
- 공복
: 공복은 문무백관이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예복이며 집무복으로도 착용하였다. 둥근 깃 과 커다란 소매가 달린 포를 입었으며 복두를 쓰고 대(허리 띠), 화(신)를 착용하였으 며 손에는 홀을 들었다. 포의 색, 대와 홀의 재료에 따라 신분이 구별되었다.
- 상복
: 상복에 대해 뚜렷이 문헌에 나타난 바가 없으나 고려 공신 정몽주상에서 각이 아래로 향한 사모에 단령포를 입고 대를 띤 상복의 예를 볼 수 있다. 둥근 옷깃 때문에 단령, 원령이라고도 한다.
④ 사인
사인이란 일반적으로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말하지만 사인 복식은 관직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관직자일지라도 집안에 기거하거나 평거시에 착용하는 의복을 포함하여 말한다. 즉 문무백관의 편복에서부터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진사의 양 반복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반수포(답호)
: \'고려도경\' 제19권에서, 왕도 평소에는 조건(검은색 건)을 쓰고, 소저포를 착용하였고 백관도 사택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편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삼국 이래 별 변화 없이 내려온 전통 복식은 형태나 색에 있어 왕은 물론 백관, 사민 사이의 구 별이 없었다고 본다. 소저포는 반소매의 반수포로 이중 깃이고 옆이 터졌다.
- 철릭
: 고려시대에 원나라에서 들어왔다. 의(윗옷)와 상(치마)을 따로 재단하여 봉재한 옷이 다. 허리에 선을 넣어 장식한 주름진 철릭을 요선철릭이라고 한다. 세련된 이중 깃 과 곧게 뻗은 주름선, 소매배래선 등은 섬세하고 정교한 고려 복식의 아름다움을 느 낄 수 있다.
- 자의
: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의 예복이다.
- 중의
: 자의 안에 입었던 옷으로 소매는 자의의 소매 길이보다 더 길다. 예복은 중의 의 소매를 겉으로 내어 입었다.
- 장수의
: 자의와 중의에 비해 전체적인 치수는 작으나 중의로서 겉옷 안에 입었을 가능성이 있 다. 소매의 중간은 다른 천으로 덧대었는데 이는 천이 모자란 탓이라 여겨지며 소매 는 길어 손을 덮는 길이이다.
⑤ 귀부녀
- 유(저고리)
: 수월관음도 공양자들을 보면 옅은 황색 저고리에 홍색 상(치마)를 입고 있다. 저고리 겨드랑이 양옆이 트여져 있으며 허리에 대(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 여밈 부 분에 고름을 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저고리는 앞 시대의 대가 고름으로 바뀌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저고리의 길이가 차츰 짧아졌음을 볼 수 있다.
저고리와 치마라는 용어는 고려 말에 생긴 것이다.
- 포(두루마기)
: 치마, 저고리 위에 포를 덧입었다.
- 상(치마)
: 엷고 짙은 황색 치마를 즐겨 입었으며 귀부녀의 치마의 길이는 매우 길어 보행시 겨 드랑이에 끼고 다녔다고 한다.
- 고(바지)
: 바지는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통 넓은 것을 입었는데 생초로 안을 대어 옷이 몸 에 붙지 않게 하였다.
⑥ 장신구
- 말(버선)과 이(신)
: 버선이나 신의 형태가 발의 형태와 비슷하여 조선시대와 비슷하다.
- 머리, 기타 장신구
: 머리는 틀어올려 붉은 비단으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았다. 고려 귀부녀의 머리 장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몽수, 족두리, 화관이 있다. 몽수는 개두라고도 하는데 부인들이 외출할 때 착용하던 것으로 머리 위에서 드리워 얼굴만 내놓고 나머지는 땅에 끌리게 하고 다녔다. 동곳은 틀어 올린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끼워 고정하는 장신구이다. 비치개는 여인들이 머리 가르마를 탈 때 쓰고 올린 머리를 고착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게 꽂았던 것이다. 대개 은으로 만들었으며 족두리비녀로도 사용했다. 비녀는 쪽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장신구이다.
⑦ 서민(남)
고려 상류층 복식은 중국 복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일반 서민의 복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풍속을 그대로 반영하며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는 남녀귀천의 차이 없이 백저포에 검은 건을 착용하였다.
남자 서민복은 포(두루마기), 유(저고리), 고(바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려의 유는 오늘날의 저고리보다 약간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건은 귀족층은 두 가닥 띠의 건을 착용하였으나 서민은 사대오건(네 가닥 띠의 검은 건)을 착용하였다.
한편 주인(뱃사람)은 머리에 죽관(대나무 관모)을 썼다.
⑧ 서민(녀)
여자 서민들은 삼국시대 기본 복식인 상(치마)과 유(저고리)를 계속 입어 치마, 저고리 가 되었다. 이 명칭은 고려 말에 생긴 용어이다. 치마, 저고리 위에 포를 입었다. 귀부녀에서 서민, 처녀,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았다고 했으나 귀부녀보다 옷감의 질이 나쁘고 길이가 짧으며 폭이 좁았다고 본다.
1) 한국 생활사 박물관 _사계절 출판사_
2) http://user.chol.com/~juyada/
추천자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역사인식에 관한 고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역사인식에 관한 고찰 [역사이야기] 8장 실증주의와 현재주의 11장 종교로본 인간의 역사
[역사이야기] 8장 실증주의와 현재주의 11장 종교로본 인간의 역사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카(carr edward hallett)]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카(carr edward hallett)] (역사 이야기-장의식저) 제11장 인간으로 본 종교의 역사 요약 정리,비평
(역사 이야기-장의식저) 제11장 인간으로 본 종교의 역사 요약 정리,비평 [중국역사학]중국의 역사보고서(내용 정리 포함)
[중국역사학]중국의 역사보고서(내용 정리 포함)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 왜곡배경, 대응방안, 한국의 대응, 역사와 진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 왜곡배경, 대응방안, 한국의 대응, 역사와 진실 [역사의이해] 역사와영화의만남
[역사의이해] 역사와영화의만남 인쇄술의 역사, 유래, 문명, 발전, 동양의 인쇄술, 발명, 역사, 서양의 인쇄술, 동서양의 인...
인쇄술의 역사, 유래, 문명, 발전, 동양의 인쇄술, 발명, 역사, 서양의 인쇄술, 동서양의 인...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동향을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동향을 대해 논하시오... (역사란무엇인가 감상) 카의 역사란무엇인가 저자 E.H. 카
(역사란무엇인가 감상) 카의 역사란무엇인가 저자 E.H. 카 [역사교육] 교육제도에 나타난 역사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역사교육] 교육제도에 나타난 역사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한반도 역사를 중국 역사에 대비하여 간략하게 논하라
한반도 역사를 중국 역사에 대비하여 간략하게 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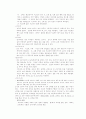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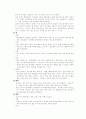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