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으나 일반 서민의 복식은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풍속을 그대로 반영하며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는 남녀귀천의 차이 없이 백저포에 검은 건을 착용하였다.
남자 서민복은 포(두루마기), 유(저고리), 고(바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려의 유는 오늘날의 저고리보다 약간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건은 귀족층은 두 가닥 띠의 건을 착용하였으나 서민은 사대오건(네 가닥 띠의 검은 건)을 착용하였다.
한편 주인(뱃사람)은 머리에 죽관(대나무 관모)을 썼다.
서민여자
여자 서민들은 삼국시대 기본 복식인 상(치마)과 유(저고리)를 계속 입어 치마, 저고리가 되었다. 이 명칭은 고려 말에 생긴 용어이다. 치마, 저고리 위에 포를 입었다. 귀부녀에서 서민 처녀,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았다고 했으나 귀부녀보다 옷감의 질이 나쁘고 길이가 짧으며 폭이 좁았다고 본다. 방배동 출토 목우상에서 여자 서민들이 착용했던 유와 상을 볼 수 있다. 유의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다.
몽수 등의 쓰개류에 대해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값이 비싸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둔마리 고분벽화의 천녀(여자 천민)는 엉덩이선에 오는 유와 허리에 상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다.
http://user.chol.com/~juyada/한국 정통의상과 장신구
(7) 좌임, 우임
좌임
우임
합임
옷의 왼쪽 여밈새
옷의 오른쪽
여밈새
옷의 맛 여밈새
고구려 기마인의 웃옷은 다양한 여밈새를 하고 있다. 바지는 웃옷의 통수에 어울리는 그리 좁지 않는 통으로 했고, 바지부리를 좁혀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러한 복식은 기마인 외에 고구려 일반 남자들도 모두 입고 있었다.
고구려는 좌임과 우림형에 어떤 기준을 두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부터 우임의 옷을 주로 입기 시작 했는가?
연개소문이 죽은 뒤 고구려가 멸망한 서기 668년경까지 고구려의 임형인 좌임과 우임 그리고 곡령 등은 그대로 존속했을 것이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복식과 같았다. 그러나 백제의 공력을 견디지 못한 신라는 진덕왕 2년 김춘추를 당에 보내 도움을 청할 때 중국의 복제를 따를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진덕왕 3년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복제를 실시했고 문무왕에는 부인의 의복까지도 중국의 복제를 따랐다. 이로 본다면 한반도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7세기 말까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복식과 임형이 지켜졌으나, 당의 복제를 따르면서 우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당의 복제를 따르더라도 이는 관부에 제한되었을 것이고 , 민간에서는 여전히 민족 고유의 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임형이 우림으로 정착되었다. 현종은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친 것을 칭찬하여 ‘온 나라가 모두 좌임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는 신라에 이어 중국의 화이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북방민족들을 적대시하여 의도적으로 좌임을 기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우임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박선희 ‘한국고대 복식 그 원형과 정체’ 지식산업사 306~330쪽)
남자 서민복은 포(두루마기), 유(저고리), 고(바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려의 유는 오늘날의 저고리보다 약간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건은 귀족층은 두 가닥 띠의 건을 착용하였으나 서민은 사대오건(네 가닥 띠의 검은 건)을 착용하였다.
한편 주인(뱃사람)은 머리에 죽관(대나무 관모)을 썼다.
서민여자
여자 서민들은 삼국시대 기본 복식인 상(치마)과 유(저고리)를 계속 입어 치마, 저고리가 되었다. 이 명칭은 고려 말에 생긴 용어이다. 치마, 저고리 위에 포를 입었다. 귀부녀에서 서민 처녀,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았다고 했으나 귀부녀보다 옷감의 질이 나쁘고 길이가 짧으며 폭이 좁았다고 본다. 방배동 출토 목우상에서 여자 서민들이 착용했던 유와 상을 볼 수 있다. 유의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다.
몽수 등의 쓰개류에 대해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값이 비싸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둔마리 고분벽화의 천녀(여자 천민)는 엉덩이선에 오는 유와 허리에 상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다.
http://user.chol.com/~juyada/한국 정통의상과 장신구
(7) 좌임, 우임
좌임
우임
합임
옷의 왼쪽 여밈새
옷의 오른쪽
여밈새
옷의 맛 여밈새
고구려 기마인의 웃옷은 다양한 여밈새를 하고 있다. 바지는 웃옷의 통수에 어울리는 그리 좁지 않는 통으로 했고, 바지부리를 좁혀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러한 복식은 기마인 외에 고구려 일반 남자들도 모두 입고 있었다.
고구려는 좌임과 우림형에 어떤 기준을 두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부터 우임의 옷을 주로 입기 시작 했는가?
연개소문이 죽은 뒤 고구려가 멸망한 서기 668년경까지 고구려의 임형인 좌임과 우임 그리고 곡령 등은 그대로 존속했을 것이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복식과 같았다. 그러나 백제의 공력을 견디지 못한 신라는 진덕왕 2년 김춘추를 당에 보내 도움을 청할 때 중국의 복제를 따를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진덕왕 3년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복제를 실시했고 문무왕에는 부인의 의복까지도 중국의 복제를 따랐다. 이로 본다면 한반도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7세기 말까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복식과 임형이 지켜졌으나, 당의 복제를 따르면서 우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당의 복제를 따르더라도 이는 관부에 제한되었을 것이고 , 민간에서는 여전히 민족 고유의 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임형이 우림으로 정착되었다. 현종은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친 것을 칭찬하여 ‘온 나라가 모두 좌임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는 신라에 이어 중국의 화이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북방민족들을 적대시하여 의도적으로 좌임을 기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우임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박선희 ‘한국고대 복식 그 원형과 정체’ 지식산업사 306~330쪽)
추천자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역사인식에 관한 고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역사인식에 관한 고찰 [역사이야기] 8장 실증주의와 현재주의 11장 종교로본 인간의 역사
[역사이야기] 8장 실증주의와 현재주의 11장 종교로본 인간의 역사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카(carr edward hallett)]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카(carr edward hallett)] (역사 이야기-장의식저) 제11장 인간으로 본 종교의 역사 요약 정리,비평
(역사 이야기-장의식저) 제11장 인간으로 본 종교의 역사 요약 정리,비평 [중국역사학]중국의 역사보고서(내용 정리 포함)
[중국역사학]중국의 역사보고서(내용 정리 포함)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 왜곡배경, 대응방안, 한국의 대응, 역사와 진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 왜곡배경, 대응방안, 한국의 대응, 역사와 진실 [역사의이해] 역사와영화의만남
[역사의이해] 역사와영화의만남 인쇄술의 역사, 유래, 문명, 발전, 동양의 인쇄술, 발명, 역사, 서양의 인쇄술, 동서양의 인...
인쇄술의 역사, 유래, 문명, 발전, 동양의 인쇄술, 발명, 역사, 서양의 인쇄술, 동서양의 인...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동향을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동향을 대해 논하시오... (역사란무엇인가 감상) 카의 역사란무엇인가 저자 E.H. 카
(역사란무엇인가 감상) 카의 역사란무엇인가 저자 E.H. 카 [역사교육] 교육제도에 나타난 역사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역사교육] 교육제도에 나타난 역사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한반도 역사를 중국 역사에 대비하여 간략하게 논하라
한반도 역사를 중국 역사에 대비하여 간략하게 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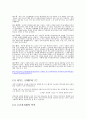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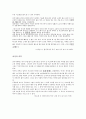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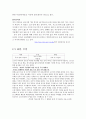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