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무신란의 발생
1. 무신란의 배경
2. 무신란의 폭발
Ⅱ. 무신란의 추이와 그 성격
1. 성립기의 무신정권
2. 확립기의 무신정권
3. 붕괴기의 무신정권
참고자료
1. 무신란의 배경
2. 무신란의 폭발
Ⅱ. 무신란의 추이와 그 성격
1. 성립기의 무신정권
2. 확립기의 무신정권
3. 붕괴기의 무신정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3년째가 되는 고종 6년에 세상을 떠나자 아들 우가 그의 권력을 이었다. 최우는 반대파를 제거하여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아버지가 축적한 금은 진완을 왕께 바치고 점탈한 공사의 전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며, 부패한 관리를 내쫓는 대신 한사를 많이 등용하여 인망을 얻기에도 노력하였다.
그는 도방을 확대하여 내도방·외도방으로 편성하고, 새로이 마별초와 삼별초를 조직하여 무력기반을 크게 확충했다. 최우 때에 이르러 무신정권의 지배 기구가 더욱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우 다음에는 그의 폐기 소생인 최항이 3대 집정으로 권력을 세습하였다. 그 역시 반대파를 숙청하고 백성들에게 혜정을 베풀면서 교정도감의 장인 교정별감의 자리에 앉아 정치를 요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권 8년만에 병사하고 아들 최의가 제 4대 집정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집권 이듭해인 고정 45년 3월에 살해되고 말았다. 이로써 최씨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최씨정권에 대해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무가막부에 의한 무단정치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였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발전적인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었느냐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붕괴기의 무신정권
최의가 주살되는 1258년의 무오정변으로 최씨정권은 종말을 고하고 왕정복고의 절차가 취하여졌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로써 왕정의 복구가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고 실권은 정변의 주체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 중 유일하게 문신이었던 유경은 그 몇 달 후 권력의 핵에서 밀려났다. 따라서 무오정변은 김준을 대표로 하여 무장세력이 중심이 된 새로운 무신정권을 낳는 결과가 되었다.
한데 김준은 그뒤 자기의 측근세력을 주변에 모아 집권의 터전을 더욱 다져간 것 같다. 한편 김준은 무오공신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뿐더러, 그의 교정별감으로서의 위세나 사병조직 등도 최씨정권 때에 비하여 약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 있던 김준정권도 원종 9년에 임연의 거사로 붕괴되고 만다. 그러나 곧이어 국왕 원종과 임연간에 세력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자 임연은 먼저 왕 측근와 환자들을 살해하는 한편 조신들을 위협하면서 원종마저 폐하고 왕의 동생 안경공 창을 세워 즉위시키고는 스스로 교정별감의 자리에 앉아 무인집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를 구실삼아. 최탄·한신 등이 반란을 일으켜 몽고에 귀부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은데다가 고력의 왕실과 가까워진 원나라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고 원종을 복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복위된 원종이 원나라로 돌아간 사이에 임연이 병사하고, 그의 아들 임유무가 뒤를 이어 교정별감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임유무 역시 원종의 출륙명령을 듣지 않고 항거하다가 그의 자부인 홍문계와 송송례에게 제거되고 만다. 이를 경오정변이라 한다.
경오정변 또한 무인세력이 중심이 된 거사였다. 그러나 이 정변 후에는 그 이전에 있어서와 같이 거사의 주체자인 무인이 특수직에 취임하지도 않았고, 실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었다. 무신정권은 경오정변으로 아주 끝나고 명실공히 왕의 친정이 복구된 것이다. 최의의 주살로부터 비롯된 김준정권과 그뒤의 임연·임유무정권은 앞서 지적했듯이 무인집정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하고 세력기반 역시 약화되어, 무신정권으로서는 말하자면 붕괴기에 처해 있던 집권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씨정권시대와 대몽항쟁 | 김주찬 저 | 한국파스퇴르 2014
- 고려시대사 | 박용운 | 일지사 2008
- 교려사로 고려를 읽다 | 이한우 저 | 21세기 북스 2012
그는 도방을 확대하여 내도방·외도방으로 편성하고, 새로이 마별초와 삼별초를 조직하여 무력기반을 크게 확충했다. 최우 때에 이르러 무신정권의 지배 기구가 더욱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우 다음에는 그의 폐기 소생인 최항이 3대 집정으로 권력을 세습하였다. 그 역시 반대파를 숙청하고 백성들에게 혜정을 베풀면서 교정도감의 장인 교정별감의 자리에 앉아 정치를 요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권 8년만에 병사하고 아들 최의가 제 4대 집정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집권 이듭해인 고정 45년 3월에 살해되고 말았다. 이로써 최씨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최씨정권에 대해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무가막부에 의한 무단정치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였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발전적인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었느냐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붕괴기의 무신정권
최의가 주살되는 1258년의 무오정변으로 최씨정권은 종말을 고하고 왕정복고의 절차가 취하여졌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로써 왕정의 복구가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고 실권은 정변의 주체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 중 유일하게 문신이었던 유경은 그 몇 달 후 권력의 핵에서 밀려났다. 따라서 무오정변은 김준을 대표로 하여 무장세력이 중심이 된 새로운 무신정권을 낳는 결과가 되었다.
한데 김준은 그뒤 자기의 측근세력을 주변에 모아 집권의 터전을 더욱 다져간 것 같다. 한편 김준은 무오공신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뿐더러, 그의 교정별감으로서의 위세나 사병조직 등도 최씨정권 때에 비하여 약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 있던 김준정권도 원종 9년에 임연의 거사로 붕괴되고 만다. 그러나 곧이어 국왕 원종과 임연간에 세력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자 임연은 먼저 왕 측근와 환자들을 살해하는 한편 조신들을 위협하면서 원종마저 폐하고 왕의 동생 안경공 창을 세워 즉위시키고는 스스로 교정별감의 자리에 앉아 무인집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를 구실삼아. 최탄·한신 등이 반란을 일으켜 몽고에 귀부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은데다가 고력의 왕실과 가까워진 원나라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고 원종을 복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복위된 원종이 원나라로 돌아간 사이에 임연이 병사하고, 그의 아들 임유무가 뒤를 이어 교정별감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임유무 역시 원종의 출륙명령을 듣지 않고 항거하다가 그의 자부인 홍문계와 송송례에게 제거되고 만다. 이를 경오정변이라 한다.
경오정변 또한 무인세력이 중심이 된 거사였다. 그러나 이 정변 후에는 그 이전에 있어서와 같이 거사의 주체자인 무인이 특수직에 취임하지도 않았고, 실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었다. 무신정권은 경오정변으로 아주 끝나고 명실공히 왕의 친정이 복구된 것이다. 최의의 주살로부터 비롯된 김준정권과 그뒤의 임연·임유무정권은 앞서 지적했듯이 무인집정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하고 세력기반 역시 약화되어, 무신정권으로서는 말하자면 붕괴기에 처해 있던 집권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씨정권시대와 대몽항쟁 | 김주찬 저 | 한국파스퇴르 2014
- 고려시대사 | 박용운 | 일지사 2008
- 교려사로 고려를 읽다 | 이한우 저 | 21세기 북스 2012
추천자료
 녹읍, 전시과, 과전법에 대한 연구
녹읍, 전시과, 과전법에 대한 연구 이규보의 생애와 작품세계
이규보의 생애와 작품세계 [국문학] 임춘의 국순전과 이규보의 국선생전 비교 연구(소논문)
[국문학] 임춘의 국순전과 이규보의 국선생전 비교 연구(소논문) [인문과학] 고려시대의 교육제도
[인문과학] 고려시대의 교육제도 이규보와 그의 문학관
이규보와 그의 문학관 김치, 김치박물관을 다녀와서, 그 세계화에 관하여
김치, 김치박물관을 다녀와서, 그 세계화에 관하여 문학의 시대별 특징
문학의 시대별 특징 [역사]고려시대사 총정리, 고려시대 전체 역사
[역사]고려시대사 총정리, 고려시대 전체 역사 고려시대의 역사인식과 역사서편찬
고려시대의 역사인식과 역사서편찬 [역사]고려시대사 총정리, 고려시대 전체 역사
[역사]고려시대사 총정리, 고려시대 전체 역사 묘청의 서경천도운동부터 5.16쿠데타까지 요약 및 느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부터 5.16쿠데타까지 요약 및 느낌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1-3권 정리 (03~09)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1-3권 정리 (03~0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판) 1권 - 01 ~ 06 (문학사 이해의 새로운 관점, 원시문학, 고대문학...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판) 1권 - 01 ~ 06 (문학사 이해의 새로운 관점, 원시문학, 고대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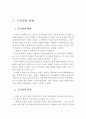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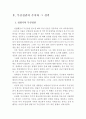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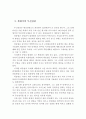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