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Ⅰ. 사형제도
1. 형벌로서 사형의 의미
2. 사형의 집행방법
Ⅱ. 사형집행의 실제
1. 집행의 실제 사례들 –사형수의 중점에서
2. 사형의 형벌 정책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토 사례
Ⅲ.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
1. 사형폐지론의 연혁
2. 사형폐지론의 논거
3.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 사형존치론
Ⅳ. 결론
- 사형제도에 대한 대체안, 개선책을 중심으로
Ⅰ. 사형제도
1. 형벌로서 사형의 의미
2. 사형의 집행방법
Ⅱ. 사형집행의 실제
1. 집행의 실제 사례들 –사형수의 중점에서
2. 사형의 형벌 정책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토 사례
Ⅲ.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
1. 사형폐지론의 연혁
2. 사형폐지론의 논거
3.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 사형존치론
Ⅳ. 결론
- 사형제도에 대한 대체안, 개선책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의견이 많이 따른다. 살인죄의 감소는 근대국가사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결코 사형의 폐지가 그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예컨대, 서덜랜드는 미국에서 사형을 폐지하였던 주와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주와의 살인의 범죄율을 비교하여 양제도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형존폐간의 살인사건 발생률 비교
(인접주끼리 묶은 것)
주
1931~1935
1936~1940
1941~1946
Rhode Island
Connecticut
(폐지)
(존치)
1.8
2.4
1.5
2.0
1.0
1.9
Michigan
Indianna
(폐지)
(존치)
5.0
6.2
3.6
4.3
3.4
3.2
Wisconsin
IIIinois
(폐지)
(존치)
2.4
9.6
1.9
5.7
1.5
1.3
Minnesota
lowa
(폐지)
(존치)
3.1
2.6
1.7
1.7
1.6
1.3
Arizona
New Mexico
(폐지)
(존치)
12.6
12.5
10.3
8.4
6.5
5.3f
Ⅲ.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
1. 사형폐지론의 연혁
사형존폐에 관한 논쟁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학자는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베카리아이다. 특히, 그는 계몽기의 형사법학을 대표하는 불멸의 명저 『범죄와 형벌』(1764년)에서 사형은 사회계약의 원래 생각과 전혀 다르므로 정상적인 국가의 상태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Ancient Regime의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고 사회계약설을 근거로 하여 최초로 사형 폐지론을 이론적으로 전개하였다.
Beccaria는 사회계약의 내용에 생명을 박탈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형은 형벌권을 근거지우는 사회계약의 원래의 뜻에 반한다. 또한, 사형의 위하력은 종신형에 비하여 그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잔혹한 행위의 표본을 보여 줌으로서 오히려 사회에 유해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설 및 일반 예방론의 견지에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형폐지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사형제도의 법적 존재가치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또한 베카리아는 사형의 위하력은 그리 크지 않아 범죄예방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잔인한 모습들만 보여줌으로써 감정을 둔화시켜 더 악랄한 범죄, 완전범죄를 지향하여 사회에 유해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에 뒤이은 영국의 유명한 감옥 개량가 하워드(J. Howard)는 그의 저서 『감옥상태론(The State of Prisons in England and Wales』(1777년)에서 당시의 비참한 감옥의 실상을 비판하고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영국의 캘버트(E. Calvert), 독일의 리프만, 미국의 서덜랜드, 일본의 마사끼 등이 사형폐지론을 주장하였다.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포르투갈(1867년), 네덜란드(1870년), 스위스(1874년), 노르웨이(1905년), 멕시코(1929년), 스웨덴(1921년), 덴마크(1930년0, 스페인(1932년), 뉴질랜드(1941년), 이탈리아(1944년), 독일(1949년), 핀란드(1949년), 오스트리아(1950년), 영국(1965년), 프랑스(1981년) 등이다. 미국은 미시간주(1846년)를 시초로 사형이 폐지되었으나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89년 12월 15일 개최된 제44회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사형폐지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에서 “당사국은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1991년 7월 11개국의 비준을 받아 발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형문제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관념론의 범주 속에 그치고 감정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사형의 형벌 정책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실천적 과학의 범주에서 사실을 대상으로 귀납되어야 할 현실 정책론인 것이다. 여기에 가정론이나 관념론은 개입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 입장에서 사형폐지론의 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사형폐지론의 논거
사형에는 교육적 효과가 없다. 형벌의 주된 기능은 교육과 개선에 있다. 그러나 형벌의 일종인 사형의 경우는 교육·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형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
사회격리, 사회보전의 효과만을 기대한다면 무기자유형으로도 충분하다.
사형의 위하적·일반 예방적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사형의 주된 대상의 정치적 확신범죄와 특정한 흉악범에 대하여는 거의 무력하다.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그러한 범죄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 것도 이를 입증하는 일들이다. 이에 대하여 T. Sellin은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
집행상의 차이가 항상 있다.
사형은 사람에게 잔혹한 마음을 갖게 한다.
국가가 살인행위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응보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고 국가가 살인자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사형의 오판은 무엇으로도 영구히 변상 받을 수 없고 구제가능성도 없다.
사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존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생존자체가 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 내지 구제의 면에서도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므로 인도주의의 견지에서 허용할 수 없으며, 근대문명의 요청에도 반하는 일이다. 사형은 그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종교상의 교의에 반한다. 즉,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므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여 그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문제에 있어서는 실천적 과학으로서의 형벌 정책학에서는 그 범주를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된다.
3.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 사형존치론
사형폐지론에 대해 사형존치론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계몽기의 몽테스크외·루소 등은 사형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긍정하였으며 칸트와 헤겔도 사형존치론자였다. 그들의 논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생명을
미국에서 사형존폐간의 살인사건 발생률 비교
(인접주끼리 묶은 것)
주
1931~1935
1936~1940
1941~1946
Rhode Island
Connecticut
(폐지)
(존치)
1.8
2.4
1.5
2.0
1.0
1.9
Michigan
Indianna
(폐지)
(존치)
5.0
6.2
3.6
4.3
3.4
3.2
Wisconsin
IIIinois
(폐지)
(존치)
2.4
9.6
1.9
5.7
1.5
1.3
Minnesota
lowa
(폐지)
(존치)
3.1
2.6
1.7
1.7
1.6
1.3
Arizona
New Mexico
(폐지)
(존치)
12.6
12.5
10.3
8.4
6.5
5.3f
Ⅲ.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
1. 사형폐지론의 연혁
사형존폐에 관한 논쟁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학자는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베카리아이다. 특히, 그는 계몽기의 형사법학을 대표하는 불멸의 명저 『범죄와 형벌』(1764년)에서 사형은 사회계약의 원래 생각과 전혀 다르므로 정상적인 국가의 상태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Ancient Regime의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고 사회계약설을 근거로 하여 최초로 사형 폐지론을 이론적으로 전개하였다.
Beccaria는 사회계약의 내용에 생명을 박탈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형은 형벌권을 근거지우는 사회계약의 원래의 뜻에 반한다. 또한, 사형의 위하력은 종신형에 비하여 그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잔혹한 행위의 표본을 보여 줌으로서 오히려 사회에 유해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설 및 일반 예방론의 견지에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형폐지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사형제도의 법적 존재가치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또한 베카리아는 사형의 위하력은 그리 크지 않아 범죄예방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잔인한 모습들만 보여줌으로써 감정을 둔화시켜 더 악랄한 범죄, 완전범죄를 지향하여 사회에 유해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에 뒤이은 영국의 유명한 감옥 개량가 하워드(J. Howard)는 그의 저서 『감옥상태론(The State of Prisons in England and Wales』(1777년)에서 당시의 비참한 감옥의 실상을 비판하고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영국의 캘버트(E. Calvert), 독일의 리프만, 미국의 서덜랜드, 일본의 마사끼 등이 사형폐지론을 주장하였다.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포르투갈(1867년), 네덜란드(1870년), 스위스(1874년), 노르웨이(1905년), 멕시코(1929년), 스웨덴(1921년), 덴마크(1930년0, 스페인(1932년), 뉴질랜드(1941년), 이탈리아(1944년), 독일(1949년), 핀란드(1949년), 오스트리아(1950년), 영국(1965년), 프랑스(1981년) 등이다. 미국은 미시간주(1846년)를 시초로 사형이 폐지되었으나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89년 12월 15일 개최된 제44회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사형폐지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에서 “당사국은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1991년 7월 11개국의 비준을 받아 발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형문제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관념론의 범주 속에 그치고 감정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사형의 형벌 정책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실천적 과학의 범주에서 사실을 대상으로 귀납되어야 할 현실 정책론인 것이다. 여기에 가정론이나 관념론은 개입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 입장에서 사형폐지론의 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사형폐지론의 논거
사형에는 교육적 효과가 없다. 형벌의 주된 기능은 교육과 개선에 있다. 그러나 형벌의 일종인 사형의 경우는 교육·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형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
사회격리, 사회보전의 효과만을 기대한다면 무기자유형으로도 충분하다.
사형의 위하적·일반 예방적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사형의 주된 대상의 정치적 확신범죄와 특정한 흉악범에 대하여는 거의 무력하다.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그러한 범죄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 것도 이를 입증하는 일들이다. 이에 대하여 T. Sellin은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
집행상의 차이가 항상 있다.
사형은 사람에게 잔혹한 마음을 갖게 한다.
국가가 살인행위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응보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고 국가가 살인자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사형의 오판은 무엇으로도 영구히 변상 받을 수 없고 구제가능성도 없다.
사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존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생존자체가 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 내지 구제의 면에서도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므로 인도주의의 견지에서 허용할 수 없으며, 근대문명의 요청에도 반하는 일이다. 사형은 그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종교상의 교의에 반한다. 즉,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므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여 그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문제에 있어서는 실천적 과학으로서의 형벌 정책학에서는 그 범주를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된다.
3.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 사형존치론
사형폐지론에 대해 사형존치론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계몽기의 몽테스크외·루소 등은 사형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긍정하였으며 칸트와 헤겔도 사형존치론자였다. 그들의 논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생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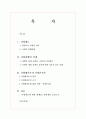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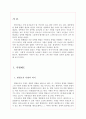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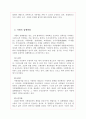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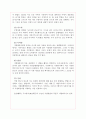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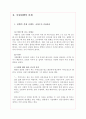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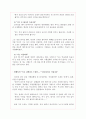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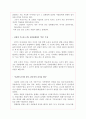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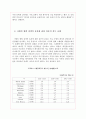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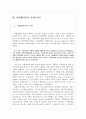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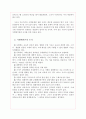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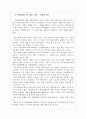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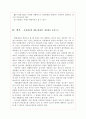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