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성유골에 대한 중세 사람들의 믿음과 숭배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다. 더구나 ‘도둑질’이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는 행위를 오히려 찬양하고 합리화시켰던 그들의 사고 방식은 더더욱 흥미로웠다.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 사람들은 아마도 무엇이든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성유골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카바의 검은돌’같이 오늘날까지도 성물로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성유골은 오늘날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예술과 종교>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천주교 성당에도 성인의 유골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과연 옛날과 비교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성유골에 대한 중세 사람들의 믿음과 숭배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다. 더구나 ‘도둑질’이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는 행위를 오히려 찬양하고 합리화시켰던 그들의 사고 방식은 더더욱 흥미로웠다.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 사람들은 아마도 무엇이든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성유골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카바의 검은돌’같이 오늘날까지도 성물로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성유골은 오늘날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예술과 종교>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천주교 성당에도 성인의 유골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과연 옛날과 비교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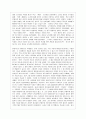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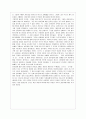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