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창덕궁의 역사
3. 일본에 의한 창덕궁 인정전의 개조
4. 개조 이후의 인정전
5. 맺음말
2. 창덕궁의 역사
3. 일본에 의한 창덕궁 인정전의 개조
4. 개조 이후의 인정전
5. 맺음말
본문내용
시로스케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런 의미에서 창덕궁은 투명한 유리그릇 속에 담긴 물체처럼 누구나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외의 손님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하며 궁전이든 후원이든 그 희망에 따라 관람할 수 있게 개방하여 왕가의 근황을 설명하기도 하면서 이왕가(李王家)에 대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하게 예우하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 널리 알려졌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오해를 푸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창덕궁 깊이 읽기』, 글항아리, 2012, 426쪽.
순종이 인정전에서 초대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일행과 찍은 기념사진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의 인정전이 눈에 띈다. 인정전의 이중 기단에는 마치 오늘날의 테라스처럼 테이블과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정전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1926년 4월 25일 순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여 창덕궁이 궁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인정전은 정전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일본에 의해 기획된 드라마 속 세트장이었을 뿐이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창덕궁의 역사를 시작으로 근대 이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하였고 그 결과 인정전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창덕궁은 이궁으로서 창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정궁이상의 가치와 용도로 활용되었지만 고종 이후 한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빈 궁이었고 이양이후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대 이후 온전히 대한제국의 정전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병합 이후에는 그 가치가 전락하여 격식 있는 행사들이 행해졌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근대 이후 창덕궁 인정전의 개조는 근대화의 흐름에 뒤쳐져 있는 조선의 낙후된 궁궐을 개조하여 일본의 근대적 역량을 과시한 건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인정전을 개조하여 정전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내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이곳을 개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일본의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대한제국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임금이 사는 도성에 지어진 궁궐은 왕조의 모든 문화적 특성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기량을 갖춘 학자들과 장인들이 궁궐을 위해 일했고 당대 모든 제도와 사상의 원천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웃 나라와의 교류가 적었던 조선왕조의 경우는 자기만의 문화적 독자성을 심화시켰던 왕조였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들이 싹 튼 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궁궐은 단연 문화적으로 밀도 높은 집합체이다.
조선전기까지 궁궐을 대표하는 곳은 단연 경복궁이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경복궁이 소실된 이후 창덕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창덕궁에서 조선왕조가 갖고 있던 최고 수준의 문화가 빛을 발했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발현되었다.
창덕궁 안에서도 중심 공간인 인정전은 근대 이후 일본에 의해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뤄지면서 건축 세부에 나타난 왕권의 상징 요소들이 점차 상실되었고 전통적인 최고의 기술 양식들이 일본화 된 서양 기술양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창덕궁의 인정전은 그 뼈대를 간직하고 있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건축술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이다.
이 글에서는 창덕궁의 역사적 흐름과 근대 창덕궁 인정전의 변화를 주목하였다. 근대 이후 창덕궁과 대한제국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근대 조선 왕실의 장식화와 창덕궁 벽화 등을 조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한제국 최후의 정전인 창덕궁 인정전에 관해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과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갖게 된 것 같다. 앞선 연구 자료들을 되짚어보면서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창덕궁 깊이 읽기』, 글항아리, 2012.
2. 단행본
장순용, 『창덕궁』, 대원사, 1998.
3. 단행본
한영우, 『조선의 집 동궐에 들다』, 효형출판, 2006.
4. 단행본
한영우, 『창덕궁과 창경궁』, 열화당, 2003.
5. 논문
이강근, 「근대기 창덕궁 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강좌 미술사』 42권 0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그런 의미에서 창덕궁은 투명한 유리그릇 속에 담긴 물체처럼 누구나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외의 손님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하며 궁전이든 후원이든 그 희망에 따라 관람할 수 있게 개방하여 왕가의 근황을 설명하기도 하면서 이왕가(李王家)에 대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하게 예우하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 널리 알려졌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오해를 푸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창덕궁 깊이 읽기』, 글항아리, 2012, 426쪽.
순종이 인정전에서 초대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일행과 찍은 기념사진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의 인정전이 눈에 띈다. 인정전의 이중 기단에는 마치 오늘날의 테라스처럼 테이블과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정전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1926년 4월 25일 순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여 창덕궁이 궁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인정전은 정전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일본에 의해 기획된 드라마 속 세트장이었을 뿐이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창덕궁의 역사를 시작으로 근대 이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하였고 그 결과 인정전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창덕궁은 이궁으로서 창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정궁이상의 가치와 용도로 활용되었지만 고종 이후 한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빈 궁이었고 이양이후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대 이후 온전히 대한제국의 정전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병합 이후에는 그 가치가 전락하여 격식 있는 행사들이 행해졌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근대 이후 창덕궁 인정전의 개조는 근대화의 흐름에 뒤쳐져 있는 조선의 낙후된 궁궐을 개조하여 일본의 근대적 역량을 과시한 건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인정전을 개조하여 정전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내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이곳을 개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일본의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대한제국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임금이 사는 도성에 지어진 궁궐은 왕조의 모든 문화적 특성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기량을 갖춘 학자들과 장인들이 궁궐을 위해 일했고 당대 모든 제도와 사상의 원천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웃 나라와의 교류가 적었던 조선왕조의 경우는 자기만의 문화적 독자성을 심화시켰던 왕조였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들이 싹 튼 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궁궐은 단연 문화적으로 밀도 높은 집합체이다.
조선전기까지 궁궐을 대표하는 곳은 단연 경복궁이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경복궁이 소실된 이후 창덕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창덕궁에서 조선왕조가 갖고 있던 최고 수준의 문화가 빛을 발했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발현되었다.
창덕궁 안에서도 중심 공간인 인정전은 근대 이후 일본에 의해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뤄지면서 건축 세부에 나타난 왕권의 상징 요소들이 점차 상실되었고 전통적인 최고의 기술 양식들이 일본화 된 서양 기술양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창덕궁의 인정전은 그 뼈대를 간직하고 있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건축술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이다.
이 글에서는 창덕궁의 역사적 흐름과 근대 창덕궁 인정전의 변화를 주목하였다. 근대 이후 창덕궁과 대한제국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근대 조선 왕실의 장식화와 창덕궁 벽화 등을 조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한제국 최후의 정전인 창덕궁 인정전에 관해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과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갖게 된 것 같다. 앞선 연구 자료들을 되짚어보면서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창덕궁 깊이 읽기』, 글항아리, 2012.
2. 단행본
장순용, 『창덕궁』, 대원사, 1998.
3. 단행본
한영우, 『조선의 집 동궐에 들다』, 효형출판, 2006.
4. 단행본
한영우, 『창덕궁과 창경궁』, 열화당, 2003.
5. 논문
이강근, 「근대기 창덕궁 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강좌 미술사』 42권 0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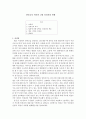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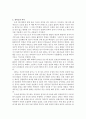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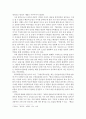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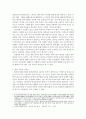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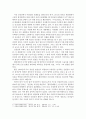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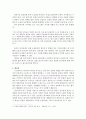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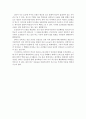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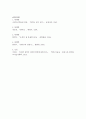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