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이제는 바뀌어야할 표준어 - ‘닭도리탕’과 ‘닭볶음탕’
3. 결론
* 참고문헌
2. 이제는 바뀌어야할 표준어 - ‘닭도리탕’과 ‘닭볶음탕’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닭볶음탕’이라고 바꿔놓은 탓에 이 요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먼저 닭을 볶은 다음 물을 붓고 끓이기도 한다. 그러나 예전부터 이 요리를 먹어온 1960년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조림을 만들듯이 끓이기만 할 뿐 볶지는 않을 것이다. 요리 이름 때문에 아예 그 조리법 또한 바뀌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표준어를 채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3. 결론
사실 ‘닭볶음탕’이라고 순화하긴 했지만, 이 단어도 약간의 모순이 있는 용어이다. 실제로 ‘닭볶음탕’이라는 요리를 조리할 때 닭을 볶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오히려 조림에 가까운 요리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두 가지 조리법이 한꺼번에 들어간 요리 이름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닭볶음탕’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볶음탕’이라는 단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발음함에 있어서도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 ‘닭볶음탕’에서 ‘닭’은 받침 ‘ㄺ’이 ‘ㄱ’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ㄱ’과 그 뒤에 붙는 ‘볶’의 ‘ㅂ’소리를 연이어 말하게 되면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 즉 ‘닭볶음탕’의 발음은 ‘닥뽀끔탕’이 되는 것이다. 본래 된소리의 경우, 예사소리나 거센소리에 비해 발음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도 ‘닭볶음탕’은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니다. 고로 위 근거들을 적용시켰을 때 ‘닭볶음탕’은 의미도 맞지 않으면서 발음 또한 어려운, 그야말로 언어의 경제성을 잘 살리지 못한 단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닭볶음탕’에 비해 발음하기도 쉽고 그 의미도 살아있는 ‘닭도리탕’을 표준어로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정 일본어의 잔재임이 의심되어 반문을 산다면 ‘닭볶음탕’보다는 발음이 쉬운 ‘매운닭조림’이나 ‘닭매운탕’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본래 ‘닭볶음탕’이라는 것은 국물이 자작하게 남아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탕’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대중들에게 좀 더 익숙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글에 근거하여 봤을 때 언어를 순화하여 표준어로 채택할 때는 그 의미와 발음,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단어가 바뀐 후에 그 여파로 인해 나타날 결과도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순화할 대상을 정할 때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 즉 전문가라는 자격이 설득력 및 신빙성을 뒷받침 할 수는 있으나 전문가의 주장 자체가 그들의 자격에 의해 절대적인 진리나 진실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실효성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이나 아마추어 또한 충분히 다른 접근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것 또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론이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트위터 https://mobile.twitter.com/urimal365
3. 결론
사실 ‘닭볶음탕’이라고 순화하긴 했지만, 이 단어도 약간의 모순이 있는 용어이다. 실제로 ‘닭볶음탕’이라는 요리를 조리할 때 닭을 볶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오히려 조림에 가까운 요리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두 가지 조리법이 한꺼번에 들어간 요리 이름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닭볶음탕’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볶음탕’이라는 단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발음함에 있어서도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 ‘닭볶음탕’에서 ‘닭’은 받침 ‘ㄺ’이 ‘ㄱ’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ㄱ’과 그 뒤에 붙는 ‘볶’의 ‘ㅂ’소리를 연이어 말하게 되면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 즉 ‘닭볶음탕’의 발음은 ‘닥뽀끔탕’이 되는 것이다. 본래 된소리의 경우, 예사소리나 거센소리에 비해 발음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도 ‘닭볶음탕’은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니다. 고로 위 근거들을 적용시켰을 때 ‘닭볶음탕’은 의미도 맞지 않으면서 발음 또한 어려운, 그야말로 언어의 경제성을 잘 살리지 못한 단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닭볶음탕’에 비해 발음하기도 쉽고 그 의미도 살아있는 ‘닭도리탕’을 표준어로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정 일본어의 잔재임이 의심되어 반문을 산다면 ‘닭볶음탕’보다는 발음이 쉬운 ‘매운닭조림’이나 ‘닭매운탕’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본래 ‘닭볶음탕’이라는 것은 국물이 자작하게 남아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탕’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대중들에게 좀 더 익숙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글에 근거하여 봤을 때 언어를 순화하여 표준어로 채택할 때는 그 의미와 발음,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단어가 바뀐 후에 그 여파로 인해 나타날 결과도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순화할 대상을 정할 때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 즉 전문가라는 자격이 설득력 및 신빙성을 뒷받침 할 수는 있으나 전문가의 주장 자체가 그들의 자격에 의해 절대적인 진리나 진실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실효성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이나 아마추어 또한 충분히 다른 접근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것 또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론이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트위터 https://mobile.twitter.com/urimal365
추천자료
 악장(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 장르 규정
악장(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 장르 규정 조선시대 기녀문학
조선시대 기녀문학 남.북한 언어비교
남.북한 언어비교 북한의 언어 연구
북한의 언어 연구 국어과 원고지사용법, 수학과 도형영역 수업자료(교육자료), 과학과 지구영역, 사회과 웹기반...
국어과 원고지사용법, 수학과 도형영역 수업자료(교육자료), 과학과 지구영역, 사회과 웹기반... 사투리(방언, 지역어) 특성, 사투리(방언, 지역어) 분화, 사투리(방언, 지역어) 수집, 사투리...
사투리(방언, 지역어) 특성, 사투리(방언, 지역어) 분화, 사투리(방언, 지역어) 수집, 사투리... [독자반응(독자반응이론)]독자반응(독자반응이론)의 개념, 독자반응(독자반응이론)의 유형, ...
[독자반응(독자반응이론)]독자반응(독자반응이론)의 개념, 독자반응(독자반응이론)의 유형, ... [훈화자료 사례, 품성, 신념]품성 훈화자료 사례, 신념 훈화자료 사례, 성격 훈화자료 사례, ...
[훈화자료 사례, 품성, 신념]품성 훈화자료 사례, 신념 훈화자료 사례, 성격 훈화자료 사례, ... 고전소설의 특징, 의의,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현실성, 가부장 사...
고전소설의 특징, 의의,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현실성, 가부장 사... 한국어 속담과 관용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의식과 문화가 수용되었...
한국어 속담과 관용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의식과 문화가 수용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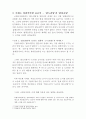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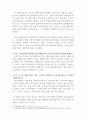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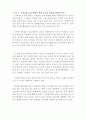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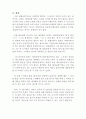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