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목차
1)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까지
2) 쇠퇴와 몰락
3) 로마의 운명
4) 교부 문화
2) 쇠퇴와 몰락
3) 로마의 운명
4) 교부 문화
본문내용
. 오로지 성도들만 천국에 즉시 들어갈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이들은 정화되어야만 했다. 연옥은 영혼의 정화를 위한 단계이자 장소였고, 대개 착하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은 이렇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그레고리의 시기로부터 교회가 가르친 이렇듯 속죄를 정화하는 것은 삶 속에서 수행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연옥의 여정은 더 쉽고 짧게 만들어졌다.
교회가 그 구성원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수단을 소유한 것과 신성의 법률적(형식적) 개념을 보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난과 속죄의 교리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달라져왔는지 알 수 있다.
속죄에 대한 그레고리의 가르침은 교회에 의해 제도화되었고, 오늘날과 같이 중세의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속죄는 4단계로 나타나는데, 첫째 죄와 신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지각, 둘째 (가장 중요한) 죄지음에 대한 후회 또는 뉘우침, 셋째 안수 목사에 고백과 후회하는 일에 대한 의도적인 굴욕, 마지막으로 범하고 고백했던 죄에 대해 만족(변제)을 주는 속죄의 실질적 행동이다.
만족(변제)이란 상당히 다양하다. 이는 교회에 대한 기부, 교회를 대신하는 물리적 수고, 순례, 또는 심지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예술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세후기에는 루터가 맹렬히 비난한 유명한 방종과 같이 어떠한 논쟁의 관행은 제도화된 속죄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속죄는 종교나 목적과 같이 심리적인 소리를 갖고 있다. 이는 교회 구성원이 많은 죄들에 대한 용서를 얻도록 허락하고 그로 인해 그의 영혼의 안전과 앞으로의 삶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도록 기대하는 것이 허락됨을 다시 보장하였다. 그레고리의 속죄에 대한 교리를 통해, 교회는 어거스틴의 인류의 운명에 대한 깊은 염세주의를 누그러뜨렸다. 사실, 이는 낙관적인, 그래서 빠르게 중세 사회에 더 어필할 수 있는 종교로 라틴 그리스도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5세기에 그리스도교 교부의 교리가 갖는 의미가 발전되었다는 것의 또 다른 문화적 전면은 정치적인 이론이다. 5세기 교황 겔라시우스 1세(Gelasius Ⅰ)는 지난 10년 동안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의 의견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치적인 이론을 공식화하고자 하였다. 겔라시우스는 492년에서 496년까지 교황이었다. 이때 교황과 황제 사이에 분열이 있었음은 명백했다. 비잔틴 교회와 황제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 이교의 교리를 채택하였고 겔라시우스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교황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파문하였고 황제의 권력의 모든 기초를 공격하였다. 그는 세속과 정식적 권한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갔다. 그는 성경에 왕과 사제였던 Melchizedek과 그리스도를 비유하며,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교회와 국가가 나누어져왔다고 말했다. 세계에는 두 권위의 기관이 있는데 신성한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 성직자와 왕실의 권력을 가진 왕과 황제가 그것이다.
교회의 권한은 auctoritas(법률을 제정)인 반면 세속적 통치자의 권한은 potestas(행정적 힘)다. 로마의 법률에서 auctoritas(권위)는 potestas(권력)보다 우세했다. 어떠한 좋은 국가에서(in any good state) 입법은 행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한 편으로 겔라시우스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세함을 암시했다. 그는 황제를 교회의 업무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한 즉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원했으나 입법기관(교회)이 행정(황제)에 힘을 부여한다(전원을 준한다)는 암시의 허점을 남겼다. 암브로스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무리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의 도덕성을 위반하는 경우 그가 왕에 간섭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겔라시우스의 측면에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auctoritas(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겔라시우스의 이론은 정신적이고 일시적인(temporal, 시간적인) 힘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의 권한을 부여받아 두 가지의 명령으로 위탁되었으며, 각각 그 영역에서 최고이자 독립되어 있다고 보아 황제교황주의의 비잔틴 시스템에 대항하여 논쟁에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황제를 넘어(통해) 교황 패권의 교리에 그것의 확대를 허용함을 의미했다. 겔라시우스의 이론은 (로마)교황의 지위와 상황에 따라 그의 영향이 중도적이거나 급진적일 수 있도록 조직된 교리를 부여했다. 8세기까지 로마 교황의 지위는 겔라시우스의 이론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비잔틴 황제에 의해 심한 압력을 받던 교황권은 왕실의 통제로부터 교회의 관할권의 독립을 주장하기에 적합했다. 이러한 주장을 적용하기 위한 투쟁은 길고 힘들었고, 결국 그것은 제한된 성공만을 남겼다. 그러나 8세기와 9세기 교황권은 겔라시우스의 이론의 급진적인 측면의 사용을 만들기 시작했다. 11세기 교황 그레고리 VII는 겔라시우스의 이론으로부터 교회와 국가의 분리뿐만 아니라 교황의 권한이 모든 왕에 대해 우월함을 요구하는, 전적으로 급진적인 영향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겔라시우스의 이론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어거스틴 주의(Augustinianism)의 정치적인 두 가지 유산을 볼 수 없는가? 어거스틴은 (교회가 반영된) the Heavenly City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있음을 함축했다. 이는 또한 겔라시우스의 이론의 중도적인 측면에서의 그의 관점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또한 국가의 도덕적인 제재가 본래 갖추어진 것이 아닌 the Heavenly City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겔라시우스는 황제의 권력이 그의 이론의 급진적인 버전에서 말하는 교황의 권위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6세기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기초는 (그리스도교)교부철학의 시대에 놓였다. 이후에 신정군주제의 아이디어와 겔라시우스의 이론 사이의 오랜 갈등뿐만 아니라 겔라시우스의 교리의 적당한(중도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측면에서의 긴장을 검토한다. 12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부활까지 교회와 국가 관계의 모든 분쟁은 이러한 정치 이론을 따라 주장되었다.
교회가 그 구성원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수단을 소유한 것과 신성의 법률적(형식적) 개념을 보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난과 속죄의 교리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달라져왔는지 알 수 있다.
속죄에 대한 그레고리의 가르침은 교회에 의해 제도화되었고, 오늘날과 같이 중세의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속죄는 4단계로 나타나는데, 첫째 죄와 신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지각, 둘째 (가장 중요한) 죄지음에 대한 후회 또는 뉘우침, 셋째 안수 목사에 고백과 후회하는 일에 대한 의도적인 굴욕, 마지막으로 범하고 고백했던 죄에 대해 만족(변제)을 주는 속죄의 실질적 행동이다.
만족(변제)이란 상당히 다양하다. 이는 교회에 대한 기부, 교회를 대신하는 물리적 수고, 순례, 또는 심지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예술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세후기에는 루터가 맹렬히 비난한 유명한 방종과 같이 어떠한 논쟁의 관행은 제도화된 속죄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속죄는 종교나 목적과 같이 심리적인 소리를 갖고 있다. 이는 교회 구성원이 많은 죄들에 대한 용서를 얻도록 허락하고 그로 인해 그의 영혼의 안전과 앞으로의 삶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도록 기대하는 것이 허락됨을 다시 보장하였다. 그레고리의 속죄에 대한 교리를 통해, 교회는 어거스틴의 인류의 운명에 대한 깊은 염세주의를 누그러뜨렸다. 사실, 이는 낙관적인, 그래서 빠르게 중세 사회에 더 어필할 수 있는 종교로 라틴 그리스도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5세기에 그리스도교 교부의 교리가 갖는 의미가 발전되었다는 것의 또 다른 문화적 전면은 정치적인 이론이다. 5세기 교황 겔라시우스 1세(Gelasius Ⅰ)는 지난 10년 동안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의 의견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치적인 이론을 공식화하고자 하였다. 겔라시우스는 492년에서 496년까지 교황이었다. 이때 교황과 황제 사이에 분열이 있었음은 명백했다. 비잔틴 교회와 황제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 이교의 교리를 채택하였고 겔라시우스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교황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파문하였고 황제의 권력의 모든 기초를 공격하였다. 그는 세속과 정식적 권한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갔다. 그는 성경에 왕과 사제였던 Melchizedek과 그리스도를 비유하며,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교회와 국가가 나누어져왔다고 말했다. 세계에는 두 권위의 기관이 있는데 신성한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 성직자와 왕실의 권력을 가진 왕과 황제가 그것이다.
교회의 권한은 auctoritas(법률을 제정)인 반면 세속적 통치자의 권한은 potestas(행정적 힘)다. 로마의 법률에서 auctoritas(권위)는 potestas(권력)보다 우세했다. 어떠한 좋은 국가에서(in any good state) 입법은 행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한 편으로 겔라시우스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세함을 암시했다. 그는 황제를 교회의 업무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한 즉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원했으나 입법기관(교회)이 행정(황제)에 힘을 부여한다(전원을 준한다)는 암시의 허점을 남겼다. 암브로스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무리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의 도덕성을 위반하는 경우 그가 왕에 간섭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겔라시우스의 측면에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auctoritas(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겔라시우스의 이론은 정신적이고 일시적인(temporal, 시간적인) 힘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의 권한을 부여받아 두 가지의 명령으로 위탁되었으며, 각각 그 영역에서 최고이자 독립되어 있다고 보아 황제교황주의의 비잔틴 시스템에 대항하여 논쟁에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황제를 넘어(통해) 교황 패권의 교리에 그것의 확대를 허용함을 의미했다. 겔라시우스의 이론은 (로마)교황의 지위와 상황에 따라 그의 영향이 중도적이거나 급진적일 수 있도록 조직된 교리를 부여했다. 8세기까지 로마 교황의 지위는 겔라시우스의 이론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비잔틴 황제에 의해 심한 압력을 받던 교황권은 왕실의 통제로부터 교회의 관할권의 독립을 주장하기에 적합했다. 이러한 주장을 적용하기 위한 투쟁은 길고 힘들었고, 결국 그것은 제한된 성공만을 남겼다. 그러나 8세기와 9세기 교황권은 겔라시우스의 이론의 급진적인 측면의 사용을 만들기 시작했다. 11세기 교황 그레고리 VII는 겔라시우스의 이론으로부터 교회와 국가의 분리뿐만 아니라 교황의 권한이 모든 왕에 대해 우월함을 요구하는, 전적으로 급진적인 영향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겔라시우스의 이론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어거스틴 주의(Augustinianism)의 정치적인 두 가지 유산을 볼 수 없는가? 어거스틴은 (교회가 반영된) the Heavenly City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있음을 함축했다. 이는 또한 겔라시우스의 이론의 중도적인 측면에서의 그의 관점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또한 국가의 도덕적인 제재가 본래 갖추어진 것이 아닌 the Heavenly City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겔라시우스는 황제의 권력이 그의 이론의 급진적인 버전에서 말하는 교황의 권위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6세기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기초는 (그리스도교)교부철학의 시대에 놓였다. 이후에 신정군주제의 아이디어와 겔라시우스의 이론 사이의 오랜 갈등뿐만 아니라 겔라시우스의 교리의 적당한(중도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측면에서의 긴장을 검토한다. 12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부활까지 교회와 국가 관계의 모든 분쟁은 이러한 정치 이론을 따라 주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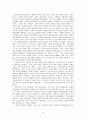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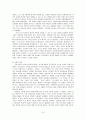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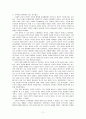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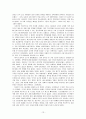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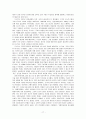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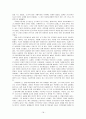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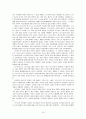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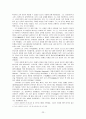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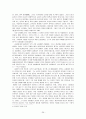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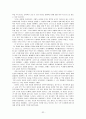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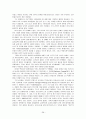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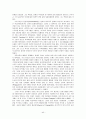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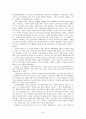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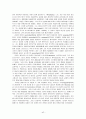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