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들쑥날쑥 비뚤비뚤 말이 아닌 모양이 대부분이다. 도공의 눈으로도 분명 그 모양이 한 몸으로 만든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챘을 것인데, 도공은 짐짓 모르는 채 그냥 내버려두었다. 그러다보니 기형의 좌우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래 위의 비율도 어색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제멋대로인 모양이 그 나름의 조형미를 뿜어낸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부조화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까?
김지하는 올바른 균형을 ‘기우뚱한 것’이라 하였다. ‘기우뚱한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균형이라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5:5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현상이 5:5가 되는 순간 곧 그 균형이 깨어져 버린다. 세상에서 5:5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죽은 것이다. 5:5의 비율이 지속되면 그것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움직임마저 없는 그야말로 죽은 상태가 된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유지한다. 그렇기에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균형은 기우뚱하다. 2:8, 3:7, 6:4. 달항아리의 조형미는 이러한 기우뚱한 균형미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공의 상상력은 언뜻 불편해 보이는 이 기우뚱함이 갖고 있는 틈과 역동성을 보았던 것이다. 좌우의 완벽한 대칭이 주는 지루함과 고요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이야기도 끼어들 공간이 없다. 조선의 달항아리를 만든 도공들은 완벽함을 포기하고 이 포근하고 여유로운 기우뚱함을 빚어내었다. 조선 도공의 상상력은 불완전함의 여유가 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알아챈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Ⅲ. 나가는 말
한국의 도자기는 정치(精緻)하고 그 모습은 건강하다. 자연을 깊게 호흡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기능미를 위주로 하였으므로 번잡한 기교와 다양한 색채로 장식하려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단순한 색조와 형태, 대범한 조형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
한국의 도공들은 나무물레의 일렁임 물레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흙을 좌우 대칭의 원기둥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기구이다. 물레의 생명은 균형인데 현대의 물레는 금속재질로 되어 있으며 엔진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돌림판의 균형이 기계적으로 정확하다. 그러나 옛날 나무물레(목물레)는 나무를 깎아 만들었고, 회전력을 주는 아랫부분에 무거운 나무통이나 돌을 붙여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목물레의 회전판의 균형은 그리 정확한 편이 아니었고, 회전도 도공의 한쪽 발로 차서 돌리는 것이었기에 도공의 몸 또한 흔들림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의 옛 도자기들은 정확한 좌우대칭이 아니다. 그리고 구연부 부분도 자세히 보면 높낮이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불균형의 상태가 자연스러운 조형미를 보이는 우리나라 옛 도자기의 맛을 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과 재료가 주는 한계들을 애써 극복하려 하지 않았다. 서구에서 상상력을 인간 뇌 활동의 과정으로 이해해왔던 것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세계와 나를 구태여 구분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흐름에 동화되면서 우주와 교감하는 것을 창조적 상상력으로 보았다. 한국의 옛 도공들도 이러한 동양적 상상력의 이해의 맥락 속에 있다. 그들은 자연과 사람(인공)이 만나 만들어 내는 도자 제조과정에서 사람이 자연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재료의 한 부분이라 여기면서, 재료와 재료가 만나면서 빚어지는 순간의 틈을 너그러이 용납할 수 있는 포용력과 여유를 가졌던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자료
강경숙, 한국도자사, 예경,2012
김영원, 조선시대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2003
김지하, 김지하전빕2권, 실청문학사,2001
유홍준 외, 알기쉬운 한국도자사, 학고재, 2001
김지하는 올바른 균형을 ‘기우뚱한 것’이라 하였다. ‘기우뚱한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균형이라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5:5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현상이 5:5가 되는 순간 곧 그 균형이 깨어져 버린다. 세상에서 5:5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죽은 것이다. 5:5의 비율이 지속되면 그것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움직임마저 없는 그야말로 죽은 상태가 된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유지한다. 그렇기에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균형은 기우뚱하다. 2:8, 3:7, 6:4. 달항아리의 조형미는 이러한 기우뚱한 균형미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공의 상상력은 언뜻 불편해 보이는 이 기우뚱함이 갖고 있는 틈과 역동성을 보았던 것이다. 좌우의 완벽한 대칭이 주는 지루함과 고요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이야기도 끼어들 공간이 없다. 조선의 달항아리를 만든 도공들은 완벽함을 포기하고 이 포근하고 여유로운 기우뚱함을 빚어내었다. 조선 도공의 상상력은 불완전함의 여유가 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알아챈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Ⅲ. 나가는 말
한국의 도자기는 정치(精緻)하고 그 모습은 건강하다. 자연을 깊게 호흡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기능미를 위주로 하였으므로 번잡한 기교와 다양한 색채로 장식하려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단순한 색조와 형태, 대범한 조형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
한국의 도공들은 나무물레의 일렁임 물레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흙을 좌우 대칭의 원기둥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기구이다. 물레의 생명은 균형인데 현대의 물레는 금속재질로 되어 있으며 엔진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돌림판의 균형이 기계적으로 정확하다. 그러나 옛날 나무물레(목물레)는 나무를 깎아 만들었고, 회전력을 주는 아랫부분에 무거운 나무통이나 돌을 붙여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목물레의 회전판의 균형은 그리 정확한 편이 아니었고, 회전도 도공의 한쪽 발로 차서 돌리는 것이었기에 도공의 몸 또한 흔들림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의 옛 도자기들은 정확한 좌우대칭이 아니다. 그리고 구연부 부분도 자세히 보면 높낮이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불균형의 상태가 자연스러운 조형미를 보이는 우리나라 옛 도자기의 맛을 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과 재료가 주는 한계들을 애써 극복하려 하지 않았다. 서구에서 상상력을 인간 뇌 활동의 과정으로 이해해왔던 것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세계와 나를 구태여 구분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흐름에 동화되면서 우주와 교감하는 것을 창조적 상상력으로 보았다. 한국의 옛 도공들도 이러한 동양적 상상력의 이해의 맥락 속에 있다. 그들은 자연과 사람(인공)이 만나 만들어 내는 도자 제조과정에서 사람이 자연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재료의 한 부분이라 여기면서, 재료와 재료가 만나면서 빚어지는 순간의 틈을 너그러이 용납할 수 있는 포용력과 여유를 가졌던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자료
강경숙, 한국도자사, 예경,2012
김영원, 조선시대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2003
김지하, 김지하전빕2권, 실청문학사,2001
유홍준 외, 알기쉬운 한국도자사, 학고재, 2001
추천자료
 한국 온라인 게임의 현재와 미래
한국 온라인 게임의 현재와 미래 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 비교
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 비교 지방자치와 지역축제-이천도자기 축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축제-이천도자기 축제를 중심으로 도자기의 종류
도자기의 종류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 사례(지역축제, 이벤트축제)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 사례(지역축제, 이벤트축제) 도자기의 이해 레포트
도자기의 이해 레포트  [사회과학] 이천도자기축제
[사회과학] 이천도자기축제 [도자기][도자기 종류][도자기의 제작단계][도자기의 제작공정][도자기의 제작기법][테라코타...
[도자기][도자기 종류][도자기의 제작단계][도자기의 제작공정][도자기의 제작기법][테라코타... 도자공예
도자공예 고려청자의 발생 및 제작과정, 종류와 역사적 의의
고려청자의 발생 및 제작과정, 종류와 역사적 의의 [정책평가론]정책평가사례 -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사례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정책 ...
[정책평가론]정책평가사례 -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사례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정책 ... 세계의 도자기
세계의 도자기  [인간과사회A형] 나의 삶이나 주변의 일 가운데 구체적인 사안이나 쟁점 혹은 사건 사회학적 ...
[인간과사회A형] 나의 삶이나 주변의 일 가운데 구체적인 사안이나 쟁점 혹은 사건 사회학적 ... 도자기 박물관 견학후기
도자기 박물관 견학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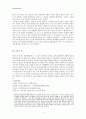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