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용비어천가」의 내용과 형식
1. 들어가며
2. 「용비어천가」의 개관
3. 내용 구조
4. 형식 구조
5. 철학적 구조
6. 나오며
II. 「용비어천가」의 교육적 의의와 교육 실태
1. 교육적 의의
2. 교육 실태
3. 종합
III. 「용비어천가」 교수 ․ 학습 방법
1. 기존 연구 소개
2. 교수 ․ 학습 방법 제안
1. 들어가며
2. 「용비어천가」의 개관
3. 내용 구조
4. 형식 구조
5. 철학적 구조
6. 나오며
II. 「용비어천가」의 교육적 의의와 교육 실태
1. 교육적 의의
2. 교육 실태
3. 종합
III. 「용비어천가」 교수 ․ 학습 방법
1. 기존 연구 소개
2. 교수 ․ 학습 방법 제안
본문내용
, 노래에 나타난 사연을 이해하자면 해설을 참고해야 하는 것이 이 작품을 서사시로 보는데 다소 장애가 된다. 때문에 단편적인 영웅시의 집합 같으며, 순수한 서사시라기보다 교술적인 서사시라고 해야 마땅하다.
③ 악장으로서의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이 제작됨으로써 조선왕조는 전대에 없었던 시가 형태를 창조해 내었으니 그것이 곧 ‘악장’ 이라는 시형이었다.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왕도의 이전과 신흥 국가의 왕업을 찬양하기 위한 송가 頌歌는 궁중 의식이나 종묘 제전에서 연주되는 음악의 곡률에 맞추어 노래로 불려졌던 것이다. 이 후 훈민정음의 창제로 말미암아 국문자의 실용이 요청됨에 따라 그 첫 사업으로 조선왕조의 조상을 신성화하고 왕업의 영원무궁을 기원하며 군왕의 덕화를 찬송하기 위하여 <용가>가 지어졌고, 이어서 불타의 은총을 찬송하기 위하여 석가모니의 일대를 노래로 엮은 <월인천강지곡>이 제작되었다. 이런 일련의 시가들은 전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형으로서 그것을 악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문학 시가의 한 장르로 간주하고 있다.
의 제작이 요구된 것이다. 정병욱, 앞의 책, p.150. 참조.
樂章이란 원래 가곡을 의미하는 악부의 별칭이다. 그러나 노래는 같은 노래이로되 일선 민간에서 유행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정에서 쓰이는 궁중노래를 이렇게 부른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 國字가 제정되어 이제는 우리말로 시가를 마음대로 표기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써 궁중 정악에 쓸 수 있는 악장이라는 독특한 하나의 노래체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악장이 바로 「용비어천가」이다. 이는 樂에 있어 與民樂이라 불러 조정의 宗廟祭樂에 중요한 악장으로서 길이 쓰였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이 제정되자 맨 처음에 그것을 이 표기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조윤제, 앞의 책, pp.126~129. 참조.
「용비어천가」는 주해를 통해서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난해하기에 자세히 검사하지 않으면 구조의 주도면밀함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특별한 체계나 질서 없이 단지 중국 사적과 이조 사적을 짝지어 늘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면 치밀한 질서와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용비어천가」는 음악에 얹어 부르기 위해 지었다. 세종 27년 唐樂에 맞추어 보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으며, 세종29년 2월에 수정, 완성하고서 동년 5월에는 관현에 調音하여 致和平, 醉豊亨, 來儀, 與民樂 등의 악보를 만들어 公私燕饗에 쓰게 한 것을 봐서도 음악이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국문가사 중에서도 리듬을 맞추기 위한 흔적을 역력히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문가사 중 각행 하구의 앞부분은 거의 漢詩句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를 풀어서 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옮겨 놓은 것은 분명히 노래의 가락을 염두에 두고 「용비어천가」를 지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용비어천가」의 국문가사는 용가한시의 逐譯 에 가깝다. 그래서 문장이 단조롭고 한시의 산문화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한시를 먼저 짓고 이를 번역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상호 보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 「용비어천가」는 육조의 王業艱難과 성덕 및 천명에 의한 개국을 송영하고 후왕을 規戒한 소위 악장으로서 宗祖祭樂으로, 혹은 공사연향에 쓰인 것인 만큼 가송에 謙讓, 극존칭 및 존칭이 사용되었고 그런 까닭에 「용비어천가」의 서술어는 보통 문장의 그것보다 다소 길다.
3. 내용적 구조
「용비어천가」의 내용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견해는 국문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데 구조에 따라 각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본고에서는 김문기 교수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3단 구조
◆ 조윤제, 김기동
서사 : 제1장 / 본사 : 제2장~109장 / 결사 : 제110장~125장
◆ 김상억, 장덕순, 조동일
서사 : 제1~2장 / 본사 : 제3장~109장/ 결사 : 제110장~125장
◆ 김사엽, 김선아, 고영희, P.H.Lee
서사 : 제1~2장 / 본사 : 제3장~124장 / 결사 : 제125장
◆ 박찬수
서사 : 제1장 / 본사 : 제2장~124장 / 결사 : 제125장
◆ 성기옥
서 사 : 제1장~16장 (주제중심의 논리적 짜임)
본사 : 제17장~109장 (서사적 짜임)
결사 : 제110장~125장 (주제중심의 논리적 짜임)
4단 구조
◆ 김문기
기사(起詞) : 제1장 (총서)
승사(承詞) : 제2장~109장 (제1,2차 가영)
전사(轉詞) : 제110장~124장 (제3차 가영)
결사(結詞) : 제125장 (총결)
◆ 조규익
교술적 화자 : 제1장~2장 (건국의 지극한 원리 제시)
서사적 화자 : 제3장~109장 (조종의 행적 제시한 서사(敍事)적 부분)
교술적 화자 : 제110장~124장 (서사부분에서 도출된 교훈을 반복 제시)
교술적 화자 : 제125장 (전체를 요약 반복하여 결말지음)
3단 틀 내의 5단 구조로 보는 경우
◆ 양태순
서사 : 제1장
본사 : 서사 제2장 / 본사 제3장~109장 / 결사 - 제110장~124장
결사 : 제125장
(1) 전체구조
「용비어천가」의 창작자로 알려져 있는 정인지, 권제, 안지 등은 <용가>의 서(序), 전(箋) 및 발(跋)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고, 소(所)찬(撰)내용만을 간략히 말하였다.
정인지의 용비어천가 서(序)에는
“태조, 태종이 즉위한 이후의 심인과 선정은 능히 다 말할 수 없어 다만 왕위에 오르기 전의 덕행과 사업을 모으고 열성(列星)들이 닦은 왕업의 심원함을 미루어 실덕(實德)을 가리켜 읊었는데, 이를 반복(反覆), 영탄(詠嘆)함으로써 왕업의 간난(艱難)함을 드러내었습니다. “太祖太宗 卽位以後 深意善政 則莫名言 只撮潛邸時德行事業 推本列星肇基之遠 指陳實德反復詠嘆 以著王業之艱難.” 「용비어천가서」, 前揭影印本 p.8
라고 했으며, 권제의 용비어천가 전(箋)에서는,
“목조(穆祖)가 왕업의 기틀을 연 때로부터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제사적(諸事蹟)의 기위(奇偉)함을 찾아 빠뜨리지 않고 왕업의 간난함을 모두 갖추어 읊었습니다.”
라고 하여, 왕업의 간난함을
③ 악장으로서의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이 제작됨으로써 조선왕조는 전대에 없었던 시가 형태를 창조해 내었으니 그것이 곧 ‘악장’ 이라는 시형이었다.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왕도의 이전과 신흥 국가의 왕업을 찬양하기 위한 송가 頌歌는 궁중 의식이나 종묘 제전에서 연주되는 음악의 곡률에 맞추어 노래로 불려졌던 것이다. 이 후 훈민정음의 창제로 말미암아 국문자의 실용이 요청됨에 따라 그 첫 사업으로 조선왕조의 조상을 신성화하고 왕업의 영원무궁을 기원하며 군왕의 덕화를 찬송하기 위하여 <용가>가 지어졌고, 이어서 불타의 은총을 찬송하기 위하여 석가모니의 일대를 노래로 엮은 <월인천강지곡>이 제작되었다. 이런 일련의 시가들은 전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형으로서 그것을 악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문학 시가의 한 장르로 간주하고 있다.
의 제작이 요구된 것이다. 정병욱, 앞의 책, p.150. 참조.
樂章이란 원래 가곡을 의미하는 악부의 별칭이다. 그러나 노래는 같은 노래이로되 일선 민간에서 유행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정에서 쓰이는 궁중노래를 이렇게 부른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 國字가 제정되어 이제는 우리말로 시가를 마음대로 표기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써 궁중 정악에 쓸 수 있는 악장이라는 독특한 하나의 노래체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악장이 바로 「용비어천가」이다. 이는 樂에 있어 與民樂이라 불러 조정의 宗廟祭樂에 중요한 악장으로서 길이 쓰였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이 제정되자 맨 처음에 그것을 이 표기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조윤제, 앞의 책, pp.126~129. 참조.
「용비어천가」는 주해를 통해서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난해하기에 자세히 검사하지 않으면 구조의 주도면밀함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특별한 체계나 질서 없이 단지 중국 사적과 이조 사적을 짝지어 늘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면 치밀한 질서와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용비어천가」는 음악에 얹어 부르기 위해 지었다. 세종 27년 唐樂에 맞추어 보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으며, 세종29년 2월에 수정, 완성하고서 동년 5월에는 관현에 調音하여 致和平, 醉豊亨, 來儀, 與民樂 등의 악보를 만들어 公私燕饗에 쓰게 한 것을 봐서도 음악이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국문가사 중에서도 리듬을 맞추기 위한 흔적을 역력히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문가사 중 각행 하구의 앞부분은 거의 漢詩句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를 풀어서 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옮겨 놓은 것은 분명히 노래의 가락을 염두에 두고 「용비어천가」를 지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용비어천가」의 국문가사는 용가한시의 逐譯 에 가깝다. 그래서 문장이 단조롭고 한시의 산문화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한시를 먼저 짓고 이를 번역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상호 보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 「용비어천가」는 육조의 王業艱難과 성덕 및 천명에 의한 개국을 송영하고 후왕을 規戒한 소위 악장으로서 宗祖祭樂으로, 혹은 공사연향에 쓰인 것인 만큼 가송에 謙讓, 극존칭 및 존칭이 사용되었고 그런 까닭에 「용비어천가」의 서술어는 보통 문장의 그것보다 다소 길다.
3. 내용적 구조
「용비어천가」의 내용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견해는 국문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데 구조에 따라 각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본고에서는 김문기 교수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3단 구조
◆ 조윤제, 김기동
서사 : 제1장 / 본사 : 제2장~109장 / 결사 : 제110장~125장
◆ 김상억, 장덕순, 조동일
서사 : 제1~2장 / 본사 : 제3장~109장/ 결사 : 제110장~125장
◆ 김사엽, 김선아, 고영희, P.H.Lee
서사 : 제1~2장 / 본사 : 제3장~124장 / 결사 : 제125장
◆ 박찬수
서사 : 제1장 / 본사 : 제2장~124장 / 결사 : 제125장
◆ 성기옥
서 사 : 제1장~16장 (주제중심의 논리적 짜임)
본사 : 제17장~109장 (서사적 짜임)
결사 : 제110장~125장 (주제중심의 논리적 짜임)
4단 구조
◆ 김문기
기사(起詞) : 제1장 (총서)
승사(承詞) : 제2장~109장 (제1,2차 가영)
전사(轉詞) : 제110장~124장 (제3차 가영)
결사(結詞) : 제125장 (총결)
◆ 조규익
교술적 화자 : 제1장~2장 (건국의 지극한 원리 제시)
서사적 화자 : 제3장~109장 (조종의 행적 제시한 서사(敍事)적 부분)
교술적 화자 : 제110장~124장 (서사부분에서 도출된 교훈을 반복 제시)
교술적 화자 : 제125장 (전체를 요약 반복하여 결말지음)
3단 틀 내의 5단 구조로 보는 경우
◆ 양태순
서사 : 제1장
본사 : 서사 제2장 / 본사 제3장~109장 / 결사 - 제110장~124장
결사 : 제125장
(1) 전체구조
「용비어천가」의 창작자로 알려져 있는 정인지, 권제, 안지 등은 <용가>의 서(序), 전(箋) 및 발(跋)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고, 소(所)찬(撰)내용만을 간략히 말하였다.
정인지의 용비어천가 서(序)에는
“태조, 태종이 즉위한 이후의 심인과 선정은 능히 다 말할 수 없어 다만 왕위에 오르기 전의 덕행과 사업을 모으고 열성(列星)들이 닦은 왕업의 심원함을 미루어 실덕(實德)을 가리켜 읊었는데, 이를 반복(反覆), 영탄(詠嘆)함으로써 왕업의 간난(艱難)함을 드러내었습니다. “太祖太宗 卽位以後 深意善政 則莫名言 只撮潛邸時德行事業 推本列星肇基之遠 指陳實德反復詠嘆 以著王業之艱難.” 「용비어천가서」, 前揭影印本 p.8
라고 했으며, 권제의 용비어천가 전(箋)에서는,
“목조(穆祖)가 왕업의 기틀을 연 때로부터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제사적(諸事蹟)의 기위(奇偉)함을 찾아 빠뜨리지 않고 왕업의 간난함을 모두 갖추어 읊었습니다.”
라고 하여, 왕업의 간난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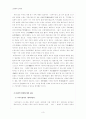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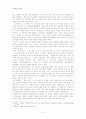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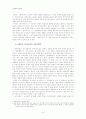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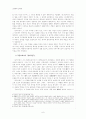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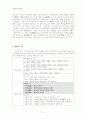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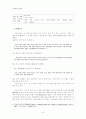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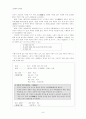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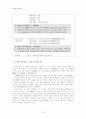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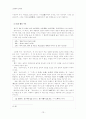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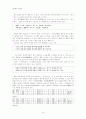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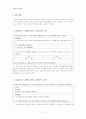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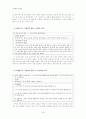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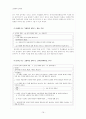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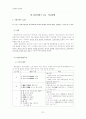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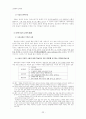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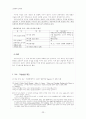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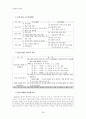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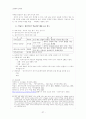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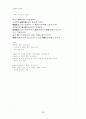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