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기존의 연구동향
1. 작품 주변 연구
1) 작자연구
2) 창작 시기 연구
3) 자료의 발굴과 검토
Ⅱ. 본론
가) 선군과 숙영낭자의 적강
나) 선군과 낭자의 결혼
다) 선군과 낭자의 이별
Ⅲ. 결론
참고문헌
(1) 기존의 연구동향
1. 작품 주변 연구
1) 작자연구
2) 창작 시기 연구
3) 자료의 발굴과 검토
Ⅱ. 본론
가) 선군과 숙영낭자의 적강
나) 선군과 낭자의 결혼
다) 선군과 낭자의 이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반으로서의 체면의식의 절정이다. 어찌 됐든 선군은 아내의 죽음을 알게 되고 몹시 슬퍼한다. 과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까지 했는데, 그로 인해 낭자가 죽기까지 했으니 선군의 입장으로선 과거를 원망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과거 보기를 강요한 부모 또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다.
선군은 낭자의 자살 내력을 캐내고 모해자인 매월과 돌쇠를 처단하게 된다. 노비의 흉계에 넘어간 백공부부는 어리석게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불효는 묻혀짇고 대신 백공은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작품은 부모와 선군의 갈등이 주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는 크게는 강요된 유교의식 대 인간 본연의 애정과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를 비판하고 자식은 감싸주는 식의 작품 구조를 볼 수 있었다.
Ⅲ. 결론
작품이 창작된 조선은 유교를 국가통치이념의 근간으로 삼는다. 효는 지고한 이념으로 숭앙되었고, 그에 반해 남녀간의 애정은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게 바로 현실세계에서 보여지는 삶의 실상이다. 그러나 작중세계는 늘 현실세계를 초월하고 전복하고자 한다. 문학작품을 통한 대리만족의 강도가 셀수록 그 작품은 민중들에게 환영받는 작품이고 오랫동안 구전되어 작품의 생명력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작중세계에서는 기존 현실세계의 정상적인 논리를 뒤엎곤 한다. 부자간의 갈등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효윤리보다는 남녀간의 애정쪽에 작자는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 작자가 말하고 싶어했던 것은 유교라는 사회적 이념과 개인의 욕구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냐 하는 것이었다. 자녀의 불효를 나무라는 것이 아닌 부모의 억압쪽에 비판의 초점을 두었다.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그릇되고 왜곡된 유교의식의 폐해였던 것이다.
법, 제도, 이념이란 것은 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 법, 제도, 이념은 개인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는 자제하도록 규제화되어 있다. 이런 규제화를 통해 개인의 필요와 욕구는 어느 정도 통제되고 나아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법, 제도, 이념인 것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이러한 것들이 역으로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렬(1999년), 『숙영낭자전연구』, 역락
장덕순(1994년), 『한국고전문학대계12』, 집문당
김태준(1999년), 『朝鮮小說史』, 예문
선군은 낭자의 자살 내력을 캐내고 모해자인 매월과 돌쇠를 처단하게 된다. 노비의 흉계에 넘어간 백공부부는 어리석게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불효는 묻혀짇고 대신 백공은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작품은 부모와 선군의 갈등이 주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는 크게는 강요된 유교의식 대 인간 본연의 애정과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를 비판하고 자식은 감싸주는 식의 작품 구조를 볼 수 있었다.
Ⅲ. 결론
작품이 창작된 조선은 유교를 국가통치이념의 근간으로 삼는다. 효는 지고한 이념으로 숭앙되었고, 그에 반해 남녀간의 애정은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게 바로 현실세계에서 보여지는 삶의 실상이다. 그러나 작중세계는 늘 현실세계를 초월하고 전복하고자 한다. 문학작품을 통한 대리만족의 강도가 셀수록 그 작품은 민중들에게 환영받는 작품이고 오랫동안 구전되어 작품의 생명력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작중세계에서는 기존 현실세계의 정상적인 논리를 뒤엎곤 한다. 부자간의 갈등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효윤리보다는 남녀간의 애정쪽에 작자는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 작자가 말하고 싶어했던 것은 유교라는 사회적 이념과 개인의 욕구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냐 하는 것이었다. 자녀의 불효를 나무라는 것이 아닌 부모의 억압쪽에 비판의 초점을 두었다.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그릇되고 왜곡된 유교의식의 폐해였던 것이다.
법, 제도, 이념이란 것은 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 법, 제도, 이념은 개인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는 자제하도록 규제화되어 있다. 이런 규제화를 통해 개인의 필요와 욕구는 어느 정도 통제되고 나아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법, 제도, 이념인 것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이러한 것들이 역으로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렬(1999년), 『숙영낭자전연구』, 역락
장덕순(1994년), 『한국고전문학대계12』, 집문당
김태준(1999년), 『朝鮮小說史』,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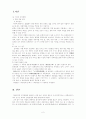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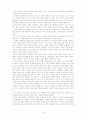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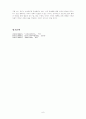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