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해자로 나오는 연안, 지원은 여느 여고생과 다를 바가 없다. 적당히 발랄하고, 발랑 까졌으며 집단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잔인할 정도로 배타적이다.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감정에 솔직한 아이들이다. 그리고 효신을 좋아하는 고형석 선생은 집단 밖에서 떠도는 이방인인 효신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속물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가진 캐릭터다. 그러나 효신은 그를 시은보다 사랑하지 못했고, 그는 너무 순진했기에 스스로 죽음을 맞는다.
이들로 꾸려져 나가는 메멘토 모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두 주인공들에게 행사되는, 단체가 소수자에게 행사하는 억압이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는 집단에 원만히 섞이지 못하는 효신과 시은이라는 개인을 배척한다. 또한 그들의 관계성에 대한 억압, 즉 동성애에 대한 억압은 거의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냉혹하고 무자비하다. 유난히 권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한국 사회는 암묵적인 획일성을 강제한다. 도덕성이란 명목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를 강요하며, 룰에서 일탈한 사람은 사회적 소양이 부족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이렇듯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받아온 사회적 훈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도덕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이 비도덕의 명분아래 규탄 받고 멸시되는 것이 바로 동성애이다. 사회생활을 거치며 은연중에 형성된 사회적 도덕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 동성애를 배척한다. 동성애는 개인의 한 존재방식이며 자유로운 선택이며 존중받아야할 사생활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다수집단의 이 ‘비정상적인 소수집단’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은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폭력은 영화 곳곳에서 표현된다. 연안은 효신에게 레즈비언 냄새가 난다고 조롱하며, 생일을 적어둔 게시판에 적혀진 시은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효신에게는 우유팩 세례가 이어진다. 그리고 시은은 효신을 외면하고, 효신은 자살한다. 억압을 가했던 집단은 막연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안고 있으며 아이들은 영화 제목 그대로 메멘토 모리, 효신의 죽음을 기억한다. 메멘토 모리가 호러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은 여기에서도 비롯되었는데, 효신은 죽고 나서 원혼이 되어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혹은 자신을 외면했던 시은에게 보복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효신의 유령은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으며, 실재하지도 않는다. 그녀가 죽은 후에 등장하는 그녀의 모습들은, 죄책감을 가진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자신들이 몰아세운 죽음의 희생양에 대한 환상인 것이다. 그 영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신과 시은의 교환일기를 가진 민아이다. 효신이 죽은 뒤, 밤늦은 시간, 아이들은 계속해서 무의식적인 두려움에 붉은 새, 갑자기 열리는 문 같은 불길한 징후들을 읽는다. 그리고 다소 전형적인 ‘귀신이 피아노를 친다’는 클리세로 그 동안 학교에 쌓여왔던 죄의식과 두려움, 막연한 공포심이 폭발한다. 아이들은 히스테릭한 패닉상태에 빠져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죽은 효신의 복수가 아닌, 아이들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무의식적 죄의식과 두려움이 폭발하여 만들어낸 환상인 것이다. 이 꽤나 현실적인 호러영화는 피와 죽음의 남발 없이도 사회의 억압과 그 파국을 개연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패닉이 진행되는 영화 후반부에 누군가의 환상일지 모를 이야기가 잠깐 나온다. 중앙 홀에 효신과 시은이 손을 맞잡고 서있다. 중앙 홀 양쪽 계단에, 그리고 홀 아래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박수를 치고 있다. 초에 불을 붙인 케
이들로 꾸려져 나가는 메멘토 모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두 주인공들에게 행사되는, 단체가 소수자에게 행사하는 억압이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는 집단에 원만히 섞이지 못하는 효신과 시은이라는 개인을 배척한다. 또한 그들의 관계성에 대한 억압, 즉 동성애에 대한 억압은 거의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냉혹하고 무자비하다. 유난히 권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한국 사회는 암묵적인 획일성을 강제한다. 도덕성이란 명목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를 강요하며, 룰에서 일탈한 사람은 사회적 소양이 부족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이렇듯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받아온 사회적 훈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도덕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이 비도덕의 명분아래 규탄 받고 멸시되는 것이 바로 동성애이다. 사회생활을 거치며 은연중에 형성된 사회적 도덕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 동성애를 배척한다. 동성애는 개인의 한 존재방식이며 자유로운 선택이며 존중받아야할 사생활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다수집단의 이 ‘비정상적인 소수집단’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은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폭력은 영화 곳곳에서 표현된다. 연안은 효신에게 레즈비언 냄새가 난다고 조롱하며, 생일을 적어둔 게시판에 적혀진 시은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효신에게는 우유팩 세례가 이어진다. 그리고 시은은 효신을 외면하고, 효신은 자살한다. 억압을 가했던 집단은 막연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안고 있으며 아이들은 영화 제목 그대로 메멘토 모리, 효신의 죽음을 기억한다. 메멘토 모리가 호러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은 여기에서도 비롯되었는데, 효신은 죽고 나서 원혼이 되어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혹은 자신을 외면했던 시은에게 보복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효신의 유령은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으며, 실재하지도 않는다. 그녀가 죽은 후에 등장하는 그녀의 모습들은, 죄책감을 가진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자신들이 몰아세운 죽음의 희생양에 대한 환상인 것이다. 그 영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신과 시은의 교환일기를 가진 민아이다. 효신이 죽은 뒤, 밤늦은 시간, 아이들은 계속해서 무의식적인 두려움에 붉은 새, 갑자기 열리는 문 같은 불길한 징후들을 읽는다. 그리고 다소 전형적인 ‘귀신이 피아노를 친다’는 클리세로 그 동안 학교에 쌓여왔던 죄의식과 두려움, 막연한 공포심이 폭발한다. 아이들은 히스테릭한 패닉상태에 빠져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죽은 효신의 복수가 아닌, 아이들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무의식적 죄의식과 두려움이 폭발하여 만들어낸 환상인 것이다. 이 꽤나 현실적인 호러영화는 피와 죽음의 남발 없이도 사회의 억압과 그 파국을 개연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패닉이 진행되는 영화 후반부에 누군가의 환상일지 모를 이야기가 잠깐 나온다. 중앙 홀에 효신과 시은이 손을 맞잡고 서있다. 중앙 홀 양쪽 계단에, 그리고 홀 아래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박수를 치고 있다. 초에 불을 붙인 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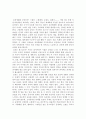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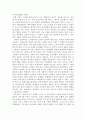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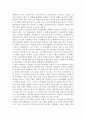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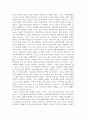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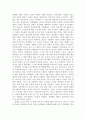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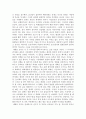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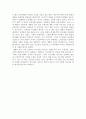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