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일본근대국가 형성과 명치32년
3. 명치 32년(1899)의 기독교 통제법령분석
1) 神道이외의 宗敎宣布 및 殿堂會堂 등에 관한 규정
2) 사립학교령과 문부성훈령 제12호
3) 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4. 맺음말
2. 일본근대국가 형성과 명치32년
3. 명치 32년(1899)의 기독교 통제법령분석
1) 神道이외의 宗敎宣布 및 殿堂會堂 등에 관한 규정
2) 사립학교령과 문부성훈령 제12호
3) 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4. 맺음말
본문내용
나 認可(민법시행법 제19조 1항) 혹은 설립허가(민법 제71조)를 얻은 조건에 위반하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 사유를 상세하게 갖추어 문부대신에 보고.
<표 3>「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상위법인 민법과 민법시행법의 법인관련 규정보다 오히려 통제적인 성격이 강화된 법령으로, 민법의 설립요건 보다 강화된 법인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은 祭祀,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목적의 사단ㆍ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행위를 갖출 것이다. 그 중 설립행위부분과 관련하여 사단ㆍ재단법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資産과 社員에 관한 설립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각종 법인관련 사항의 보고의무들을 신설했으며, 특히 지방장관과 문부대신을 통한 2중의 통제망을 설치했다. 이 법령은 1904년 문부성령 제23호로 개정되었고 이때 제5조와 6조가 삭제되어 지방장관의 감독, 검사권한은 없어졌지만 지방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1900년 2월 22일 설립된 침례교傳道師團을 시작으로 재일본장로교선교사 社團(1901 . 11. 8. 설립), 재일본남장로교선교사 社團(1902. 1. 28), 재일본회중교회선교사 社團(1901. 7. 7), 재일본남감리교선교사 社團(1903. 12. 19) 등 각종 외국선교회들이 사단ㆍ재단법인형태로 설립되었고,『宗敎要覽』, 文部省宗敎局, 1916.
이들 법인들은「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4. 맺음말
명치 32년의 기독교 통제와 관련된 일련의 법령들은 헌법을 위시한 근대법 체제와 대외적인 불평등 조약개정의 완료를 배경으로 국가적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한 일본이 내놓은 최초의 기독교 통제 법령들이다. 근대국가의 모범으로,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설정된 서구열강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자신감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특히 조약개정작업의 완료를 촉진한 주요 계기였던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대외적인 국가위상의 강화와 대내적인 보수적 국가주의의 유행을 불러일으켜 이같은 정책(법제)을 뒷받침했다. 또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완성하자마자 통제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했을 만큼 기독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위기의식과 천황제 국가를 확립하려는 의지는 강했다고도 할 수 있다.
명치 32년의 기독교 통제법령들을 통해 명치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단에 대한 통제로서 포교자의 이력과 변경사항을 관할 지방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官이 포교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통로를 만들었고 종교용도의 장소확대를 까다로운 요건을 두어 제한했다. 둘째, 사립학교 자체의 설립과 폐지 뿐 아니라 교원자격, 수업내용, 설비에 까지 간섭하여 사립학교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학교 내 종교의식과 교육금지로 기독교 포교의 가장 큰 통로인 학교자체의 존립목적을 무용화하려 했다. 셋째, 법인성립요건의 강화로 기독교 단체의 법적 지위획득을 규제하고 재산상황과 조직에 대한 파악과 함께 국가통제하로의 포섭ㆍ관리를 의도했음 알 수 있다.
근대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이후 명치정부가 근대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내놓은 이들 기독교법령들은 처음 등장부터 상당히 광범위한 통제의 그물망을 형성했다고 보인다. 한편 이러한 주요 법령들이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체계인 ‘행정명령’의 형태로 공포되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神道이외의 宗敎宣布 및 殿堂會堂 등에 관한 규정」은 여론과 의회 내의 반대로 번번이 제정이 좌절되었던 「종교단체법」의 대신에 활용되었다.「문부성 훈령 제12호」는 「私立學校令案」제17조로 입안되었다가 여론과 서양세력의 반대로 법령에서는 빠진 대신 문부대신의 훈령형식으로 공포되어 활용되었다. 「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역시 민법과 민법시행법에서는 제외되었던 요건사항의 강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와 여론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행정명령들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세력에 대해 당시 명치정부가 지녔던 자신감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보수반동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자유민권 - 입헌주의 - 민본주의 운동으로 전개되는 자유주의적인 세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흐름은 日本史에서 大正데모크라시기를 끝으로 좌절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이후 일본정부의 기독교 정책도 파시즘화된 昭和시기의 국가체제하에서 장애물 없는 통제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良熊太 편, 『現行育法令』第1編, 岩村田活版所, 1900.
宮田四八郞,『民法施行法講義』, 大日本新法典講習會, 1901.
高松泰介 편,『現行育法令』, 有斐閣, 1902.
『民法判例集』, 靑木法律事務所, 東京, 有斐閣, 1910.
『宗敎要覽』, 文部省宗敎局, 1916.
三淵忠彦, 『日本民法新講』, 梓書房, 1929.
今泉眞幸, 『日本組合基督敎會』, 東方書院, 1934.
宗敎行政硏究會 편,『宗敎法令類纂』, 棚澤書店, 1934.
敎育史編纂會 편,『明治以降敎育制度發達史』, 東京: 文部省, 1938.
比屋根安定,『日本基督敎史』, 5권, 敎文館, 1940.
『コンサイス法律學用語辭典』, 三省堂, 2004.
隅谷三喜男,『近代日本の形成とキリスト敎』, 新敎出版社, 1961.
石井良助, 『일본의 근대화와 제도』, 구병삭 역, 교학연구사, 1981.
福島正夫 편, 『日本近代法體制の形成』上ㆍ下, 日本評論社, 1982.
도히아키오,『일본기독교사』, 김수진 역, 기독교문사, 1991.
윤혜원,『일본기독교의 역사적성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서정민,『한일기독교관계사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2.
마리우스 B. 잰슨,『현대일본을 찾아서』2, 김우영 등 역, 이산, 2006.
김창록, “식민지 피지배기 법제의 기초”, 「법제연구」, 제8호, 1995.
표세만, “메이지시대의 내지잡거”,「일본어문학」, 39, 2008.
그 사유를 상세하게 갖추어 문부대신에 보고.
<표 3>「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상위법인 민법과 민법시행법의 법인관련 규정보다 오히려 통제적인 성격이 강화된 법령으로, 민법의 설립요건 보다 강화된 법인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은 祭祀,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목적의 사단ㆍ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행위를 갖출 것이다. 그 중 설립행위부분과 관련하여 사단ㆍ재단법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資産과 社員에 관한 설립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각종 법인관련 사항의 보고의무들을 신설했으며, 특히 지방장관과 문부대신을 통한 2중의 통제망을 설치했다. 이 법령은 1904년 문부성령 제23호로 개정되었고 이때 제5조와 6조가 삭제되어 지방장관의 감독, 검사권한은 없어졌지만 지방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1900년 2월 22일 설립된 침례교傳道師團을 시작으로 재일본장로교선교사 社團(1901 . 11. 8. 설립), 재일본남장로교선교사 社團(1902. 1. 28), 재일본회중교회선교사 社團(1901. 7. 7), 재일본남감리교선교사 社團(1903. 12. 19) 등 각종 외국선교회들이 사단ㆍ재단법인형태로 설립되었고,『宗敎要覽』, 文部省宗敎局, 1916.
이들 법인들은「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4. 맺음말
명치 32년의 기독교 통제와 관련된 일련의 법령들은 헌법을 위시한 근대법 체제와 대외적인 불평등 조약개정의 완료를 배경으로 국가적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한 일본이 내놓은 최초의 기독교 통제 법령들이다. 근대국가의 모범으로,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설정된 서구열강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자신감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특히 조약개정작업의 완료를 촉진한 주요 계기였던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대외적인 국가위상의 강화와 대내적인 보수적 국가주의의 유행을 불러일으켜 이같은 정책(법제)을 뒷받침했다. 또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완성하자마자 통제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했을 만큼 기독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위기의식과 천황제 국가를 확립하려는 의지는 강했다고도 할 수 있다.
명치 32년의 기독교 통제법령들을 통해 명치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단에 대한 통제로서 포교자의 이력과 변경사항을 관할 지방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官이 포교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통로를 만들었고 종교용도의 장소확대를 까다로운 요건을 두어 제한했다. 둘째, 사립학교 자체의 설립과 폐지 뿐 아니라 교원자격, 수업내용, 설비에 까지 간섭하여 사립학교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학교 내 종교의식과 교육금지로 기독교 포교의 가장 큰 통로인 학교자체의 존립목적을 무용화하려 했다. 셋째, 법인성립요건의 강화로 기독교 단체의 법적 지위획득을 규제하고 재산상황과 조직에 대한 파악과 함께 국가통제하로의 포섭ㆍ관리를 의도했음 알 수 있다.
근대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이후 명치정부가 근대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내놓은 이들 기독교법령들은 처음 등장부터 상당히 광범위한 통제의 그물망을 형성했다고 보인다. 한편 이러한 주요 법령들이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체계인 ‘행정명령’의 형태로 공포되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神道이외의 宗敎宣布 및 殿堂會堂 등에 관한 규정」은 여론과 의회 내의 반대로 번번이 제정이 좌절되었던 「종교단체법」의 대신에 활용되었다.「문부성 훈령 제12호」는 「私立學校令案」제17조로 입안되었다가 여론과 서양세력의 반대로 법령에서는 빠진 대신 문부대신의 훈령형식으로 공포되어 활용되었다. 「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역시 민법과 민법시행법에서는 제외되었던 요건사항의 강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와 여론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행정명령들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세력에 대해 당시 명치정부가 지녔던 자신감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보수반동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자유민권 - 입헌주의 - 민본주의 운동으로 전개되는 자유주의적인 세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흐름은 日本史에서 大正데모크라시기를 끝으로 좌절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이후 일본정부의 기독교 정책도 파시즘화된 昭和시기의 국가체제하에서 장애물 없는 통제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良熊太 편, 『現行育法令』第1編, 岩村田活版所, 1900.
宮田四八郞,『民法施行法講義』, 大日本新法典講習會, 1901.
高松泰介 편,『現行育法令』, 有斐閣, 1902.
『民法判例集』, 靑木法律事務所, 東京, 有斐閣, 1910.
『宗敎要覽』, 文部省宗敎局, 1916.
三淵忠彦, 『日本民法新講』, 梓書房, 1929.
今泉眞幸, 『日本組合基督敎會』, 東方書院, 1934.
宗敎行政硏究會 편,『宗敎法令類纂』, 棚澤書店, 1934.
敎育史編纂會 편,『明治以降敎育制度發達史』, 東京: 文部省, 1938.
比屋根安定,『日本基督敎史』, 5권, 敎文館, 1940.
『コンサイス法律學用語辭典』, 三省堂, 2004.
隅谷三喜男,『近代日本の形成とキリスト敎』, 新敎出版社, 1961.
石井良助, 『일본의 근대화와 제도』, 구병삭 역, 교학연구사, 1981.
福島正夫 편, 『日本近代法體制の形成』上ㆍ下, 日本評論社, 1982.
도히아키오,『일본기독교사』, 김수진 역, 기독교문사, 1991.
윤혜원,『일본기독교의 역사적성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서정민,『한일기독교관계사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2.
마리우스 B. 잰슨,『현대일본을 찾아서』2, 김우영 등 역, 이산, 2006.
김창록, “식민지 피지배기 법제의 기초”, 「법제연구」, 제8호, 1995.
표세만, “메이지시대의 내지잡거”,「일본어문학」, 39,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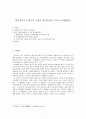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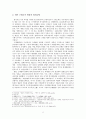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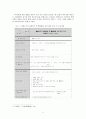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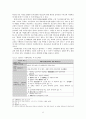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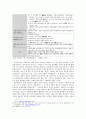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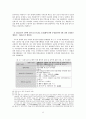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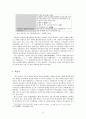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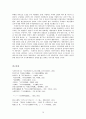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