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 부분을 말하고 싶다. 그 중‘단’의 개념은 처음 들어보는 개념으로 매우 신선했다.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의 의미로 나누어 잘 풀어주었다. ‘단’과 ‘한’이 잘 비교되어서 개념이 머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개념으로 설명이 더 나와 있었으면 했다. 내게는 듣기 생소한 개념이기에, 읽다가도 ‘단이 그래서 뭐지?’라고 말하게 되었다. 단은 자기부정이고 사회의 변혁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비해 ‘한’은 아는 개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독자로서는 단보다는 한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건설) _ 내 교육 현장에 적용
: 이 책을 통해 가장 인상 깊게 읽고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제 3부 대안적 교육모델>에서의 제 7장 中 ‘비판적 삶의 동반자’와 ‘변혁적 지식인’이다. 현재 교회학교 유년부를 맡고 있는 유년부사역자로서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었다. 교역자 - 교사의 관계와 교사 - 학생의 관계를 다시 재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교사들이 다 청년들이라서 청년대 청년으로 관계가 애매했다. 하지만, 나는 교역자로서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막중하다. 교역자 - 교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비판적 삶의 동반자’로 상호간의 존재해야 한다. 즉, 서로가 주체자로 있으면서, 비판 의식을 개발하며, 동반자의 관계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참여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인 협동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동역자의 개념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나아가서 교사 학생과의 관계도 아주 잘 정리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한국 교육의 물들어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었다. 주체자로서의 학생이 아닌, 은행식 교육으로 학생을 몰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 대화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을 ‘사랑’이라는 하나의 개념만으로 아이들을 품었던 것 같다. 억누르는 자의 의식이 강했던 나조차 반성하면서, 학생들이 앎의 주체자이며, 교사 학생의 관계가 수평적임을 재정립해야겠다. 끝으로, 교사교육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사교육은 내게는 상황과 환경으로 너무 불리했다. 하지만, 그 교사들에게 소명감과 전문성을 꾸준히 요구해야할 것을 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를 위해서 늘 교사교육을 힘써야 겠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영성의 공동체’부분은 가장 나의 마음을 녹이는 부분이었다. 신앙공동체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부분으로서, 내게 공동체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너무나 주옥같은 말씀들이었다. ‘친절한 공간’,‘연대성’, ‘경계를 넘나드는’ 사실 현실과 다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 부족하고 할 것이 많음을 깨닫는다. 저런 공동체를 하기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또, 나는 이 부분을 읽고나서 내가 맡고있는 청년부 양육팀을 생각해보았다. ‘친절한 공간’을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으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늘 서로의 돌봄과 차이성을 인정하려고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을 강조할 것을 생각해본다.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알기위해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만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임 가운데에 교제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목적’을 설립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죽을 것을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건설) _ 내 교육 현장에 적용
: 이 책을 통해 가장 인상 깊게 읽고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제 3부 대안적 교육모델>에서의 제 7장 中 ‘비판적 삶의 동반자’와 ‘변혁적 지식인’이다. 현재 교회학교 유년부를 맡고 있는 유년부사역자로서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었다. 교역자 - 교사의 관계와 교사 - 학생의 관계를 다시 재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교사들이 다 청년들이라서 청년대 청년으로 관계가 애매했다. 하지만, 나는 교역자로서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막중하다. 교역자 - 교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비판적 삶의 동반자’로 상호간의 존재해야 한다. 즉, 서로가 주체자로 있으면서, 비판 의식을 개발하며, 동반자의 관계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참여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인 협동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동역자의 개념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나아가서 교사 학생과의 관계도 아주 잘 정리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한국 교육의 물들어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었다. 주체자로서의 학생이 아닌, 은행식 교육으로 학생을 몰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 대화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을 ‘사랑’이라는 하나의 개념만으로 아이들을 품었던 것 같다. 억누르는 자의 의식이 강했던 나조차 반성하면서, 학생들이 앎의 주체자이며, 교사 학생의 관계가 수평적임을 재정립해야겠다. 끝으로, 교사교육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사교육은 내게는 상황과 환경으로 너무 불리했다. 하지만, 그 교사들에게 소명감과 전문성을 꾸준히 요구해야할 것을 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를 위해서 늘 교사교육을 힘써야 겠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영성의 공동체’부분은 가장 나의 마음을 녹이는 부분이었다. 신앙공동체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부분으로서, 내게 공동체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너무나 주옥같은 말씀들이었다. ‘친절한 공간’,‘연대성’, ‘경계를 넘나드는’ 사실 현실과 다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 부족하고 할 것이 많음을 깨닫는다. 저런 공동체를 하기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또, 나는 이 부분을 읽고나서 내가 맡고있는 청년부 양육팀을 생각해보았다. ‘친절한 공간’을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으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늘 서로의 돌봄과 차이성을 인정하려고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을 강조할 것을 생각해본다.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알기위해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만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임 가운데에 교제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목적’을 설립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죽을 것을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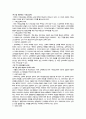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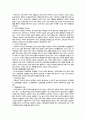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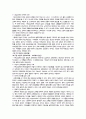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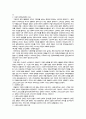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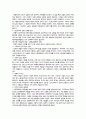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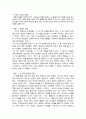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