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녀는 단순히 사회적인 시선을 통해 영화의 흐름이 과격한 선동의 가락으로 흘러가기를 거부한다. 사회적인 비판적 목소리를 내다가도 갑자기 자기 자신의 옛 기억을 말하거나, 카메라에 담긴 사람들의 만남과 연애 시절에 대해서 묻기를 주저 않기도 한다. 그리하여 작품을 사회선동, 비판적인 영화로 머물게 하는 것이라 사회적 문제의 제기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삶 그리고 추억처럼 나긋한 기억들을 같이 얘기하여 우리의 삶을 설명한다.
아녜스는 언제나 전통적인 영화기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해온 감독이다. 그의 극영화들과 다큐멘터리들은 사실과 허구, 개인과 사회, 객관과 주관 어느 한편에 얽매이지 않고 경계를 자유롭게 오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의 영화들은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전개되기보다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 풍요롭게 갈라지고 만나는 이야기들에 가깝다. 바르다가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무질서하고 꿈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처럼, 그의 영화도 다양한 요소들이 충돌하고 어울리며 숨 쉬는 세계다.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는 그런 기질과 작업 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녀는 사진, 그림, 영상, 현실을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촬영 도중 홍수가 나거나 차가 달리는 도로를 동물들이 가로막아도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 좋다고 표현한다. 그녀에게 모든 우연한 순간들은 영화적 재료가 된다. 그는 쓸모없는 재료들을 버리고 쳐내는 대신 이들 사이에서 작은 연결고리를 발견해서 꿰매는 감독이다. 정해진 틀 없이 직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며 찍은 영화지만, 그렇게 모은 삶의 무질서한 편린들이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 대한 독창적이고 살아 있는 초상을 만들어낸다.
그녀는 낡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은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 날것의 진실은 현대의 이삭 줍는 사람들, 즉 옥외시장이 파한 후 찌꺼기를 챙기거나,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는 이 다큐멘터리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 바르다는 주변부로 몰려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한다. 그들은 세계 정치와 개인적 비극에 대해 유창하게 이야기하며 영화는 그
두 개의 기둥이 결코 멀리 떨어진 게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녀의 영화는 다큐멘터리적 시사성과 시적인 극적영화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녹록치 않은 문제들은 예술의 치유적 특성과, 어디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음식과 은신처를 구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욕구를 배경으로 매끄럽게 병치된다. 그 결과 사회비평이자 여행기이며 동시에 인간의 융통성에 대한 감상적이지 않은 찬사인 한 편의 저항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삭 줍는 사람과 나」에는 바르다 자신의 필멸성에 대한 명상도 스며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은 감상적으로 연민을 자아내기보다는 인생의 장애를 헤쳐나가는 모든 사람은 일종의 예술가라는 이 영화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아녜스는 언제나 전통적인 영화기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해온 감독이다. 그의 극영화들과 다큐멘터리들은 사실과 허구, 개인과 사회, 객관과 주관 어느 한편에 얽매이지 않고 경계를 자유롭게 오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의 영화들은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전개되기보다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 풍요롭게 갈라지고 만나는 이야기들에 가깝다. 바르다가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무질서하고 꿈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처럼, 그의 영화도 다양한 요소들이 충돌하고 어울리며 숨 쉬는 세계다.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는 그런 기질과 작업 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녀는 사진, 그림, 영상, 현실을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촬영 도중 홍수가 나거나 차가 달리는 도로를 동물들이 가로막아도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 좋다고 표현한다. 그녀에게 모든 우연한 순간들은 영화적 재료가 된다. 그는 쓸모없는 재료들을 버리고 쳐내는 대신 이들 사이에서 작은 연결고리를 발견해서 꿰매는 감독이다. 정해진 틀 없이 직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며 찍은 영화지만, 그렇게 모은 삶의 무질서한 편린들이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 대한 독창적이고 살아 있는 초상을 만들어낸다.
그녀는 낡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은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 날것의 진실은 현대의 이삭 줍는 사람들, 즉 옥외시장이 파한 후 찌꺼기를 챙기거나,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는 이 다큐멘터리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 바르다는 주변부로 몰려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한다. 그들은 세계 정치와 개인적 비극에 대해 유창하게 이야기하며 영화는 그
두 개의 기둥이 결코 멀리 떨어진 게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녀의 영화는 다큐멘터리적 시사성과 시적인 극적영화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녹록치 않은 문제들은 예술의 치유적 특성과, 어디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음식과 은신처를 구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욕구를 배경으로 매끄럽게 병치된다. 그 결과 사회비평이자 여행기이며 동시에 인간의 융통성에 대한 감상적이지 않은 찬사인 한 편의 저항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삭 줍는 사람과 나」에는 바르다 자신의 필멸성에 대한 명상도 스며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은 감상적으로 연민을 자아내기보다는 인생의 장애를 헤쳐나가는 모든 사람은 일종의 예술가라는 이 영화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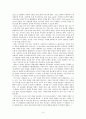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