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가깝다.
우선 그는 「현대시의 황혼-김기림론」에서 시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를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분히 감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설의 오만한 표정’, ‘출판물의 악취’등을 외부적 요인으로 파악한 것은 논리적으로 바람직한 전개라고 보기 힘들다. 내부적 요인은 과도하게 자신의 정조를 바치면서 음악성을 추구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어가 가진 음악적 측면을 내어좆고 그 자리에 현대의 지성을 도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과학적 사고에 의한 지성과 정서의 조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어 그는 「서정시의 문제」에서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을 배격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자연발생적인 운문을 부정하고 현대 문명세계의 새로운 가치관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시라는 것은 현대의 지성과 정신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생산되며 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새로운 가치관을 담기 위해서는 정신의 혁명이 필요하고 이것은 시 형태의 혁신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다. 시의 소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학발달로 야기된 새로운 문명에 대한 비평적 태도는 형태의 혁명 외에도 도시적 감수성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적 배경과 도시어는 이러한 그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4. 문학사적 의의
김광균은 감상적 정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지의 회화적 기법을 사용한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회화적 기법을 통해 도시공간의 서정성을 노래하고 심리적 현상까지도 시각화하는 이미지즘의 시를 쓴 이미지스트로서의 면모도 드러난다. 종합하면 그는 도시적 감수성과 문명비판적인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서정적 내면 공간을, 참신한 비유적 기교와 세련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데 성공한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작가 스스로 자신의 경향을 주지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작품들은 다분히 주정적이고 서정적이며 지나치게 감상성에 빠져있다. 이러한 주관적 감정의 과잉 상태 권영민(2009),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라는 비판에서 김광균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회화성에 치중한 나머지 시의 견고성이나 정서의 압축에 그만큼 소홀했다 조동민(1983),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 출처는 각주에 표기한 관계로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는 「현대시의 황혼-김기림론」에서 시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를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분히 감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설의 오만한 표정’, ‘출판물의 악취’등을 외부적 요인으로 파악한 것은 논리적으로 바람직한 전개라고 보기 힘들다. 내부적 요인은 과도하게 자신의 정조를 바치면서 음악성을 추구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어가 가진 음악적 측면을 내어좆고 그 자리에 현대의 지성을 도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과학적 사고에 의한 지성과 정서의 조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어 그는 「서정시의 문제」에서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을 배격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자연발생적인 운문을 부정하고 현대 문명세계의 새로운 가치관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시라는 것은 현대의 지성과 정신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생산되며 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새로운 가치관을 담기 위해서는 정신의 혁명이 필요하고 이것은 시 형태의 혁신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다. 시의 소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학발달로 야기된 새로운 문명에 대한 비평적 태도는 형태의 혁명 외에도 도시적 감수성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적 배경과 도시어는 이러한 그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4. 문학사적 의의
김광균은 감상적 정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지의 회화적 기법을 사용한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회화적 기법을 통해 도시공간의 서정성을 노래하고 심리적 현상까지도 시각화하는 이미지즘의 시를 쓴 이미지스트로서의 면모도 드러난다. 종합하면 그는 도시적 감수성과 문명비판적인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서정적 내면 공간을, 참신한 비유적 기교와 세련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데 성공한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작가 스스로 자신의 경향을 주지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작품들은 다분히 주정적이고 서정적이며 지나치게 감상성에 빠져있다. 이러한 주관적 감정의 과잉 상태 권영민(2009),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라는 비판에서 김광균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회화성에 치중한 나머지 시의 견고성이나 정서의 압축에 그만큼 소홀했다 조동민(1983),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 출처는 각주에 표기한 관계로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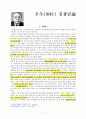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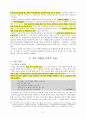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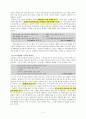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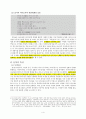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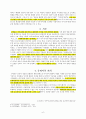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