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공수부대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까지 낳은 김영선이라는 여자가 역시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다에 투신하여 죽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원이라는 극단적인 성격이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이들이 死後婚을 통해 부부가 되는 과정이 소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맺힌 것은 풀어사제라. 총각 죽은 몽달귀신이나 처녀 죽은 처녀귀신은 원귀가 되아도 젤로 험한 원귀가 된다는디. 그런 귀신들이 뭣 땀새 그렇게 험한 원귀가 되았것소. 시집 못 가고 장개 못 간 것도 한이제마는 자식이 없으면 지사를 못받아 묵은께 그것이 더 한이랍디다.” 송기숙, p. 229.
저승혼사를 성사시켜야 하는 필연성을 전통적 사고를 빌어 강변하고 있는 장면이다. 無子鬼가 鬼로 간주되었던 것은 이미 주나라시대부터도 존재했던 鬼有所歸 乃不爲 (春秋左傳 昭公 七年條)
동양의 뿌리 깊은 민간의식이다. 조상숭배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한편 뒤집어보면 후손계승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종족유지란 본능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인 만큼 그 심리적 강도는 달리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의식이 종교문화적으로 전도되어 나타난 것이 동양의 조상숭배사상이라고 했을 때, 그 강도는 훨씬 더해질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자식없이 죽은 사람에 대한 원귀관은 민속적 사고의 원형적 층위를 맡아왔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신랑 신부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에 맞춰 광목 위에서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장구를 맨 젊은 당골이 중중몰이가락으로 휘돌자 악공들의 풍악소리도 한결 신명이 나고 지전타래를 휘두르는 늙은 당골의 춤사위가 판을 휘어잡았다. 늙은 당골의 춤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전타래가 훌쩍 치솟았다가 활짝 펴지고 위아래로 엇갈리다가 휘딱 꺾어 돌았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춤사위에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송기숙, p.315.
신랑 김성보와 신부 김영선의 사후혼이 치루어지는 무속의 현장이 묘사되고 있는 장면이다. 삶의 세계, 세속적인 세계에서 이들 신랑 신부는 합환 불능의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무속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저승의 세계, 신성한 세계에서 그들은 부부의 연을 이렇게 맺고 있다. 저승길을 상징하는 광목 위에 그들은 신랑 신부로 길닦음의 의식을 받고 있다.
씻김굿은 너와 나를 합하는 기능을 하고 대승적 일체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 씻김굿은 풀림을 위해 놀아지고 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맺힌 것은 풀어사제라. 총각 죽은 몽달귀신이나 처녀 죽은 처녀귀신은 원귀가 되아도 젤로 험한 원귀가 된다는디. 그런 귀신들이 뭣 땀새 그렇게 험한 원귀가 되았것소. 시집 못 가고 장개 못 간 것도 한이제마는 자식이 없으면 지사를 못받아 묵은께 그것이 더 한이랍디다.” 송기숙, p. 229.
저승혼사를 성사시켜야 하는 필연성을 전통적 사고를 빌어 강변하고 있는 장면이다. 無子鬼가 鬼로 간주되었던 것은 이미 주나라시대부터도 존재했던 鬼有所歸 乃不爲 (春秋左傳 昭公 七年條)
동양의 뿌리 깊은 민간의식이다. 조상숭배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한편 뒤집어보면 후손계승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종족유지란 본능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인 만큼 그 심리적 강도는 달리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의식이 종교문화적으로 전도되어 나타난 것이 동양의 조상숭배사상이라고 했을 때, 그 강도는 훨씬 더해질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자식없이 죽은 사람에 대한 원귀관은 민속적 사고의 원형적 층위를 맡아왔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신랑 신부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에 맞춰 광목 위에서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장구를 맨 젊은 당골이 중중몰이가락으로 휘돌자 악공들의 풍악소리도 한결 신명이 나고 지전타래를 휘두르는 늙은 당골의 춤사위가 판을 휘어잡았다. 늙은 당골의 춤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전타래가 훌쩍 치솟았다가 활짝 펴지고 위아래로 엇갈리다가 휘딱 꺾어 돌았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춤사위에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송기숙, p.315.
신랑 김성보와 신부 김영선의 사후혼이 치루어지는 무속의 현장이 묘사되고 있는 장면이다. 삶의 세계, 세속적인 세계에서 이들 신랑 신부는 합환 불능의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무속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저승의 세계, 신성한 세계에서 그들은 부부의 연을 이렇게 맺고 있다. 저승길을 상징하는 광목 위에 그들은 신랑 신부로 길닦음의 의식을 받고 있다.
씻김굿은 너와 나를 합하는 기능을 하고 대승적 일체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 씻김굿은 풀림을 위해 놀아지고 있다.
추천자료
 산신신앙에 관하여
산신신앙에 관하여 조선 시대의 풍수지리
조선 시대의 풍수지리 고려시대 민간신앙과 도교와의 습합
고려시대 민간신앙과 도교와의 습합 외국어로서 한국어학습과 한국문화의 소개 방안
외국어로서 한국어학습과 한국문화의 소개 방안 [점복의 기원][점복의 의미][점복의 기능][점복의 유형][사주팔자][풍수지리][풍수사상][풍수...
[점복의 기원][점복의 의미][점복의 기능][점복의 유형][사주팔자][풍수지리][풍수사상][풍수... [신앙 유형][신앙 자유][신앙 신비][신앙과 상상력][신앙과 의인화][신앙과 민속신앙][신앙과...
[신앙 유형][신앙 자유][신앙 신비][신앙과 상상력][신앙과 의인화][신앙과 민속신앙][신앙과... [풍수][풍수지리설]풍수(풍수지리설)의 형태, 풍수(풍수지리설)의 용어, 풍수(풍수지리설)의 ...
[풍수][풍수지리설]풍수(풍수지리설)의 형태, 풍수(풍수지리설)의 용어, 풍수(풍수지리설)의 ... [민속신앙][민간신앙][신앙][민속신앙 의미][가신신앙][민속신앙종류][무속신앙]민속신앙(민...
[민속신앙][민간신앙][신앙][민속신앙 의미][가신신앙][민속신앙종류][무속신앙]민속신앙(민... 한국종교의 특성 _ 다종교 공존현상, 수용적 관용적 자세, 감정적 열정적 신앙, 현세적 기복...
한국종교의 특성 _ 다종교 공존현상, 수용적 관용적 자세, 감정적 열정적 신앙, 현세적 기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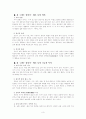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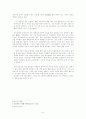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