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리고 방아로다 에헤
4.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구선 갈팡질팡한다
° 에헤 에헤 어랴 얼럴럴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5. 조선 여덟도 유명탄 돌은 경북궁 짓는데 주춧돌감이로다
° 에헤 에헤 어랴 얼럴럴거리고 방아로다
6. 근정전을 드높게 짓고 만조 백관이 조하를 드리네
° 에헤 에헤 어랴 얼럴럴거리고 방아로다
<작품설명>
서울지방의 민요이다. 자진타령장단으로 변화 있게 장단을 쳐주고 가사 붙임도 당김음식으로 붙여 나가기 때문에 경쾌하고 박진감 있다. 경복궁타령은 고종 2년(1865) 대원군이 오랫동안 황폐한 채 내려오던 경복궁을 중건할 무렵부터 불려진 선소리로 주로 남자 소리꾼들에 의해서 야외에서 불려졌다.
경복궁타령은 간단하면서 경쾌한 노래이다. 원 마루와 후렴 마루의 선율이 같고 시작 부분을 질러 내듯이 높은 음역으로 부르기 때문에 힘차고 박력 있게 들린다.
조선 말기인 1865년(고종 2) 대원군(大院君)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부터 불린 노동요로 지은이·연대 미상이다. 그 후 독자적인 선소리[立唱]의 하나로 불리게 되었는데, 사설 중 “우광꿍꽝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 데 회(灰)방아 찧는 소리다…”라는 대목으로 보아 회방아를 찧으면서 부른 방아타령의 일종이라 하겠다. 대원군이 경복궁을 고쳐 지을 때에 생겨나서 소리꾼들의 손에 차츰 세련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창 부분의 가사가 방아타령의 후렴과 같이 \"방아로다\"로 끝나는 점이 이채롭다. 이 노래가 생겨난 배경이 경복궁 중건을 원망하는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견해와, 경복궁을 짓는 작업 과정에서 일의 능률을 높이는 \'노작가\'의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나중의 견해가 더 옳다.
가사 내용은 “…을축사월(乙丑四月) 갑자일(甲子日)에 경복궁을 이룩했네…”에서 보듯이 ‘갑자·을축’을 ‘을축·갑자’로 엇바꿔놓아 정치의 본말을 어긴 점을 은근히 풍자하고 있다. 자진타령 장단에 5음계 구성으로 선율형은 난봉가 계통 민요와 비슷하다.
노래의 짜임새 자체와 분위기가 씩씩하고 경쾌해서 비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경기 민요 가운데서도 장단이 매우 빠르고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에헤\"하고 두 장단에 걸쳐 길게 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꿋꿋한 기상과 긴박감이 넘친다.
(9) 매화타령
1.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상사난이란다
°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2. 안방 건너방 가로닫이 국화 새김에 놘자 무늬란다
°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3. 어저께 밤에도 나가 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무삼 염치로 삼승 버선에 볼받아 달랍나
°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4. 나 돌아갑네 나 돌아갑네 떨떨 거리고 나 돌아 가노라
°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더야 어허야아 에~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작품설명>
옛날부터 꽃을 노래한 꽃타령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뛰어난 것이 이 〈매화타령〉이다. <매화가>라고도 한다. 그러나 12가사 중의 하나인 《매화가》와는 전혀 다르다. 경기잡가의 하나인 《달거리[月齡歌]》의 후반부와 거의 같아 《달거리》에서 떼어낸 것이거나 민요이던 것을 《달거리》 뒤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느린 4박의 굿거리장단에 의한 경쾌한 노래로, 가사 중의 매화는 꽃이 아니라 기명(妓名)이다.
서울지방 12잡가 중 한 곡인 ‘달거리’의 노랫말 중에 “좋구나 매화로다” 이하의 노래를 따로 떼어 부르던 것에서 발전한 음악으로 보고 있다. ‘매화타령’은 선조 때 평양기생 매화가 연적(戀敵) 춘설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탄식한 노래라고 한다. 따라서 곡명은 매화타령이지만 내용은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다. 굿거리장단으로 가볍고 경쾌하게 부르는 매화타령은 다른 긴잡가와 달리 가사 한 절에 후렴이 한마디씩 붙는 점이 특징적이다.
(10) 청개구리타령
1. 에- 개고리 타령 하여 보자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2. 에- 개골개골 청개고리라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성은 청가래도 뛰는 멋으로 댕긴다.
3. 에- 개천에 빠져서 허덕지덕 한다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수렁에 빠져서 만석당혜 잃었네
4. 에- 개고리 집을 찾으려면 미나리 밭으로 가거라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두꺼비 집을 찾으려면 장독대로 돌아라
5. 에- 은장도 차려다 작두 바탕을 찼네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족두리를 쓰려다가 질요강을 썼네
6. 에- 서산울대 단나무 장사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네 나무 팔아서 골동댕이나 하자
7. 에- 죽망장혜 단표자로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천리강산 쑥 들어간다.
<작품설명>
개구리타령에는 경기도 선소리에 <청개구리타령>말고도 전라도의 <개구리타령>이 있는데, <개구리타령>은 <청개구리타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http://hompy.hangame.com/index.nhn?userid=rhkdgh5979&msg=null&url=http%3a%2f%2fhompy.hangame.com%2fbbs%2findex.nhn%3fm%3dselectContent%26userid%3drhkdgh5979%26sid%3d1%26bbsid%3d24302414%26docid%3d26475282 산타령
http://blog.naver.com/greenk6701?Redirect=Log&logNo=130010113567 양산도
http://blog.naver.com/notyy?Redirect=Log&logNo=90009210044 방아노래
http://blog.naver.com/kty00kty00?Redirect=Log&logNo=70004235864 자진방아노래
http://blog.naver.com/jab3399?Redirect=Log&logNo=30004732455 경복궁타령
http://blog.naver.com/greenk6701?Redirect=Log&logNo=130004854729 매화타령
4.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구선 갈팡질팡한다
° 에헤 에헤 어랴 얼럴럴거리고 방아로다 에헤
5. 조선 여덟도 유명탄 돌은 경북궁 짓는데 주춧돌감이로다
° 에헤 에헤 어랴 얼럴럴거리고 방아로다
6. 근정전을 드높게 짓고 만조 백관이 조하를 드리네
° 에헤 에헤 어랴 얼럴럴거리고 방아로다
<작품설명>
서울지방의 민요이다. 자진타령장단으로 변화 있게 장단을 쳐주고 가사 붙임도 당김음식으로 붙여 나가기 때문에 경쾌하고 박진감 있다. 경복궁타령은 고종 2년(1865) 대원군이 오랫동안 황폐한 채 내려오던 경복궁을 중건할 무렵부터 불려진 선소리로 주로 남자 소리꾼들에 의해서 야외에서 불려졌다.
경복궁타령은 간단하면서 경쾌한 노래이다. 원 마루와 후렴 마루의 선율이 같고 시작 부분을 질러 내듯이 높은 음역으로 부르기 때문에 힘차고 박력 있게 들린다.
조선 말기인 1865년(고종 2) 대원군(大院君)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부터 불린 노동요로 지은이·연대 미상이다. 그 후 독자적인 선소리[立唱]의 하나로 불리게 되었는데, 사설 중 “우광꿍꽝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 데 회(灰)방아 찧는 소리다…”라는 대목으로 보아 회방아를 찧으면서 부른 방아타령의 일종이라 하겠다. 대원군이 경복궁을 고쳐 지을 때에 생겨나서 소리꾼들의 손에 차츰 세련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창 부분의 가사가 방아타령의 후렴과 같이 \"방아로다\"로 끝나는 점이 이채롭다. 이 노래가 생겨난 배경이 경복궁 중건을 원망하는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견해와, 경복궁을 짓는 작업 과정에서 일의 능률을 높이는 \'노작가\'의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나중의 견해가 더 옳다.
가사 내용은 “…을축사월(乙丑四月) 갑자일(甲子日)에 경복궁을 이룩했네…”에서 보듯이 ‘갑자·을축’을 ‘을축·갑자’로 엇바꿔놓아 정치의 본말을 어긴 점을 은근히 풍자하고 있다. 자진타령 장단에 5음계 구성으로 선율형은 난봉가 계통 민요와 비슷하다.
노래의 짜임새 자체와 분위기가 씩씩하고 경쾌해서 비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경기 민요 가운데서도 장단이 매우 빠르고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에헤\"하고 두 장단에 걸쳐 길게 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꿋꿋한 기상과 긴박감이 넘친다.
(9) 매화타령
1.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상사난이란다
°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2. 안방 건너방 가로닫이 국화 새김에 놘자 무늬란다
°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3. 어저께 밤에도 나가 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무삼 염치로 삼승 버선에 볼받아 달랍나
°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4. 나 돌아갑네 나 돌아갑네 떨떨 거리고 나 돌아 가노라
°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더야 어허야아 에~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작품설명>
옛날부터 꽃을 노래한 꽃타령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뛰어난 것이 이 〈매화타령〉이다. <매화가>라고도 한다. 그러나 12가사 중의 하나인 《매화가》와는 전혀 다르다. 경기잡가의 하나인 《달거리[月齡歌]》의 후반부와 거의 같아 《달거리》에서 떼어낸 것이거나 민요이던 것을 《달거리》 뒤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느린 4박의 굿거리장단에 의한 경쾌한 노래로, 가사 중의 매화는 꽃이 아니라 기명(妓名)이다.
서울지방 12잡가 중 한 곡인 ‘달거리’의 노랫말 중에 “좋구나 매화로다” 이하의 노래를 따로 떼어 부르던 것에서 발전한 음악으로 보고 있다. ‘매화타령’은 선조 때 평양기생 매화가 연적(戀敵) 춘설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탄식한 노래라고 한다. 따라서 곡명은 매화타령이지만 내용은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다. 굿거리장단으로 가볍고 경쾌하게 부르는 매화타령은 다른 긴잡가와 달리 가사 한 절에 후렴이 한마디씩 붙는 점이 특징적이다.
(10) 청개구리타령
1. 에- 개고리 타령 하여 보자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2. 에- 개골개골 청개고리라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성은 청가래도 뛰는 멋으로 댕긴다.
3. 에- 개천에 빠져서 허덕지덕 한다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수렁에 빠져서 만석당혜 잃었네
4. 에- 개고리 집을 찾으려면 미나리 밭으로 가거라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두꺼비 집을 찾으려면 장독대로 돌아라
5. 에- 은장도 차려다 작두 바탕을 찼네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족두리를 쓰려다가 질요강을 썼네
6. 에- 서산울대 단나무 장사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네 나무 팔아서 골동댕이나 하자
7. 에- 죽망장혜 단표자로
° 에헤 에헤야 야하 에허야 아무리나 하여 보자 천리강산 쑥 들어간다.
<작품설명>
개구리타령에는 경기도 선소리에 <청개구리타령>말고도 전라도의 <개구리타령>이 있는데, <개구리타령>은 <청개구리타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http://hompy.hangame.com/index.nhn?userid=rhkdgh5979&msg=null&url=http%3a%2f%2fhompy.hangame.com%2fbbs%2findex.nhn%3fm%3dselectContent%26userid%3drhkdgh5979%26sid%3d1%26bbsid%3d24302414%26docid%3d26475282 산타령
http://blog.naver.com/greenk6701?Redirect=Log&logNo=130010113567 양산도
http://blog.naver.com/notyy?Redirect=Log&logNo=90009210044 방아노래
http://blog.naver.com/kty00kty00?Redirect=Log&logNo=70004235864 자진방아노래
http://blog.naver.com/jab3399?Redirect=Log&logNo=30004732455 경복궁타령
http://blog.naver.com/greenk6701?Redirect=Log&logNo=130004854729 매화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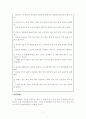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