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본문내용
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동별곡>은 단순한 여흥의 노래나 향락적인 생활을 그리는 노래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서 그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재강, “안축의 신의론적 시가론과 이상주의적 시가 작품”, 「문학과 언어」18집, 1997.)
<한림별곡>과 <관동별곡>이 같은 갈래에 속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식적인 틀이 같으며, 한문투가 주가 되고 간간히 우리말투가 섞여 있고, 작자는 상류층이고, 객관적인 경물이 대상화되어 작품속에서 개별로 나열되고 그것들을 아울러 포괄하여 노래되는 점 등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1세기 이상이나 <한림별곡>이외의 작품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한림별곡>의 탁월성이라든가 지속성으로 인하여 <관동별곡>이전까지 다른 작품을 창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집단적으로 함께 즐기는 <한림별곡>의 특징이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일치하는 것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림별곡>의 연행만으로도 향수자의 취향을 아우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다가 <관동별곡>이 창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림별곡>의 성격과 다른 점을 살펴봄으로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먼저 작자면을 보더라도 <한림별곡>은 한림제유(翰林諸儒)로서 여러 한림들이 작자가 되지만, <관동별곡>은 근재 개인이다. 이는 <한림별곡>이 연회에서 한림들이 돌아가면서 부른 돌림노래로서 시작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는 여러 문인들이 술자리에서 서로 시를 지어 주고 받았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崔滋,「補閑集」상권)
그러면서 화려함이라든가 오히려 질탕(跌宕)할 정도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집단 정서가 그대로 노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씨 무단정치 당시의 신흥사대부들의 동질성에 기인하다. 동질성이란 <한림별곡>이 창작될 때까지의 신흥사대부들은 확고한 정치적경제적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자연적으로 집단적 과시의 힘을 자긍심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관동별곡>이 창작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집단적 과시로 신흥사대부들의 위상이 정립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신흥사대부들의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나온 것이 <관동별곡>이다. 신유학을 신봉하는 신흥사대부들의 기반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리하여 현실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개인의 자긍심을 당당하게 피력할 정치적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자긍심도 현실 부조리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것의 해결책을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생겨났다. 즉, 자연에 관심을 돌려, 그 내밀한 본질을 파악하면 내부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격인’의 과정을 거칠 때 ‘생민지복(生民之福)’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현실의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동별곡>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생겨 난 것이다. 최용수, “안축의 <관동별곡>에 대하여”, 「배달말」23, (배달말학회, 1998) p.45
< 상대별곡 >
조선조 경기체가인《霜臺別曲》은 권근이 지은 것으로 『樂章歌詞』에 전해지고 있다. 《霜臺別曲》은 사헌부 관원으로서 늠름하고 호기에 넘치는 현실적 삶을 숭고한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노래한 작품인 동시에, 권근이 과거 고려의 遺臣임을 자처하면서 충주의 양촌에 은거하다가 태조의 명을 받고 出仕한 자신에 대한 변명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작품이다.
《霜臺別曲》은 景幾體歌의 장르적 전개에 있어 樂章文學的 변용의 단계를 해명하기 위한 결정적 자료로 보기도 한다. 고려조 신흥사대부의 득의에 찬 모습과 발랄하고 희망찬 세계관을 보여주던 《翰林別曲》은 조선조에 이르러 그 유교적 이상에 입각한 新王朝의 정당성과 집권층의 합리화를 드러내기 위한 樂章 문학으로 이어졌다. 《霜臺別曲》은 樂章 구실을 하는 경기체가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霜臺別曲》을 어구해석을 통해 현대어로 풀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霜臺別曲》의 형식 및 주제의식 그리고 연행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霜臺別曲》의 지은이인 권근의 문학관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霜臺別曲》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어구 해석 김창규, 『한국 한림시 평역』, (국학자료원, 1996) p.274
임기중 『경기체가 연구』, (태학사, 1997) pp.164-167
및 현대역
제 1장
華山南 漢水北 千年勝地
廣通橋 雲鐘街 건나드러
落落長松 亭亭古栢 秋霜烏府
위 萬古淸風ㅅ景 긔 엇더니잇고
英雄豪傑 一時人才 英雄豪傑 一時人才
위 날조차 몃분니잇고
▶현대역
화산의 남쪽과 한수의 북쪽에 천년을 내려온 명승지지
서울에는, 청계천 위로 놓인 광통교를 건너 지금의 종로인
운종가로 들어가면,
가지가 축축 늘어진 멋진 소나무와 우뚝 솟아있는 늙은
측백나무에 에워싸인 추상같은 위엄이 서린 사헌부.
아! 오랜 세월을 두고 청렴결백한 바람이 감도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이곳에 모여든 영웅호걸들인 관원들은, 한때 뛰어난 재주를
지닌 인물들로,
아! 날까지 보태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사헌부의 늠름한 모습
1)화산남(華山南): 삼각산 남쪽. 서울에 북쪽에 있는 지금의 북한산, 백운대 인수봉 만수대 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삼각산터라 함.
2)천년승지(千年勝地): 천년동안을 내려오면서 경치좋고 이름난 곳.
3)광통교(廣通橋): 조선 초 한양성 종루(현재의 보신각)의 남쪽에 있던 다리. 대광통교, 소광통교의 두 개의 다리가 있었음.
4)운종가(雲鐘街): 조선 초 종루(鐘樓)를 중심으로 할 때의 서쪽의 거리. 당시 음은 “개”
5)건나드러: 건너 들어가
6)정정고백(亭亭古栢): 우뚝 솟아있는 늙은 측백나무
7)추상오부(秋霜烏府): 추상같은 위엄이 서린 司憲府
8)만고청풍(萬古淸風): 오랜 세월을 두고 감도는 맑은 바람. 여기서는 사헌부 관원들의 淸白한 기풍을 가리킴.
9)날조차 몇분니잇고: 날까지 보태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제 2 장
旣鳴 天欲曉 紫陌長堤
大司憲 老執義 臺長御使
駕鶴鸞 前呵後擁 除左右
위 霜臺ㅅ景 긔 엇더니잇고
<한림별곡>과 <관동별곡>이 같은 갈래에 속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식적인 틀이 같으며, 한문투가 주가 되고 간간히 우리말투가 섞여 있고, 작자는 상류층이고, 객관적인 경물이 대상화되어 작품속에서 개별로 나열되고 그것들을 아울러 포괄하여 노래되는 점 등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1세기 이상이나 <한림별곡>이외의 작품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한림별곡>의 탁월성이라든가 지속성으로 인하여 <관동별곡>이전까지 다른 작품을 창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집단적으로 함께 즐기는 <한림별곡>의 특징이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일치하는 것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림별곡>의 연행만으로도 향수자의 취향을 아우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다가 <관동별곡>이 창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림별곡>의 성격과 다른 점을 살펴봄으로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먼저 작자면을 보더라도 <한림별곡>은 한림제유(翰林諸儒)로서 여러 한림들이 작자가 되지만, <관동별곡>은 근재 개인이다. 이는 <한림별곡>이 연회에서 한림들이 돌아가면서 부른 돌림노래로서 시작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는 여러 문인들이 술자리에서 서로 시를 지어 주고 받았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崔滋,「補閑集」상권)
그러면서 화려함이라든가 오히려 질탕(跌宕)할 정도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집단 정서가 그대로 노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씨 무단정치 당시의 신흥사대부들의 동질성에 기인하다. 동질성이란 <한림별곡>이 창작될 때까지의 신흥사대부들은 확고한 정치적경제적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자연적으로 집단적 과시의 힘을 자긍심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관동별곡>이 창작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집단적 과시로 신흥사대부들의 위상이 정립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신흥사대부들의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나온 것이 <관동별곡>이다. 신유학을 신봉하는 신흥사대부들의 기반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리하여 현실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개인의 자긍심을 당당하게 피력할 정치적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자긍심도 현실 부조리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것의 해결책을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생겨났다. 즉, 자연에 관심을 돌려, 그 내밀한 본질을 파악하면 내부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격인’의 과정을 거칠 때 ‘생민지복(生民之福)’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현실의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동별곡>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생겨 난 것이다. 최용수, “안축의 <관동별곡>에 대하여”, 「배달말」23, (배달말학회, 1998) p.45
< 상대별곡 >
조선조 경기체가인《霜臺別曲》은 권근이 지은 것으로 『樂章歌詞』에 전해지고 있다. 《霜臺別曲》은 사헌부 관원으로서 늠름하고 호기에 넘치는 현실적 삶을 숭고한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노래한 작품인 동시에, 권근이 과거 고려의 遺臣임을 자처하면서 충주의 양촌에 은거하다가 태조의 명을 받고 出仕한 자신에 대한 변명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작품이다.
《霜臺別曲》은 景幾體歌의 장르적 전개에 있어 樂章文學的 변용의 단계를 해명하기 위한 결정적 자료로 보기도 한다. 고려조 신흥사대부의 득의에 찬 모습과 발랄하고 희망찬 세계관을 보여주던 《翰林別曲》은 조선조에 이르러 그 유교적 이상에 입각한 新王朝의 정당성과 집권층의 합리화를 드러내기 위한 樂章 문학으로 이어졌다. 《霜臺別曲》은 樂章 구실을 하는 경기체가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霜臺別曲》을 어구해석을 통해 현대어로 풀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霜臺別曲》의 형식 및 주제의식 그리고 연행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霜臺別曲》의 지은이인 권근의 문학관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霜臺別曲》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어구 해석 김창규, 『한국 한림시 평역』, (국학자료원, 1996) p.274
임기중 『경기체가 연구』, (태학사, 1997) pp.164-167
및 현대역
제 1장
華山南 漢水北 千年勝地
廣通橋 雲鐘街 건나드러
落落長松 亭亭古栢 秋霜烏府
위 萬古淸風ㅅ景 긔 엇더니잇고
英雄豪傑 一時人才 英雄豪傑 一時人才
위 날조차 몃분니잇고
▶현대역
화산의 남쪽과 한수의 북쪽에 천년을 내려온 명승지지
서울에는, 청계천 위로 놓인 광통교를 건너 지금의 종로인
운종가로 들어가면,
가지가 축축 늘어진 멋진 소나무와 우뚝 솟아있는 늙은
측백나무에 에워싸인 추상같은 위엄이 서린 사헌부.
아! 오랜 세월을 두고 청렴결백한 바람이 감도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이곳에 모여든 영웅호걸들인 관원들은, 한때 뛰어난 재주를
지닌 인물들로,
아! 날까지 보태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사헌부의 늠름한 모습
1)화산남(華山南): 삼각산 남쪽. 서울에 북쪽에 있는 지금의 북한산, 백운대 인수봉 만수대 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삼각산터라 함.
2)천년승지(千年勝地): 천년동안을 내려오면서 경치좋고 이름난 곳.
3)광통교(廣通橋): 조선 초 한양성 종루(현재의 보신각)의 남쪽에 있던 다리. 대광통교, 소광통교의 두 개의 다리가 있었음.
4)운종가(雲鐘街): 조선 초 종루(鐘樓)를 중심으로 할 때의 서쪽의 거리. 당시 음은 “개”
5)건나드러: 건너 들어가
6)정정고백(亭亭古栢): 우뚝 솟아있는 늙은 측백나무
7)추상오부(秋霜烏府): 추상같은 위엄이 서린 司憲府
8)만고청풍(萬古淸風): 오랜 세월을 두고 감도는 맑은 바람. 여기서는 사헌부 관원들의 淸白한 기풍을 가리킴.
9)날조차 몇분니잇고: 날까지 보태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제 2 장
旣鳴 天欲曉 紫陌長堤
大司憲 老執義 臺長御使
駕鶴鸞 前呵後擁 除左右
위 霜臺ㅅ景 긔 엇더니잇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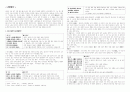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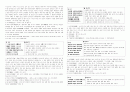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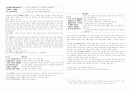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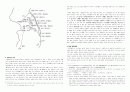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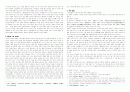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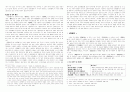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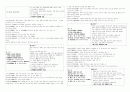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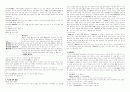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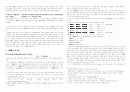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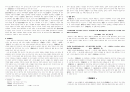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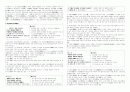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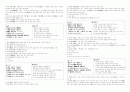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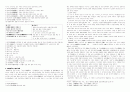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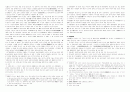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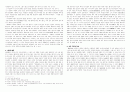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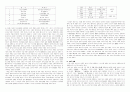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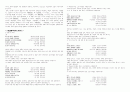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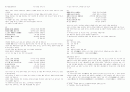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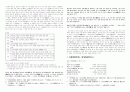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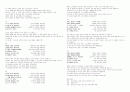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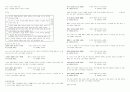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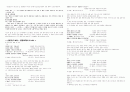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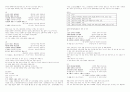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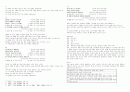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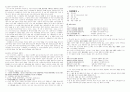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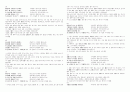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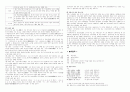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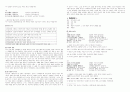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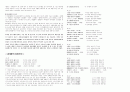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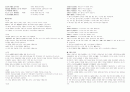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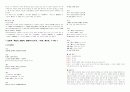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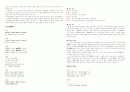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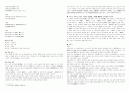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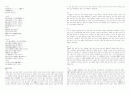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