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지, 자음이 어떤 조음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순서를 보인다. 따라서 자음 명칭의 우리말 구조는 조음 위치+발성 유형+조음 방법의 순서를 따른다. [d]의 이름은 치경 유성 폐쇄음이지만 [t]의 이름은 치경 무성 폐쇄음이다. 모음의 명명법은 조음의 중요한 변수를 따져 보았을 때 조음 시 입술 모양은 어떠한지 부터 살핀다. 이는 입술이 돌출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며 혀와 입천장의 가장 가까운 부분이 혀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혀의 높이가 어떠한가를 차례로 살펴본다. 이에 모음은 입술 모양+혀의 전후+혀의 고저의 순서로 명명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i]는 평순 전설 고모음이며 [u]는 원순 후설 고모음이다.
말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언급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책을 함께 읽었다고 했을 때, 이를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할지 다른 소리를 냈다고 할지에 대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한 것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소리로 인식되었기에 같은 소리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소리를 냈기 때문에 다르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말소리에 대해 물리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져야함을 볼 수 있다. 학문의 발전으로 소리가 명명되어지지만 결국 소리의 큰 줄기는 물리적인 것을 벗어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의 순환으로 생기는 소리의 개념으로 소리 자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필요한 것이다.
IV. 참고문헌
신지영, 차재은 (2013). 우리말 소리의 체계. 서울:한국문화사
이기문 (2006). 국어음운론. 서울:학연사
말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언급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책을 함께 읽었다고 했을 때, 이를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할지 다른 소리를 냈다고 할지에 대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한 것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소리로 인식되었기에 같은 소리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소리를 냈기 때문에 다르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말소리에 대해 물리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져야함을 볼 수 있다. 학문의 발전으로 소리가 명명되어지지만 결국 소리의 큰 줄기는 물리적인 것을 벗어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의 순환으로 생기는 소리의 개념으로 소리 자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필요한 것이다.
IV. 참고문헌
신지영, 차재은 (2013). 우리말 소리의 체계. 서울:한국문화사
이기문 (2006). 국어음운론. 서울:학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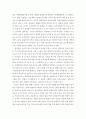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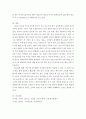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