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낸 유기를 돌아가는 물레에 갈고 행주 같은 것으로 닦고 해서 서서히 노랗고 빛나는 유기를 만들어냈다. 계속 수작업으로 그 그릇을 갈고 닦는데 왜 비싼 그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장인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유기에 검정 검댕이가 붙어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장인 선생님은 쇠가 아닌 유기로 암행어사들이 가지고 다닌 마패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마패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대금을 만드는 공방에서도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인의 옆에는 이미 준비된 대나무들이 있었다. 그 대나무들은 뜨거운 불에서 대나무를 몇 번 훈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 대나무의 잔뿌리를 다 정리하고서 가져온 것인데, 휘어진 곳이 약간씩 있었다. 휘어진 부분은 장인이 약을 묻히거나 불로 살살 다듬으면서 힘을 조절하여 펴주면 펴지는데, 참 신기하다. 분명히 부러질 것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장인 선생님도 이 작업이 힘드신지 천천히 펴시는 모습이었다. 이게 다 끝나면 장인이 안을 파신다. 그리고서 음을 내기 위한 구멍을 뚫는데, 장인이라서 그러신지 대충 위치를 정해서 칼로 첫 구멍을 낸다. 그리고서 조금씩 불어가며 다른 음을 내는 위치를 잡아낸다. 맨 끝으로는 마른 곳에 실로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눈앞에서 보면서 저게 소리를 낼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청아한 대금소리가 나서 놀랐다. 선조들은 대나무를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어찌 알았는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옹이가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다.
결론
(4) 현대문화와 비교·분석, 또는 문제의식 제기\"
민속촌에서 조선시대 생쵠문화를 전반적으로 보았다. 보면서 “선조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따분한 삶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마음도 많이 들었다. 공자의 유교가 국교가 되어 문화마저 유교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 많은 것들이 그 것으로 인해 생활문화도 더 발전할 수 있던 것들이 덜 발전한 것이 보였다. 성리학을 종교시 했던 양반들은 집이 엄청나게 컸지만 그 중 절반의 방이 성리학에 의한 방들이 많았다. 만약 실학을 중시하는 나라였다면 그 모습이 상당히 달랐을 것이고 아마 단조롭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다른 백성들을 굽어 살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 지금에서야 늦게 작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두화도 그랬다. 인두화는 민화와 탱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유교를 중시한 탓에 불교의 탱화를 그리는 인두화를 좋게 볼 리 없었고 민화는 천한 민중의 것으로 생각했던 사대부들이 많아 높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양식은 아니었다. 유기는 너무 비싸서 양반들의 것으로 향유 되었는데, 이것을 민중이 함께 쓰고 만들었다면 더 대중화 되었다면 단순한 모양의 유기그릇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유기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지 않았을까 싶었다. 하나하나 선조들의 개개인이 만들어 낸 하나하나의 문화가 참 눈이 부셨다. 하지만 그 문화가 유교 하나로 인해 깊게 발전하거나 지금까지 이어 내려져 함께 향유하는 대중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어 안타까웠다.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민속촌, 조원관광진흥 한국민속촌,[1997]
대금 제작법에 관한 연구 : 정악대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w to produce Daegeum : focused on Jeongak Daegeum. 서형원,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2003] [국내석사]
고은쌤의 우드버닝 : 국내 최초의 버닝 가이드북. 김고은, 좋은땅,[2014]
조선시대 ㅁ자형 전통가옥의 사랑채와 안채간 연계공간에 관한 연구. 천열홍,신웅주,(농촌건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ol.17 No.3,[2015])[KCI등재]
대금을 만드는 공방에서도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인의 옆에는 이미 준비된 대나무들이 있었다. 그 대나무들은 뜨거운 불에서 대나무를 몇 번 훈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 대나무의 잔뿌리를 다 정리하고서 가져온 것인데, 휘어진 곳이 약간씩 있었다. 휘어진 부분은 장인이 약을 묻히거나 불로 살살 다듬으면서 힘을 조절하여 펴주면 펴지는데, 참 신기하다. 분명히 부러질 것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장인 선생님도 이 작업이 힘드신지 천천히 펴시는 모습이었다. 이게 다 끝나면 장인이 안을 파신다. 그리고서 음을 내기 위한 구멍을 뚫는데, 장인이라서 그러신지 대충 위치를 정해서 칼로 첫 구멍을 낸다. 그리고서 조금씩 불어가며 다른 음을 내는 위치를 잡아낸다. 맨 끝으로는 마른 곳에 실로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눈앞에서 보면서 저게 소리를 낼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청아한 대금소리가 나서 놀랐다. 선조들은 대나무를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어찌 알았는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옹이가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다.
결론
(4) 현대문화와 비교·분석, 또는 문제의식 제기\"
민속촌에서 조선시대 생쵠문화를 전반적으로 보았다. 보면서 “선조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따분한 삶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마음도 많이 들었다. 공자의 유교가 국교가 되어 문화마저 유교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 많은 것들이 그 것으로 인해 생활문화도 더 발전할 수 있던 것들이 덜 발전한 것이 보였다. 성리학을 종교시 했던 양반들은 집이 엄청나게 컸지만 그 중 절반의 방이 성리학에 의한 방들이 많았다. 만약 실학을 중시하는 나라였다면 그 모습이 상당히 달랐을 것이고 아마 단조롭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다른 백성들을 굽어 살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 지금에서야 늦게 작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두화도 그랬다. 인두화는 민화와 탱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유교를 중시한 탓에 불교의 탱화를 그리는 인두화를 좋게 볼 리 없었고 민화는 천한 민중의 것으로 생각했던 사대부들이 많아 높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양식은 아니었다. 유기는 너무 비싸서 양반들의 것으로 향유 되었는데, 이것을 민중이 함께 쓰고 만들었다면 더 대중화 되었다면 단순한 모양의 유기그릇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유기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지 않았을까 싶었다. 하나하나 선조들의 개개인이 만들어 낸 하나하나의 문화가 참 눈이 부셨다. 하지만 그 문화가 유교 하나로 인해 깊게 발전하거나 지금까지 이어 내려져 함께 향유하는 대중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어 안타까웠다.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민속촌, 조원관광진흥 한국민속촌,[1997]
대금 제작법에 관한 연구 : 정악대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w to produce Daegeum : focused on Jeongak Daegeum. 서형원,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2003] [국내석사]
고은쌤의 우드버닝 : 국내 최초의 버닝 가이드북. 김고은, 좋은땅,[2014]
조선시대 ㅁ자형 전통가옥의 사랑채와 안채간 연계공간에 관한 연구. 천열홍,신웅주,(농촌건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ol.17 No.3,[2015])[KCI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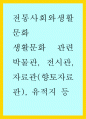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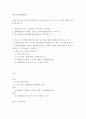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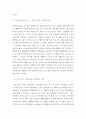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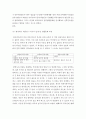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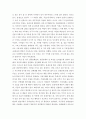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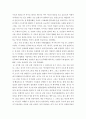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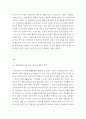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