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국에서 사용하는 음역, 음의겸역, 반음반의역, 반음반첨가의 정의와 예시
(2) 중국어가 외래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자료
2. 본론
(1) 중국에서 사용하는 음역, 음의겸역, 반음반의역, 반음반첨가의 정의와 예시
(2) 중국어가 외래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가 되었다. “是笑skr人了”와 같이 중국어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한다. 주고 재치 있게 사람을 놀리거나 감탄하는 의미로 쓰인다.
3.결론
중국어는 그 나라 안에서도 무척 많은 종류의 방언들이 존재하고, 홍콩과 대만도 각기 번체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통화와 광동어로 나누지만, 소수민족인 조선족이나 위구르족과 같이 외국어와 더 가까운 방언들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화는 지역에 기반한 언어라기 보다는 편리성을 위해 규제한 언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지방에 따라 보통화의 억양이나 발음 등의 변화도 심하다. 하물며 외래어를 들여와서 규칙에 맞게 변용하여 사용한다고 하여도 각 지방별로 그 쓰임이 가지 각색일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보통화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한자의 병음이 한국과 비슷하여서 배우기 쉬웠다는 점인데, 알고 보니 광동어의 한자 병음이 더욱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두번째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흡수가 몹시 빠르다는 점이었다. 표의문자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의 사업가들이 영어의 사용을 더욱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국어, 특히 광동어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화교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언어이지만 이제는 영어마저도 중국어의 한 흐름에 섞여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표음 문자의 장점을 잘 이용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지만 더불어 외래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순 우리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다. 표음 문자이다 보니 들리는 외국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분방한 움직임을 띄지만, 엄연히 표기법이 있으므로 그것에 맞추어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있는 단어들을 두고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자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금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양문화권에서 들여오는 외래어가 그 언어와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 만큼, 우리도 중국인들이 반음반의역이나 반음반첨가등의 방식을 통해 한자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생각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참고자료
김태은. (2014). 중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대응. 인문과학연구논총, (39), 39-73.
3.결론
중국어는 그 나라 안에서도 무척 많은 종류의 방언들이 존재하고, 홍콩과 대만도 각기 번체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통화와 광동어로 나누지만, 소수민족인 조선족이나 위구르족과 같이 외국어와 더 가까운 방언들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화는 지역에 기반한 언어라기 보다는 편리성을 위해 규제한 언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지방에 따라 보통화의 억양이나 발음 등의 변화도 심하다. 하물며 외래어를 들여와서 규칙에 맞게 변용하여 사용한다고 하여도 각 지방별로 그 쓰임이 가지 각색일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보통화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한자의 병음이 한국과 비슷하여서 배우기 쉬웠다는 점인데, 알고 보니 광동어의 한자 병음이 더욱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두번째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흡수가 몹시 빠르다는 점이었다. 표의문자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의 사업가들이 영어의 사용을 더욱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국어, 특히 광동어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화교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언어이지만 이제는 영어마저도 중국어의 한 흐름에 섞여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표음 문자의 장점을 잘 이용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지만 더불어 외래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순 우리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다. 표음 문자이다 보니 들리는 외국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분방한 움직임을 띄지만, 엄연히 표기법이 있으므로 그것에 맞추어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있는 단어들을 두고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자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금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양문화권에서 들여오는 외래어가 그 언어와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 만큼, 우리도 중국인들이 반음반의역이나 반음반첨가등의 방식을 통해 한자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생각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참고자료
김태은. (2014). 중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대응. 인문과학연구논총, (39), 3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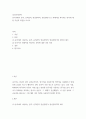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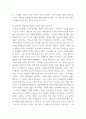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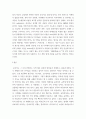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