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2.1. 형태론
2.1.1 첫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1.2 두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1.3 세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1.4 네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1.5 네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 통사론
2.2.1 첫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2 두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3 세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4 네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5 다섯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2.1. 형태론
2.1.1 첫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1.2 두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1.3 세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1.4 네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1.5 네 번째 형태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 통사론
2.2.1 첫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2 두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3 세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4 네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2.2.5 다섯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질문 목적
- 오개념 진단질문
- 오개념 난개념
- 개념 확인
- 활용자료
- 기타
- 확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제를 표시한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으로 사용하는 순간동사와 만났을 때는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정확한 시점이나 사건으로 나타날 수 없는 동사의 경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 활용자료 : “엄마가 어제 여행 갔어.”라는 문장은 과거를 나타내지만, “내년엔 엄마도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선미 결혼했어.”는 선미가 과거에 결혼했고 현재 기혼상태임을 알려주는 문장이며, “오늘 목도리 했어?”는 현재 목도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문장이다.
- 기타 : 선어말어미‘-었-’의 과거시제, 현재 상태, 동작 완료의 상태 등 다양한 활용의 예시를 알아본다.
‘여름이 왔다.’에서 여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과거시제가 아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었-’이 사용되었다.
- 확장 : ‘-었-’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를 알아본다.
2.2.3 세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선어말어미 ‘-겠-’을 알아본다.
- 질문 목적 : 선어말어미 ‘-겠-’의 다양한 활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오개념 진단질문 : (3) 다음 중 다르게 쓰인 선어말어미 ‘-겠’을 고르시오.
내가 떠나면 엄마가 외로워하겠지./ 지금쯤 둘이 화해했겠다./ 엄마 집에 왔겠다./ 수민이 어렸을 때도 똑똑했겠다.
- 오개념 난개념 : ‘-겠-’은 미래 시제뿐 아니라 “지금 시작했겠다.”처럼 현재 시제에도 사용되고, “엄마가 어제 신청했겠지?”처럼 과거 시제로도 사용된다. 한국어에는 따로 미래 시제가 없다.
- 개념 확인 : 선어말어미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고 여겨지기도 했으나, 발화하는 현재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사용된다. 또한 현재와 과거시제에도 사용된다. 즉, 선어말어미 ‘-겠-’은 의도나 추측을 타나낸다고 할 수 있다.
- 활용자료 : “내일 택배가 오겠네.”라는 문장은 미래를 말하지만, “지금쯤 택배가 도착했겠다.”라는 문장은 추측이다.
- 기타 : 선어말어미 ‘-겠-’의 상황별 예시를 살펴본다.
문제에서 제시한 예문은 모두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서 ‘-겠-’이 사용된 예는 ‘내가 떠나면 엄마가 외로워하겠지’임을 알 수 있다.
- 확장 : 선어말어미 ‘-더-’를 알아본다.
2.2.4 네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한국어의 문장유형 6가지를 알아본다.
- 질문 목적 : 문장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오개념 진단질문 : (4) “수영을 하다.”와 “개는 포유류이다.”가 같은 문장 유형이라는 거죠?(의도적으로 틀린 정보 제공)
- 오개념 난개념 : 주어와 자동사, 주어와 형용사로만 구성이 되는 문장과 주어와 계사인 ‘이다’로 구성되는 문장은 그 모양이 주어와 서술어로만 구성되어 똑같아 보이지만, 각각 다른 문장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늘이 파랗다.”도 주어와 형용사로 구성되어 주어와 자동사로 구성된 “수영을 하다.”와 다른 문장 유형이다.
- 개념 확인 :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어에서는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기본 구조에 수식어가 결합되어 분장이 확대된다.
- 활용자료 : “꽃이 피다.”, “하늘이 파랗다.”처럼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자동사와 형용사로 구성되는 것과, “영은이가 선물을 사 왔다.”처럼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타동사문, “현아는 교사가 되었다.”처럼 보어가 필요한 서술어가 있는 것, “지은이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다.”처럼 여격이 필요한 수여동사문, 그리고 “무당벌레는 곤충이다.”처럼 명사와 계사인 ‘이다’로 구성되는 문장 유형을 알아볼 수 있다.
- 기타 : 문장유형 6가지와 그 예시를 각 알아본다.
계사인 ‘이다’와 결합하는 문장유형은 주어와 자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유형과 구별된다.
- 확장 : 접속, 내포를 통한 문장의 확대를 알아본다.
2.2.5 다섯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부정문을 알아본다.
- 질문 목적 : 부정문을 만드는 ‘아니’와 그 모습이 같더라도 부정문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구분할 수 있는지 본다.
- 오개념 진단질문 : (5) 다음 중 ‘아니’의 의미가 다른 문장을 고르시오.
필통을 가져오지 않았다./ 숙제를 하지 않았어?/ 사슴을 보러 가지 않았다./ 수영을 하지 않았다.
- 오개념 난개념 : 부정문을 만드는 ‘아니’는 “은주 도착하지 않았어?”처럼 확인문과 회의문에도 사용된다.
- 개념 확인 : ‘아니’ 부정은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을 의미하고, ‘못’부정은 타의 부정,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이익섭·이상억,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2004년, 223p
부정문은 서술어에 ‘아니’ 또는 ‘못’을 더하거나, 조동사 ‘말-’을 본동사에 연결해서 만드는데, ‘말-’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사용된다.
- 활용자료 :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미는 책을 안 읽어.”와 “은미는 책을 못 읽어.”는 그 의미가 don\'t와 can\'t로 다르다.
“지금 책을 읽지 말거라.”와 같이 ‘말-’은 명령과 청유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 ‘아니’는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이기 때문에 ‘알다’와 같은 화자의 인지를 표현하는 동사에는 사용할 수 없고,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참다’와 같은 동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부가의문문 “숙제를 하지 않았어?”의 경우, 화자가 청자가 숙제를 했다는 가정 하에 확인을 하기 위해 묻는 것으로, 단순 부정의 ‘아니’와 다른 활용이다.
- 확장 : ‘말-’의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 경우를 알아본다.
‘아니’가 부정이 아닌 부가의문문과 회의문을 알아본다.
3. 결론
형태론과 통사론을 공부하면 훨씬 한국어의 활용이 풍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좀 더 말의 뉘앙스라든지 의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섬세하게 반영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조금 어렵고, 구별하기 힘들더라도 연습을 통해 숙달되는 것은 주도적인 언어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이익섭·이상억,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2004년
- 활용자료 : “엄마가 어제 여행 갔어.”라는 문장은 과거를 나타내지만, “내년엔 엄마도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선미 결혼했어.”는 선미가 과거에 결혼했고 현재 기혼상태임을 알려주는 문장이며, “오늘 목도리 했어?”는 현재 목도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문장이다.
- 기타 : 선어말어미‘-었-’의 과거시제, 현재 상태, 동작 완료의 상태 등 다양한 활용의 예시를 알아본다.
‘여름이 왔다.’에서 여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과거시제가 아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었-’이 사용되었다.
- 확장 : ‘-었-’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를 알아본다.
2.2.3 세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선어말어미 ‘-겠-’을 알아본다.
- 질문 목적 : 선어말어미 ‘-겠-’의 다양한 활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오개념 진단질문 : (3) 다음 중 다르게 쓰인 선어말어미 ‘-겠’을 고르시오.
내가 떠나면 엄마가 외로워하겠지./ 지금쯤 둘이 화해했겠다./ 엄마 집에 왔겠다./ 수민이 어렸을 때도 똑똑했겠다.
- 오개념 난개념 : ‘-겠-’은 미래 시제뿐 아니라 “지금 시작했겠다.”처럼 현재 시제에도 사용되고, “엄마가 어제 신청했겠지?”처럼 과거 시제로도 사용된다. 한국어에는 따로 미래 시제가 없다.
- 개념 확인 : 선어말어미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고 여겨지기도 했으나, 발화하는 현재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사용된다. 또한 현재와 과거시제에도 사용된다. 즉, 선어말어미 ‘-겠-’은 의도나 추측을 타나낸다고 할 수 있다.
- 활용자료 : “내일 택배가 오겠네.”라는 문장은 미래를 말하지만, “지금쯤 택배가 도착했겠다.”라는 문장은 추측이다.
- 기타 : 선어말어미 ‘-겠-’의 상황별 예시를 살펴본다.
문제에서 제시한 예문은 모두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서 ‘-겠-’이 사용된 예는 ‘내가 떠나면 엄마가 외로워하겠지’임을 알 수 있다.
- 확장 : 선어말어미 ‘-더-’를 알아본다.
2.2.4 네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한국어의 문장유형 6가지를 알아본다.
- 질문 목적 : 문장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오개념 진단질문 : (4) “수영을 하다.”와 “개는 포유류이다.”가 같은 문장 유형이라는 거죠?(의도적으로 틀린 정보 제공)
- 오개념 난개념 : 주어와 자동사, 주어와 형용사로만 구성이 되는 문장과 주어와 계사인 ‘이다’로 구성되는 문장은 그 모양이 주어와 서술어로만 구성되어 똑같아 보이지만, 각각 다른 문장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늘이 파랗다.”도 주어와 형용사로 구성되어 주어와 자동사로 구성된 “수영을 하다.”와 다른 문장 유형이다.
- 개념 확인 :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어에서는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기본 구조에 수식어가 결합되어 분장이 확대된다.
- 활용자료 : “꽃이 피다.”, “하늘이 파랗다.”처럼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자동사와 형용사로 구성되는 것과, “영은이가 선물을 사 왔다.”처럼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타동사문, “현아는 교사가 되었다.”처럼 보어가 필요한 서술어가 있는 것, “지은이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다.”처럼 여격이 필요한 수여동사문, 그리고 “무당벌레는 곤충이다.”처럼 명사와 계사인 ‘이다’로 구성되는 문장 유형을 알아볼 수 있다.
- 기타 : 문장유형 6가지와 그 예시를 각 알아본다.
계사인 ‘이다’와 결합하는 문장유형은 주어와 자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유형과 구별된다.
- 확장 : 접속, 내포를 통한 문장의 확대를 알아본다.
2.2.5 다섯 번째 통사론
- 학습내용 : 부정문을 알아본다.
- 질문 목적 : 부정문을 만드는 ‘아니’와 그 모습이 같더라도 부정문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구분할 수 있는지 본다.
- 오개념 진단질문 : (5) 다음 중 ‘아니’의 의미가 다른 문장을 고르시오.
필통을 가져오지 않았다./ 숙제를 하지 않았어?/ 사슴을 보러 가지 않았다./ 수영을 하지 않았다.
- 오개념 난개념 : 부정문을 만드는 ‘아니’는 “은주 도착하지 않았어?”처럼 확인문과 회의문에도 사용된다.
- 개념 확인 : ‘아니’ 부정은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을 의미하고, ‘못’부정은 타의 부정,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이익섭·이상억,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2004년, 223p
부정문은 서술어에 ‘아니’ 또는 ‘못’을 더하거나, 조동사 ‘말-’을 본동사에 연결해서 만드는데, ‘말-’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사용된다.
- 활용자료 :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미는 책을 안 읽어.”와 “은미는 책을 못 읽어.”는 그 의미가 don\'t와 can\'t로 다르다.
“지금 책을 읽지 말거라.”와 같이 ‘말-’은 명령과 청유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 ‘아니’는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이기 때문에 ‘알다’와 같은 화자의 인지를 표현하는 동사에는 사용할 수 없고,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참다’와 같은 동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부가의문문 “숙제를 하지 않았어?”의 경우, 화자가 청자가 숙제를 했다는 가정 하에 확인을 하기 위해 묻는 것으로, 단순 부정의 ‘아니’와 다른 활용이다.
- 확장 : ‘말-’의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 경우를 알아본다.
‘아니’가 부정이 아닌 부가의문문과 회의문을 알아본다.
3. 결론
형태론과 통사론을 공부하면 훨씬 한국어의 활용이 풍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좀 더 말의 뉘앙스라든지 의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섬세하게 반영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조금 어렵고, 구별하기 힘들더라도 연습을 통해 숙달되는 것은 주도적인 언어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이익섭·이상억,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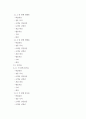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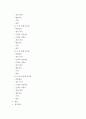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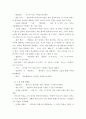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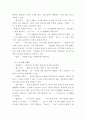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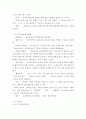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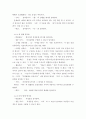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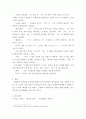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