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자 원문 이해
2. ‘명상의 본질’
3. ‘평상심이 도’
2. ‘명상의 본질’
3. ‘평상심이 도’
본문내용
진리를 비롯한 존재계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평상심’을 가지게 되고, 마조는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세상의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우리는 늘 언제나 무언가를 꿈꾸거나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친구와 약속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스스로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상, 우리의 마음이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절대적 진리와 평상심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마음을 들게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실재’하는 것을 한 번도 손에 넣은 적이 없고, 손에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이런 덧씌워진 이미지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집착도 바람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이자 그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하는 절대적 진리라고 장자는 말하고 있다.
덧씌워진 이미지와 ‘실재’에 대한 이야기는 언뜻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와 현상계와도 닮아있다. 플라톤 역시 저 위에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하는 ‘진짜 진리’(=이데아)가 존재하고, 그것을 모방하려고 노력한 현상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미지, 그것이 비록 덧씌워진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해낸 것이 언젠가는 덧없이 스러질 것이라고 보는 장자의 시각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이미지를 바랄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성취할 필요도 없는 마음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평상심일 테고 곧 ‘도’일 테지만, 인간으로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어쩌면 평상심과 도를 얻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추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세상의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우리는 늘 언제나 무언가를 꿈꾸거나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친구와 약속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스스로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상, 우리의 마음이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절대적 진리와 평상심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마음을 들게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실재’하는 것을 한 번도 손에 넣은 적이 없고, 손에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이런 덧씌워진 이미지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집착도 바람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이자 그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하는 절대적 진리라고 장자는 말하고 있다.
덧씌워진 이미지와 ‘실재’에 대한 이야기는 언뜻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와 현상계와도 닮아있다. 플라톤 역시 저 위에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하는 ‘진짜 진리’(=이데아)가 존재하고, 그것을 모방하려고 노력한 현상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미지, 그것이 비록 덧씌워진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해낸 것이 언젠가는 덧없이 스러질 것이라고 보는 장자의 시각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이미지를 바랄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성취할 필요도 없는 마음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평상심일 테고 곧 ‘도’일 테지만, 인간으로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어쩌면 평상심과 도를 얻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추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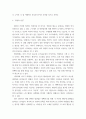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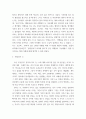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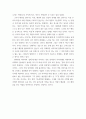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