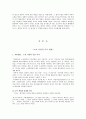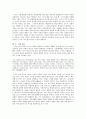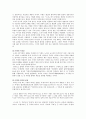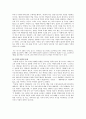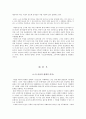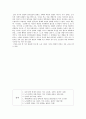목차
Ⅰ. 서 론
1. 노자는 누구인가?
2. 노자 사상의 발생 배경
Ⅱ. 본 론
<노자 사상의 주요 내용>
1. 자연自然 : 노자 사상의 중심 가치
(1) 군주-백성의 관계와 자연
(2) 도 ․ 덕과 자연
(3) 성인과 만물의 자연
2. 무위無爲 : 노자사상의 원칙적 방법
(1) 무위의 주체
(2) 무위의 목적성
(3) 무위의 외적인 표현
(4) 무위의 내적인 표현
3. 도와 덕 : 자연과 무위에 관한 초월적 논증
Ⅲ. 결 론
<노자 사상의 현대적 의의>
출처
1. 노자는 누구인가?
2. 노자 사상의 발생 배경
Ⅱ. 본 론
<노자 사상의 주요 내용>
1. 자연自然 : 노자 사상의 중심 가치
(1) 군주-백성의 관계와 자연
(2) 도 ․ 덕과 자연
(3) 성인과 만물의 자연
2. 무위無爲 : 노자사상의 원칙적 방법
(1) 무위의 주체
(2) 무위의 목적성
(3) 무위의 외적인 표현
(4) 무위의 내적인 표현
3. 도와 덕 : 자연과 무위에 관한 초월적 논증
Ⅲ. 결 론
<노자 사상의 현대적 의의>
출처
본문내용
인에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소외의 문제이다. 소외의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심리학적인 측면, 종교 철학적 측면 등 다각도로 고찰해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소외의 원인을 자세히 규명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인이 고도의 산업사회 속에서 소외를 실감하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노자의 철학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노자의 자연은 궁극적 존재로서의 뜻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것도, 만물에 대해 지배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경』 3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도大道는 넓고 커서 어느 쪽이나 모두 가可하다. 만물이 이것에 의지함으로써 생生하지만 이를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고도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만물을 애양愛養하되 주인이 되지 않는다. 항상 욕심이 없으므로 작다고 이름할 수 있으나, 만물이 돌아가되 그 주인을 알 수 없으므로 크다고 이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마침내 큰 것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큰 것을 이룩할 수 있다.
대도는 만물을 능히 산출하고 양육하지만 만물이 이를 깨닫지 못하며 대도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대도는 크다든가 작다는 말로 헤아려 볼 수 없다. 성자는 이 대도를 깨달은 사람이므로 그 마음이 대도에 계합하여 무슨 큰일을 따로 하지 않지만, 그 공능이 대도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큰일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경』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장 으뜸가는 것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은 친하게 여겨 칭찬하고,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하며, 그 다음은 그를 업신여긴다. 신이 부족하니 불신이 있게 된다. 주저하며 말을 아끼니,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가장 으뜸(上)이라는 것은 물론 도이다. 이 도는 모든 것을 산출하면서도 군림하거나 지배하지 않으므로, 백성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단계는 덕으로써 다스리는 것인데, 도에 어긋나지 않게 덕으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아서 그를 존중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힘이나 위엄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미 덕을 잃은 다음이라면 이제는 힘이나 위엄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위엄조차도 잃고 나면, 그때에는 백성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스림이 이렇게 점차 낮은 차원으로 하락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노자는 \'믿음의 부족\'으로 보았다. 자연의 대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연의 대도를 통찰하여 믿고 그것에 맡겨서 행하면 백성은 절로 평안할 수 있다. 이때의 평안은 치자와 피치자 사이에 소외를 의식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치자나 피치자가 함께 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이 소외됨이 없이 도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대도의 자기법칙성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도덕경』 23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말없음이 자연이라, 모진 바람도 아침나절을 다 지나지 못하고 억센 비도 종일토록 내리지는 못한다. 누가 이것을 하는가? 천지이다. 천지도 오히려 오래도록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모질고 험난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연의 대도를 믿는 사람은 주변 환경의 악조건에 마음 쓰지 않고 자연의 자기순환의 법칙을 믿어서 안심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도를 믿지 못하면 상대적인 지식이나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자기의 처지를 일시적으로 유리하게 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도를 믿어 이에 합치된 생활을 하느니만 못하다. 『도덕경』 40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반反은 도의 움직임이요 약弱은 도의 작용이다. 천하만물은 유에서 생하고, 유는 무에서 생한다.
그런데 노자의 도즉자연道卽自然은 죽어 있는 공허한 무한이 아니요, 가장 포괄적인 살아 있는 것이다. 천지인물이 모두 이 우주적 생명의 속성들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만물의 본성은 우주적 생명인 도와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체의 활동은 도의 순수한 자기활동일 뿐이며, 여기에는 더 이상 밖이 없고 안이 없다.
결국 우주적 생명과 천지인물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우주 간에는 오직 도의 자율적 활동이 있을 뿐이므로, 이것을 믿고 이를 깨달으면 소외는 의식되지 않는다. 설혹 인간이 우주적 법칙성을 깨닫지 못하여 제멋대로의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내 이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자율적 법칙성의 통제와 조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 72장에서는 \"민民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위엄이 이른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의 큰 위엄이라는 것은, 인간의 차별심이나 대립적 감정에서 야기된 인위적인 권위와는 다르다. 즉 가장 포괄적이요 근원적인 생명이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큼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이 우주적 생명의 이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욕심을 내어 함부로 행위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반드시 스스로 제약을 받거나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천지만물과의 대립을 지양하여 그 일체감을 믿고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소외를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참된 존엄성도 실감할 수 있다. 이는 자연적인 것과 인간 생명 간의 통일적 이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오늘날의 자연 과학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점들에서 볼 때, 노자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처
1. 동양 철학 에세이 (2006, 저자: 김교빈, 김현구, 출판사: 동녘)
2. 노자 철학의 이해 (2006, 저자: 김항배, 출판사: 예문서원)
3.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
4.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제27집 2002제1권 (저자: 조수동)
5. 노자철학과 도교 (1995, 저자: 許抗生, 출판사: 예문서원)
6. 노자철학 (2000, 저자: 劉笑敢, 출판사: 청계)
『도덕경』 3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도大道는 넓고 커서 어느 쪽이나 모두 가可하다. 만물이 이것에 의지함으로써 생生하지만 이를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고도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만물을 애양愛養하되 주인이 되지 않는다. 항상 욕심이 없으므로 작다고 이름할 수 있으나, 만물이 돌아가되 그 주인을 알 수 없으므로 크다고 이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마침내 큰 것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큰 것을 이룩할 수 있다.
대도는 만물을 능히 산출하고 양육하지만 만물이 이를 깨닫지 못하며 대도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대도는 크다든가 작다는 말로 헤아려 볼 수 없다. 성자는 이 대도를 깨달은 사람이므로 그 마음이 대도에 계합하여 무슨 큰일을 따로 하지 않지만, 그 공능이 대도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큰일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경』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장 으뜸가는 것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은 친하게 여겨 칭찬하고,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하며, 그 다음은 그를 업신여긴다. 신이 부족하니 불신이 있게 된다. 주저하며 말을 아끼니,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가장 으뜸(上)이라는 것은 물론 도이다. 이 도는 모든 것을 산출하면서도 군림하거나 지배하지 않으므로, 백성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단계는 덕으로써 다스리는 것인데, 도에 어긋나지 않게 덕으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아서 그를 존중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힘이나 위엄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미 덕을 잃은 다음이라면 이제는 힘이나 위엄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위엄조차도 잃고 나면, 그때에는 백성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스림이 이렇게 점차 낮은 차원으로 하락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노자는 \'믿음의 부족\'으로 보았다. 자연의 대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연의 대도를 통찰하여 믿고 그것에 맡겨서 행하면 백성은 절로 평안할 수 있다. 이때의 평안은 치자와 피치자 사이에 소외를 의식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치자나 피치자가 함께 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이 소외됨이 없이 도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대도의 자기법칙성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도덕경』 23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말없음이 자연이라, 모진 바람도 아침나절을 다 지나지 못하고 억센 비도 종일토록 내리지는 못한다. 누가 이것을 하는가? 천지이다. 천지도 오히려 오래도록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모질고 험난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연의 대도를 믿는 사람은 주변 환경의 악조건에 마음 쓰지 않고 자연의 자기순환의 법칙을 믿어서 안심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도를 믿지 못하면 상대적인 지식이나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자기의 처지를 일시적으로 유리하게 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도를 믿어 이에 합치된 생활을 하느니만 못하다. 『도덕경』 40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반反은 도의 움직임이요 약弱은 도의 작용이다. 천하만물은 유에서 생하고, 유는 무에서 생한다.
그런데 노자의 도즉자연道卽自然은 죽어 있는 공허한 무한이 아니요, 가장 포괄적인 살아 있는 것이다. 천지인물이 모두 이 우주적 생명의 속성들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만물의 본성은 우주적 생명인 도와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체의 활동은 도의 순수한 자기활동일 뿐이며, 여기에는 더 이상 밖이 없고 안이 없다.
결국 우주적 생명과 천지인물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우주 간에는 오직 도의 자율적 활동이 있을 뿐이므로, 이것을 믿고 이를 깨달으면 소외는 의식되지 않는다. 설혹 인간이 우주적 법칙성을 깨닫지 못하여 제멋대로의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내 이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자율적 법칙성의 통제와 조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 72장에서는 \"민民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위엄이 이른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의 큰 위엄이라는 것은, 인간의 차별심이나 대립적 감정에서 야기된 인위적인 권위와는 다르다. 즉 가장 포괄적이요 근원적인 생명이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큼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이 우주적 생명의 이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욕심을 내어 함부로 행위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반드시 스스로 제약을 받거나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천지만물과의 대립을 지양하여 그 일체감을 믿고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소외를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참된 존엄성도 실감할 수 있다. 이는 자연적인 것과 인간 생명 간의 통일적 이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오늘날의 자연 과학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점들에서 볼 때, 노자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처
1. 동양 철학 에세이 (2006, 저자: 김교빈, 김현구, 출판사: 동녘)
2. 노자 철학의 이해 (2006, 저자: 김항배, 출판사: 예문서원)
3.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
4.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제27집 2002제1권 (저자: 조수동)
5. 노자철학과 도교 (1995, 저자: 許抗生, 출판사: 예문서원)
6. 노자철학 (2000, 저자: 劉笑敢, 출판사: 청계)
추천자료
 영화`폴락(pollock)`을 통한 고찰 - 자연 :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
영화`폴락(pollock)`을 통한 고찰 - 자연 :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 도가의 무위사상에 대하여
도가의 무위사상에 대하여 공자의 생애와 사랑론
공자의 생애와 사랑론 <솔라리스>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
<솔라리스>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 진한사 1장~8장 요약정리
진한사 1장~8장 요약정리 [노자][생애][문명관][자연관][언어관][도가사상][도덕경]노자의 생애, 노자의 문명관, 노자...
[노자][생애][문명관][자연관][언어관][도가사상][도덕경]노자의 생애, 노자의 문명관, 노자... [장자][장자 사상][장자 생애][장자 자연관][장자 세계관][장자 心(심)이론][격의불교]장자의...
[장자][장자 사상][장자 생애][장자 자연관][장자 세계관][장자 心(심)이론][격의불교]장자의... 개발과 환경,환경을 바라보는 대립되는 관점
개발과 환경,환경을 바라보는 대립되는 관점  [자연관][서양 자연관][동양 자연관][공자 자연관][장자 자연관][노자 자연관][홍범][이규보]...
[자연관][서양 자연관][동양 자연관][공자 자연관][장자 자연관][노자 자연관][홍범][이규보]... [자연관][동양][서양][정지용][베이컨][워즈워스][리터와 기요][장자][자연주의]동양의 자연...
[자연관][동양][서양][정지용][베이컨][워즈워스][리터와 기요][장자][자연주의]동양의 자연... 6. 노자의 도와 자연
6. 노자의 도와 자연 율곡 이이
율곡 이이 [이웃종교와 선교] 유교(儒敎Confucianism)
[이웃종교와 선교] 유교(儒敎Confuci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