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한국 영화의 비주류 장르, 오컬트
2. 본론 : ‘곡성’을 통해 보는 정석적 오컬트 영화의 특성
3. 결론 : 한국의 오컬트 영화들이 나아가야 할 길
4. 참고 문헌
2. 본론 : ‘곡성’을 통해 보는 정석적 오컬트 영화의 특성
3. 결론 : 한국의 오컬트 영화들이 나아가야 할 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큰 의미가 있는 장면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곡성>이 타 한국식 오컬트 영화들과는 달리 오컬트라는 소재뿐만 아니라 장르를 깊게 이해하고 제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영화에서 오컬트라는 장르가 비주류인 이유는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와 비교해 관객들이 몰입하기 어려운, 구체적이지 않고 신비한 현상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영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컬트 영화 중 손에 꼽히는 위와 같은 영화들은 하나같이 강렬한 시각적 장면들을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오컬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신비한 현상들을 다루고 탐구하는 것이라면 오컬트 영화에선 그러한 숨겨져 있던 것들이 영화 내의 장면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직접 보이고 이것이 보는 사람이 충격적인 장면으로 인한 공포, 원인을 알 수 없는 그것한테서 오는 스릴 등을 느끼게 한다. 이는 타 공포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한국식 공포 영화는 그 원인과 결말에 있어서 ‘원혼, 사람의 한’ 등의 소재가 깊게 개입된, ‘사람 냄새’가 나는 소재들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식의 오컬트 영화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에서 비주류 장르인 오컬트 영화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포나 스릴이 아닌, 미지의 그것한테서 오는 공포와 스릴이라는 점을 극대화하면서 이를 <곡성>의 굿 장면과도 같이 강렬한 시각적 장면을 통해 몰입감을 선사하여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주요한 세일즈 포인트를 가지게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소재의 굿과 무당은 여전히 오컬트 장르 안에서 매력적인 소재이다. 눈이 아플 정도로 강한 원색의 옷을 입은 무당과, 시끄럽기 그지없는 풍물놀이들 사이에서 제물을 바치는 등의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몰입감을 선사할 수 있는 한국의 오컬트 영화는 추후에도 발전을 기대케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단순 소재만 오컬트가 아닌, <곡성>처럼 이야기의 서사에 있어서도 관객이 알 수 없는 ‘오컬트’적인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한국의 오컬트 영화 안에서도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 유재응, 이현경, \"한국 오컬트 영화 속 무당과 굿의 재현 양상 연구 - <검은 사제들>(2015), <곡성>(2016), <장산범>(2017)을 중심으로\",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서울\"
두산백과, “무당” ,
한국민속신앙사전 : 무속신앙 편, “신병”
시사상식사전, “오컬티즘”,
한국 영화에서 오컬트라는 장르가 비주류인 이유는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와 비교해 관객들이 몰입하기 어려운, 구체적이지 않고 신비한 현상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영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컬트 영화 중 손에 꼽히는 위와 같은 영화들은 하나같이 강렬한 시각적 장면들을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오컬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신비한 현상들을 다루고 탐구하는 것이라면 오컬트 영화에선 그러한 숨겨져 있던 것들이 영화 내의 장면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직접 보이고 이것이 보는 사람이 충격적인 장면으로 인한 공포, 원인을 알 수 없는 그것한테서 오는 스릴 등을 느끼게 한다. 이는 타 공포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한국식 공포 영화는 그 원인과 결말에 있어서 ‘원혼, 사람의 한’ 등의 소재가 깊게 개입된, ‘사람 냄새’가 나는 소재들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식의 오컬트 영화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에서 비주류 장르인 오컬트 영화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포나 스릴이 아닌, 미지의 그것한테서 오는 공포와 스릴이라는 점을 극대화하면서 이를 <곡성>의 굿 장면과도 같이 강렬한 시각적 장면을 통해 몰입감을 선사하여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주요한 세일즈 포인트를 가지게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소재의 굿과 무당은 여전히 오컬트 장르 안에서 매력적인 소재이다. 눈이 아플 정도로 강한 원색의 옷을 입은 무당과, 시끄럽기 그지없는 풍물놀이들 사이에서 제물을 바치는 등의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몰입감을 선사할 수 있는 한국의 오컬트 영화는 추후에도 발전을 기대케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단순 소재만 오컬트가 아닌, <곡성>처럼 이야기의 서사에 있어서도 관객이 알 수 없는 ‘오컬트’적인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한국의 오컬트 영화 안에서도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 유재응, 이현경, \"한국 오컬트 영화 속 무당과 굿의 재현 양상 연구 - <검은 사제들>(2015), <곡성>(2016), <장산범>(2017)을 중심으로\",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서울\"
두산백과, “무당” ,
한국민속신앙사전 : 무속신앙 편, “신병”
시사상식사전, “오컬티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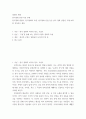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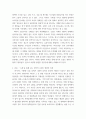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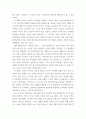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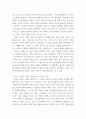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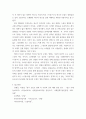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