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실험방법
3) 실험결과 및 토의
4) 결론
5) 참고문헌
2) 실험방법
3) 실험결과 및 토의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료에서 느껴지는 색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였다.
하지만 입안에서의 촉감은 기준시료에서는 매끄러움이 느껴졌으나 비교 시료에서는 흐물거림이 느껴졌다. 묵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감은 기준시료에서만 볼 수 있었다. 비교 시료는 입안에서 금방 으스러짐으로 인하여 촉감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전체적인 선호도에서도 기준시료가 높게 평가되었다. 비교 시료에서는 묵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표현까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비교 시료에서는 식용유의 함유로 인하여 약간의 느끼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비교 시료에 식용유를 포함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호도를 물었지만 이를 판단하는 이의 의견에서는 느끼함이라는 단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비교 시료에 식용유가 함유되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 또한 비교 시료가 기준시료에 반해 느끼하다는 기분이 드는 듯했다.
떪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만약 묵을 만들었을 때 특유의 떫은맛이 많이 느껴진다면 가열하기 전 가루를 물에 풀어 가라앉은 것만 건져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4. 결론
전체적인 조리과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졌지만 비교 시료는 기준시료에 반해 겔화되는 것에 소요 시간이 더 걸렸다. 또한 비교 시료를 기준시료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냉각 시간을 조금 더 주었다는 점도 실험을 통해 추가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약 30분간의 추가 냉각에도 불구하고 두 시료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확연히 달랐다.
묵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기준시료와 비교 시료의 차이점은 식용유의 첨가 여부였다. 1/5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태나 식감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호화와 겔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식용유의 함유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처음 실험을 시작할 때는 식용유의 함유로 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으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밀로오스가 물에 갇히지 못하여 묵의 모습을 갖추는 그것 자체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호화와 겔화, 노화에 이르기까지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라 판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도토리묵과 같은 전분을 함유한 재료를 이용하여 요리할 때는 호화와 겔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외하여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온도와 수분 함량에 따라 호화의 진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온도와 수분 함량을 적당한 선에 맞추어 조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한 조리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원리를 따져봄에 따라 다양한 추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도토리묵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음식을 마주할 때도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될 것 같다.
5. 참고문헌
김선아 외(2020). 조리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하지만 입안에서의 촉감은 기준시료에서는 매끄러움이 느껴졌으나 비교 시료에서는 흐물거림이 느껴졌다. 묵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감은 기준시료에서만 볼 수 있었다. 비교 시료는 입안에서 금방 으스러짐으로 인하여 촉감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전체적인 선호도에서도 기준시료가 높게 평가되었다. 비교 시료에서는 묵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표현까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비교 시료에서는 식용유의 함유로 인하여 약간의 느끼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비교 시료에 식용유를 포함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호도를 물었지만 이를 판단하는 이의 의견에서는 느끼함이라는 단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비교 시료에 식용유가 함유되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 또한 비교 시료가 기준시료에 반해 느끼하다는 기분이 드는 듯했다.
떪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만약 묵을 만들었을 때 특유의 떫은맛이 많이 느껴진다면 가열하기 전 가루를 물에 풀어 가라앉은 것만 건져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4. 결론
전체적인 조리과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졌지만 비교 시료는 기준시료에 반해 겔화되는 것에 소요 시간이 더 걸렸다. 또한 비교 시료를 기준시료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냉각 시간을 조금 더 주었다는 점도 실험을 통해 추가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약 30분간의 추가 냉각에도 불구하고 두 시료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확연히 달랐다.
묵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기준시료와 비교 시료의 차이점은 식용유의 첨가 여부였다. 1/5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태나 식감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호화와 겔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식용유의 함유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처음 실험을 시작할 때는 식용유의 함유로 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으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밀로오스가 물에 갇히지 못하여 묵의 모습을 갖추는 그것 자체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호화와 겔화, 노화에 이르기까지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라 판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도토리묵과 같은 전분을 함유한 재료를 이용하여 요리할 때는 호화와 겔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외하여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온도와 수분 함량에 따라 호화의 진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온도와 수분 함량을 적당한 선에 맞추어 조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한 조리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원리를 따져봄에 따라 다양한 추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도토리묵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음식을 마주할 때도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될 것 같다.
5. 참고문헌
김선아 외(2020). 조리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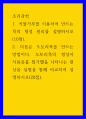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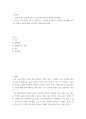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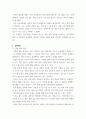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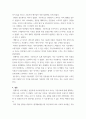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