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벌귀족
2) 권문세족
3)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서경천도운동 (난)
4) 내가 만일 인종이었다면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문벌귀족
2) 권문세족
3)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서경천도운동 (난)
4) 내가 만일 인종이었다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35년 인종은 이러한 이자겸의 난에 의해서 낮아진 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경 출신의 풍수도참설을 기반으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서경 천도를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서경 천도를 추진한 승려 묘청은 서경 출신으로 서경 천도를 주장하며 풍수지리 사상인 불교를 지향하고 자주적이며 진취적인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진 자였다. 하지만 개경 출신인 김부식에 의해서 이 서경 천도는 취소되게 되는데 이는 극동 파인 묘청과의 한 학파 김부식의 고민이 되었다. 김부식은 서경 천도에 반대하였던 유교 사상을 가지고 신라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던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자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묘청은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1년여 만에 이들은 토벌 당하게 되었다.
4) 내가 만일 인종이었다면
인종의 잘못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강한 세력의 집안을 들인다는 것은 아주 먼 옛날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은 이자겸에게 만족할만한 자리를 내주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했다. 제도 자체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필요했을지 모른다. 이자겸의 난은 결국 묘청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고려 수도인 개경이 기운이 다해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는 결국 왕건을 넘보는 것이 아닌 왕권을 지속 계승하는 것을 위해서 일어난 일인데 두 가지 모두 가설이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도에 대한 가설 및 십 팔자의 왕실과 같은 가설을 통제하거나 관리를 했다면 마치 가설을 확인하고 쳐들어오는 적에 맞서 싸운다는 의미보다는 가설 자체를 통제하고 관리함에 따라서 정치적인 통치를 하였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서도 더 원활히 실속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한다.
3. 결론
고려 시대의 이 이야기는 흥미롭다. 무언가의 신봉에 대한 의미로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신봉으로 마찰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신 복적인 잘못된 가설 자체를 관리해주는 것이 역사적으로 혹은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위험 관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인간의 욕심과 허영에 대한 권력의 달콤함에 의한 인간의 권력욕은 끝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서금석 (2016) 고려시대 역법과 역일 연구 전남대학교
2. 김보광 (2011) 고려 내시 연구
3. 이슬기 (2018) 고려 초 문신관료의 성장과 중국문화의 수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4) 내가 만일 인종이었다면
인종의 잘못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강한 세력의 집안을 들인다는 것은 아주 먼 옛날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은 이자겸에게 만족할만한 자리를 내주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했다. 제도 자체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필요했을지 모른다. 이자겸의 난은 결국 묘청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고려 수도인 개경이 기운이 다해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는 결국 왕건을 넘보는 것이 아닌 왕권을 지속 계승하는 것을 위해서 일어난 일인데 두 가지 모두 가설이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도에 대한 가설 및 십 팔자의 왕실과 같은 가설을 통제하거나 관리를 했다면 마치 가설을 확인하고 쳐들어오는 적에 맞서 싸운다는 의미보다는 가설 자체를 통제하고 관리함에 따라서 정치적인 통치를 하였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서도 더 원활히 실속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한다.
3. 결론
고려 시대의 이 이야기는 흥미롭다. 무언가의 신봉에 대한 의미로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신봉으로 마찰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신 복적인 잘못된 가설 자체를 관리해주는 것이 역사적으로 혹은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위험 관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인간의 욕심과 허영에 대한 권력의 달콤함에 의한 인간의 권력욕은 끝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서금석 (2016) 고려시대 역법과 역일 연구 전남대학교
2. 김보광 (2011) 고려 내시 연구
3. 이슬기 (2018) 고려 초 문신관료의 성장과 중국문화의 수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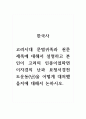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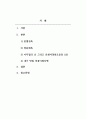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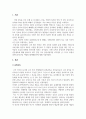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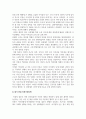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