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개소문 선정이유
2) 업적과 일반적 해석 및 평가
3) 새로운 해석과 재평가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연개소문 선정이유
2) 업적과 일반적 해석 및 평가
3) 새로운 해석과 재평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다녔고, 말을 타고내릴 때 장수를 받침으로 했다는 글이 남아 있다. 하지만 ‘구당서’ 당나라의 정사로 24사 중의 하나다. 당고조의 건국부터 나라멸망까지 21명의 황제가 통치한 290년의 당나라 역사의 기록이다.
, ‘신당서’ 신당서는 북송 인종이 구당서의 내용이 왜곡된 것이 많고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당나라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의 경우 당나라의 정사인 만큼 당을 처절하게 패배하게 만들었던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묘사한 연개소문에 대한 사치와 독재 부분은 왜곡된 내용이 많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후 연개소문의 집권기를 보면 연개소문이 지략가이고 당당한 무인이었고 고구려의 전권을 장악한 전략가로 볼 수 있겠다. 수많은 고당전투에서 승전하고, 당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장수가 우리 역사를 통틀어 거의 볼 수 없는 점을 생각하면 불리한 여건에서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신라 김춘추의 동맹제의를 거절해서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했다는 측면도 당시 고구려가 이미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고, 백제가 신라에게 승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외교적인 무능이라고까지 폄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후 여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연이어 패망하게 되지만, 이를 모두 연개소문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개소문이 군주를 능가하는 권력을 지녔음에도 세명의 자식 중에서 확실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아 이후 자식들의 권력투쟁을 방치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수긍할만하다. 일각에서는 연개소문이 제대로 된 왕을 다시 세워서 자신의 사후를 대비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장자세습의 의식이 강했던 당시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왕을 포함한 다른 세력에게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당시 고구려의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고구려는 전성기를 지나 왕조의 마지막으로 가는 시기였고, 당나라는 나라가 건국 된지 얼마 안되는 신흥강대국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흥강대국에 의한 고구려의 멸망은 정해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개소문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이를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경우에도 선덕여황, 김춘추로 이어지는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었고, 김유신 등의 걸출한 장수, 화랑제도를 통한 뒷받침 등이 있었다. 또한 고구려에 복수를 꿈꾸는 당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당 연합은 비교적 쉬운 선택이었다. 따라서 이를 연개소문의 사후에까지 막아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개소문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가로 볼 수 있겠다. 혁명과 쿠데타를 구분짓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후 나라에 미친 영향으로 본다면 연개소문은 이후 당나라의 침공에 맞서 고구려를 지킨 명장이므로 쿠데타가 아닌 혁명을 한 지도자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사실 확인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연개소문의 독재와 부귀영화를 누린 정황 등에서는 혁명 이후에 부패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뒤 고구려의 나쁜 구습을 철폐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역적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평가받는 면이 강했을 것이다. 또 사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 아들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고구려 멸망을 자초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3. 결론
연개소문은 한편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막은 영웅으로, 다른 편에서는 왕을 죽이고 권력을 쟁취한 역적으로 평가한다. 두 가지 사실은 모두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다만 어떤 시각으로 평가할 것인가만 다를 뿐이다. 특히 왕에 대한 절대 충성이 최고의 가치인 왕조시대에서 연개소문은 업적보다 역적의 이미지가 강했으나,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중요한 가치인 현대사회에서는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론에서는 한국사에서 재평가되어야 하는 인물로 연개소문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연개소문의 업적과 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평가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개소문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본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과 재평가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연개소문의 후계구도 정립과 사망, 박용철, 대구사학회, 2018
2. ‘고구려 연개소문 정권의 한계성’, 김기흥, 1992년
3. 연개소문, 나무위키, 2022
, ‘신당서’ 신당서는 북송 인종이 구당서의 내용이 왜곡된 것이 많고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당나라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의 경우 당나라의 정사인 만큼 당을 처절하게 패배하게 만들었던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묘사한 연개소문에 대한 사치와 독재 부분은 왜곡된 내용이 많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후 연개소문의 집권기를 보면 연개소문이 지략가이고 당당한 무인이었고 고구려의 전권을 장악한 전략가로 볼 수 있겠다. 수많은 고당전투에서 승전하고, 당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장수가 우리 역사를 통틀어 거의 볼 수 없는 점을 생각하면 불리한 여건에서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신라 김춘추의 동맹제의를 거절해서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했다는 측면도 당시 고구려가 이미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고, 백제가 신라에게 승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외교적인 무능이라고까지 폄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후 여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연이어 패망하게 되지만, 이를 모두 연개소문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개소문이 군주를 능가하는 권력을 지녔음에도 세명의 자식 중에서 확실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아 이후 자식들의 권력투쟁을 방치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수긍할만하다. 일각에서는 연개소문이 제대로 된 왕을 다시 세워서 자신의 사후를 대비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장자세습의 의식이 강했던 당시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왕을 포함한 다른 세력에게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당시 고구려의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고구려는 전성기를 지나 왕조의 마지막으로 가는 시기였고, 당나라는 나라가 건국 된지 얼마 안되는 신흥강대국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흥강대국에 의한 고구려의 멸망은 정해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개소문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이를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경우에도 선덕여황, 김춘추로 이어지는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었고, 김유신 등의 걸출한 장수, 화랑제도를 통한 뒷받침 등이 있었다. 또한 고구려에 복수를 꿈꾸는 당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당 연합은 비교적 쉬운 선택이었다. 따라서 이를 연개소문의 사후에까지 막아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개소문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가로 볼 수 있겠다. 혁명과 쿠데타를 구분짓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후 나라에 미친 영향으로 본다면 연개소문은 이후 당나라의 침공에 맞서 고구려를 지킨 명장이므로 쿠데타가 아닌 혁명을 한 지도자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사실 확인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연개소문의 독재와 부귀영화를 누린 정황 등에서는 혁명 이후에 부패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뒤 고구려의 나쁜 구습을 철폐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역적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평가받는 면이 강했을 것이다. 또 사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 아들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고구려 멸망을 자초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3. 결론
연개소문은 한편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막은 영웅으로, 다른 편에서는 왕을 죽이고 권력을 쟁취한 역적으로 평가한다. 두 가지 사실은 모두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다만 어떤 시각으로 평가할 것인가만 다를 뿐이다. 특히 왕에 대한 절대 충성이 최고의 가치인 왕조시대에서 연개소문은 업적보다 역적의 이미지가 강했으나,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중요한 가치인 현대사회에서는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론에서는 한국사에서 재평가되어야 하는 인물로 연개소문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연개소문의 업적과 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평가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개소문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본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과 재평가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연개소문의 후계구도 정립과 사망, 박용철, 대구사학회, 2018
2. ‘고구려 연개소문 정권의 한계성’, 김기흥, 1992년
3. 연개소문, 나무위키,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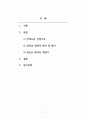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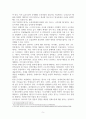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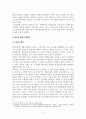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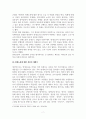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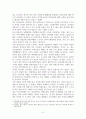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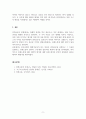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