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접시
(1) 이로에 소나무, 대나무, 매화무늬 접시
(2) 소메쓰게 안개 매화무늬 큰 접시
(3) 이로에 호랑이무의 접시
2) 가면
(1) 노가면 시카미
(2) 노가면 고히메
3) 갑옷
(1) 여러 색 끈으로 엮은 도세구소쿠 갑옷
(2) 흰색 끈으로 엮은 도마루 갑옷
(3) 보라색 끈으로 엮은 니마이도 갑옷
3.
결론
서론
2.
본론
1) 접시
(1) 이로에 소나무, 대나무, 매화무늬 접시
(2) 소메쓰게 안개 매화무늬 큰 접시
(3) 이로에 호랑이무의 접시
2) 가면
(1) 노가면 시카미
(2) 노가면 고히메
3) 갑옷
(1) 여러 색 끈으로 엮은 도세구소쿠 갑옷
(2) 흰색 끈으로 엮은 도마루 갑옷
(3) 보라색 끈으로 엮은 니마이도 갑옷
3.
결론
본문내용
면 그들 자체의 권력적인 욕구를 생각해보게 된다.
(2) 흰색 끈으로 엮은 도마루 갑옷
이 갑옷은 몸통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입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움직이기 편리하게 되어서 다리에 대한 편리함을 강조한 갑옷이다.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사 갑옷을 입는 빈도수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단순히 전투에서의 움직임을 생각했다면 다리에만 편리를 두었을 것인데 입기 편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이 갑옷을 입는 빈도수가 잦았다는 것을 의미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은 편리하고 빨리 입을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전투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불시적으로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을 시대에서의 특수성이 이 갑옷 자체에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치 급습을 하는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 특성에 있어서 빠르게 전투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제작이 된 것처럼 말이다.
(3) 보라색 끈으로 엮은 니마이도 갑옷
몸통 부분이 앞뒤로 나뉘었다. 앞서 본 갑옷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갑옷이다. 색깔이 흰색끈 보라색 끈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서 계급이나 전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색으로 분류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무사의 갑옷 자체의 느낌은 낯설고 잔인해 보이는 상징물로 느껴지기도 하며 일본 자체의 투쟁적인 전투적인 쟁취적인 민족의 특성이 담겨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투구에 있는 장식으로 보았을 때 이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착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 투구를 쓰고 전투에 나갔다가는 단 한명도 상대하기는 어려웠을 테니 말이다. 무사의 갑옷을 보면 삼각형이라는 도형적인 특성의 요소가 많다고 생각했다. 왠지 저 시대의 사람들의 얼굴형도 삼각형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이니 말이다.
3. 결론
일본의 신의 존재 혹은 신을 통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혹은 그 존재 자체의 강렬함을 엿볼 수 있었다. 저 시대의 일본인들의 내면의 자기애나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있다는 것을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 세계의 역사 일본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showroom/756/view?relicId=25950
2. 원혜신 (2005)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용한 일본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 흰색 끈으로 엮은 도마루 갑옷
이 갑옷은 몸통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입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움직이기 편리하게 되어서 다리에 대한 편리함을 강조한 갑옷이다.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사 갑옷을 입는 빈도수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단순히 전투에서의 움직임을 생각했다면 다리에만 편리를 두었을 것인데 입기 편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이 갑옷을 입는 빈도수가 잦았다는 것을 의미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은 편리하고 빨리 입을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전투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불시적으로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을 시대에서의 특수성이 이 갑옷 자체에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치 급습을 하는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 특성에 있어서 빠르게 전투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제작이 된 것처럼 말이다.
(3) 보라색 끈으로 엮은 니마이도 갑옷
몸통 부분이 앞뒤로 나뉘었다. 앞서 본 갑옷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갑옷이다. 색깔이 흰색끈 보라색 끈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서 계급이나 전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색으로 분류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무사의 갑옷 자체의 느낌은 낯설고 잔인해 보이는 상징물로 느껴지기도 하며 일본 자체의 투쟁적인 전투적인 쟁취적인 민족의 특성이 담겨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투구에 있는 장식으로 보았을 때 이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착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 투구를 쓰고 전투에 나갔다가는 단 한명도 상대하기는 어려웠을 테니 말이다. 무사의 갑옷을 보면 삼각형이라는 도형적인 특성의 요소가 많다고 생각했다. 왠지 저 시대의 사람들의 얼굴형도 삼각형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이니 말이다.
3. 결론
일본의 신의 존재 혹은 신을 통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혹은 그 존재 자체의 강렬함을 엿볼 수 있었다. 저 시대의 일본인들의 내면의 자기애나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있다는 것을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 세계의 역사 일본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showroom/756/view?relicId=25950
2. 원혜신 (2005)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용한 일본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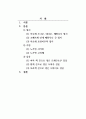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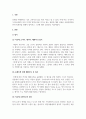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