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탐구 주제 및 관련 단원
Ⅱ. 탐구 주제 선정 이유
Ⅲ. 탐구 요약
Ⅳ. 탐구 내용
Ⅴ. 탐구 결과
Ⅵ. 탐구 후 배우고 느낀 점
Ⅶ. 참고 자료 및 도서 출처
Ⅱ. 탐구 주제 선정 이유
Ⅲ. 탐구 요약
Ⅳ. 탐구 내용
Ⅴ. 탐구 결과
Ⅵ. 탐구 후 배우고 느낀 점
Ⅶ. 참고 자료 및 도서 출처
본문내용
을 ‘스스로 깎지 않는’ 모든 사람의 수염을 전부 깎아줄 것이다. 다만 ‘스스로 깎는’ 사람은 깎아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때 이 이발사의 수염은 누가 깎아줘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이 이발사의 수염을 깎아주는 경우 이 이발사는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는\' 사람에 속하므로, 선언한 바에 따라 자신의 수염을 깎아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수염을 깎는다면 이 이발사는 수염을 \'스스로 깎는\' 사람에 속하므로, 선언한 바에 따라 자신의 수염을 깎을 수 없다.
이 이발사는 어찌하면 되는가?
(2) 도서관 사서의 역설
어떤 도서관 사서가 자신이 근무하는 도서관의 책을 분류하기 위해 카탈로그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카탈로그를 전부 만든 도서관 사서는 마지막으로 두 개의 카탈로그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의 카탈로그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카탈로그를 대상(원소)으로 하는 카탈로그이며, 카탈로그 A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카탈로그들의 카탈로그\', 카탈로그 B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카탈로그들의 카탈로그\'로 정의하여 지금까지 만든 카탈로그를 전부 카탈로그로 묶었고 추후 새로 만들어지는 카탈로그도 두 카탈로그 중 하나에 속하도록 만들었다. (당연히 A와 B의 정의는 상반되므로 모든 카탈로그는 A와 B 둘 중 하나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카탈로그 A와 카탈로그 B도 (도서관에 있는 카탈로그이므로) 카탈로그 A와 카탈로그 B 중 하나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카탈로그 B는 카탈로그 B에 속해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카탈로그 B는 카탈로그 B를 원소로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카탈로그\'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카탈로그 B에 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탈로그 A는 카탈로그 A에도 B에도 들어갈 수 없다. 만약 카탈로그 A가 카탈로그 A에 속하게 되면 카탈로그 A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카탈로그\'가 되므로 카탈로그 A에 속할 수 없다. 그러나 카탈로그 A가 카탈로그 B에 속하게 되면 카탈로그 A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카탈로그\'가 되므로 카탈로그 B에 속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카탈로그 A는 A에도 B에도 속할 수 없는 카탈로그가 되고, 도서관의 모든 카탈로그는 카탈로그 A와 B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라는 점과 모순이 발생한다.
(3) 카드 역설 (주르댕)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카드 한 장을 꺼내 앞면에 “이 카드의 뒷면에 적힌 문장은 진실”이라고 썼다. 그런 다음 카드를 뒤집어 “이 카드의 다른 면에 적힌 문장은 거짓”이라고 썼다. 앞면의 문장이 참이면 뒷면의 문장은 진실이어야 한다. 뒷면의 문장이 진실이려면 앞면의 문장이 거짓이어야 한다. 결국 앞면의 문장이 참이라는 가정과 모순을 이룬다. 앞면의 문장이 처음부터 거짓이라면, 뒷면의 문장은 거짓이 되므로 다시 앞면의 문장이 참이어야 해 모순이다.
3. 계형이론
러샐은 이러한 오류가 만들어진 이유가 집합의 정의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집합을 그냥 원소를 모아놓은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다른 사람이 이 이발사의 수염을 깎아주는 경우 이 이발사는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는\' 사람에 속하므로, 선언한 바에 따라 자신의 수염을 깎아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수염을 깎는다면 이 이발사는 수염을 \'스스로 깎는\' 사람에 속하므로, 선언한 바에 따라 자신의 수염을 깎을 수 없다.
이 이발사는 어찌하면 되는가?
(2) 도서관 사서의 역설
어떤 도서관 사서가 자신이 근무하는 도서관의 책을 분류하기 위해 카탈로그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카탈로그를 전부 만든 도서관 사서는 마지막으로 두 개의 카탈로그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의 카탈로그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카탈로그를 대상(원소)으로 하는 카탈로그이며, 카탈로그 A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카탈로그들의 카탈로그\', 카탈로그 B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카탈로그들의 카탈로그\'로 정의하여 지금까지 만든 카탈로그를 전부 카탈로그로 묶었고 추후 새로 만들어지는 카탈로그도 두 카탈로그 중 하나에 속하도록 만들었다. (당연히 A와 B의 정의는 상반되므로 모든 카탈로그는 A와 B 둘 중 하나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카탈로그 A와 카탈로그 B도 (도서관에 있는 카탈로그이므로) 카탈로그 A와 카탈로그 B 중 하나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카탈로그 B는 카탈로그 B에 속해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카탈로그 B는 카탈로그 B를 원소로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카탈로그\'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카탈로그 B에 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탈로그 A는 카탈로그 A에도 B에도 들어갈 수 없다. 만약 카탈로그 A가 카탈로그 A에 속하게 되면 카탈로그 A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카탈로그\'가 되므로 카탈로그 A에 속할 수 없다. 그러나 카탈로그 A가 카탈로그 B에 속하게 되면 카탈로그 A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카탈로그\'가 되므로 카탈로그 B에 속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카탈로그 A는 A에도 B에도 속할 수 없는 카탈로그가 되고, 도서관의 모든 카탈로그는 카탈로그 A와 B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라는 점과 모순이 발생한다.
(3) 카드 역설 (주르댕)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카드 한 장을 꺼내 앞면에 “이 카드의 뒷면에 적힌 문장은 진실”이라고 썼다. 그런 다음 카드를 뒤집어 “이 카드의 다른 면에 적힌 문장은 거짓”이라고 썼다. 앞면의 문장이 참이면 뒷면의 문장은 진실이어야 한다. 뒷면의 문장이 진실이려면 앞면의 문장이 거짓이어야 한다. 결국 앞면의 문장이 참이라는 가정과 모순을 이룬다. 앞면의 문장이 처음부터 거짓이라면, 뒷면의 문장은 거짓이 되므로 다시 앞면의 문장이 참이어야 해 모순이다.
3. 계형이론
러샐은 이러한 오류가 만들어진 이유가 집합의 정의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집합을 그냥 원소를 모아놓은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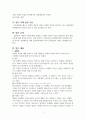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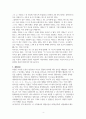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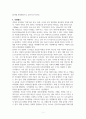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