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목차
논산 개관
Ⅱ. 강경 미내다리와 논산 원목다리
Ⅲ. 계백묘
Ⅳ. 견훤묘
Ⅴ. 개태사(開泰寺)
Ⅵ. 논산 쌍계사(雙溪寺)
Ⅶ. 관촉사(灌燭寺)
Ⅷ. 돈암서원(遯巖書院)
Ⅱ. 강경 미내다리와 논산 원목다리
Ⅲ. 계백묘
Ⅳ. 견훤묘
Ⅴ. 개태사(開泰寺)
Ⅵ. 논산 쌍계사(雙溪寺)
Ⅶ. 관촉사(灌燭寺)
Ⅷ. 돈암서원(遯巖書院)
본문내용
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특권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우선 양민에게만 지워졌던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또,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의 실시를 통해 양반의 노비증식을 억제하고 되도록 양민이 노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는 또 서북지방(평안도·함경도) 인재의 등용과 서얼(庶蘖)의 허통을 주장하고 양반부녀자들의 개가를 허용할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회정책은 양민의 생활안정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대동법(大同法)을 확대, 시행하며, 양민들의 군비부담을 줄이는 호포제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그 자신이 빈민의 구제를 위한 사창(社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도 노비제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노비도 같은 인간임을 인식시켜 부당한 사역이나 가혹한 행위를 억제하도록 역설하였다. 충절이나 선행이 드러난 경우에는 서얼·농민·천민에 이르기까지 전기나 묘문·제문을 지어 표창하였다.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효행·정절·순종 등 전통적 미덕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가계의 관리와 재산 증식 등 주부권과 관련된 경제적 구실도 중시하였다.
사회 풍속 면에서는 중국적·유교적인 것을 숭상하여 토속적·비유교적인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혼례 등의 예속과 복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세속과 다른 중국습속들을 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여 교화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문장과 서체에서도 뛰어났는데, 문장은 한유(韓愈)·구양수(歐陽修)의 문체에 정자(程子)·주자의 의리를 기조로 하였기 때문에 웅장하면서도 유려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완곡한 면이 있었고, 특히 강건하고 힘이 넘치는 문장으로 평판이 높았다. 시·부(賦)·책(策)·서(序)·발(跋)·소차(疏箚)·묘문 등 모든 글에 능하였으나 특히 비(碑)·갈(碣)·지문(誌文) 등 묘문에 명성이 있어 청탁을 받아 지은 것이 수 백편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영릉지문(寧陵誌文: 효종릉의 지문)은 명문으로 손꼽힌다. 서체는 처음 안진경체(顔眞卿體)를 익히다가 뒤에 주자를 모방하게 되어 정체(正體)를 잃었으나 매우 개성적인 경지에 이르러 창고(蒼古)하고 힘에 넘치는 것으로 평판이 있었다. 그 글씨를 받아 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현재도 많이 전하고 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자 그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제사가 내려졌다. 이해에 수원·정읍·충주 등지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졌고, 다음해에는 시장(諡狀)없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때부터 덕원·화양동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서원이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약 70여개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 사액서원만 37개소였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파간에 칭송과 비방이 무성하였으나, 1716년의 병신처분(丙申處分)과 1744년(영조 20)의 문묘배향으로 그의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되었고, 영조 및 정조대에 노론의 일당전제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고 존중되었다.
3) 저술
그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 자신이 찬술하거나 편집하여 간행한 저서들과 사후에 수집되어 간행된 문집으로 대별된다. 저서로는 《주자대전차의》·《주자어류소분》·《이정서분류 二程書分類》·《논맹문의통고 論孟問義通攷》·《경례의의 經禮疑義》·《심경석의 心經釋義》·《찬정소학언해 纂定小學諺解》·《주문초선 朱文抄選》·《계녀서》 등이 있다.
문집은 1717년(숙종 43)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처음으로 편집, 167권을 철활자로 간행하여 《우암집 尤菴集》이라 하였고, 1787년(정조 11) 다시 빠진 글들을 수집, 보완하여 평양감영에서 목판으로 215권 102책을 출간하고 《송자대전 宋子大全》이라 명명하였다. 그 뒤 9대손 병선(秉璿)·병기(秉) 등에 의하여 《송서습유 宋書拾遺》 9권, 《속습유 續拾遺》 1권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1971년 사문학회(斯文學會)에서 합본으로 영인, 《송자대전》 7책으로 간행하였고, 1981년부터 한글 발췌 번역본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4책으로 출간되고 있다.
* 돈암서원의 의의
돈암서원(遯巖書院)은 규모가 큰 서원은 아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서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서원이라는 사학의 형태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오히려 제를 올리고 학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화려한 모습이 보여 지는 것이 더 이상할지도 모른다.
사전 조사하였던 돈암서원비문에 의하면 방, 대청, 툇마루, 행랑을 갖춘 응도당이 있었고, 응도당의 왼쪽에 거경제(居敬齋) 오른쪽에 정의재(精義齋)라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나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로서는 그 건물이 어느 것인지를 분간하기도 어렵고 곳곳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지지 못한 아쉬움이 보였다. 서원 안으로는 화재에 대비한다고는 하나 어울리지 않게 소화전이 버젓이 건물 바로 옆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저기 부식되거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지 않고 허술하게 방치된 부분이 많았다. 지방의 작은 문화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포한 의미가 분명히 보여 지는 것 이상일 것인데 후대에 관리가 소홀하여 심지어 방치된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그 의미를 퇴색 시키는 것으로 마저 보일 정도였다.
다만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닌 만큼 돈암서원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 사적이다.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는 인재를 키우고 선현 · 향현을 제사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구실을 하는 등 설립의 의도 자체만으로도 정치·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후에 그 수가 증가하며 많은 폐단과 민폐를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넓게는 조선 초, 중기 이후의 정치, 사회, 학문적, 인물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서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당시 여러 시대적 상황들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추론을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좀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원이 가지는 현대에서의 중요한 의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의 실시를 통해 양반의 노비증식을 억제하고 되도록 양민이 노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는 또 서북지방(평안도·함경도) 인재의 등용과 서얼(庶蘖)의 허통을 주장하고 양반부녀자들의 개가를 허용할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회정책은 양민의 생활안정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대동법(大同法)을 확대, 시행하며, 양민들의 군비부담을 줄이는 호포제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그 자신이 빈민의 구제를 위한 사창(社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도 노비제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노비도 같은 인간임을 인식시켜 부당한 사역이나 가혹한 행위를 억제하도록 역설하였다. 충절이나 선행이 드러난 경우에는 서얼·농민·천민에 이르기까지 전기나 묘문·제문을 지어 표창하였다.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효행·정절·순종 등 전통적 미덕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가계의 관리와 재산 증식 등 주부권과 관련된 경제적 구실도 중시하였다.
사회 풍속 면에서는 중국적·유교적인 것을 숭상하여 토속적·비유교적인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혼례 등의 예속과 복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세속과 다른 중국습속들을 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여 교화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문장과 서체에서도 뛰어났는데, 문장은 한유(韓愈)·구양수(歐陽修)의 문체에 정자(程子)·주자의 의리를 기조로 하였기 때문에 웅장하면서도 유려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완곡한 면이 있었고, 특히 강건하고 힘이 넘치는 문장으로 평판이 높았다. 시·부(賦)·책(策)·서(序)·발(跋)·소차(疏箚)·묘문 등 모든 글에 능하였으나 특히 비(碑)·갈(碣)·지문(誌文) 등 묘문에 명성이 있어 청탁을 받아 지은 것이 수 백편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영릉지문(寧陵誌文: 효종릉의 지문)은 명문으로 손꼽힌다. 서체는 처음 안진경체(顔眞卿體)를 익히다가 뒤에 주자를 모방하게 되어 정체(正體)를 잃었으나 매우 개성적인 경지에 이르러 창고(蒼古)하고 힘에 넘치는 것으로 평판이 있었다. 그 글씨를 받아 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현재도 많이 전하고 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자 그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제사가 내려졌다. 이해에 수원·정읍·충주 등지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졌고, 다음해에는 시장(諡狀)없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때부터 덕원·화양동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서원이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약 70여개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 사액서원만 37개소였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파간에 칭송과 비방이 무성하였으나, 1716년의 병신처분(丙申處分)과 1744년(영조 20)의 문묘배향으로 그의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되었고, 영조 및 정조대에 노론의 일당전제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고 존중되었다.
3) 저술
그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 자신이 찬술하거나 편집하여 간행한 저서들과 사후에 수집되어 간행된 문집으로 대별된다. 저서로는 《주자대전차의》·《주자어류소분》·《이정서분류 二程書分類》·《논맹문의통고 論孟問義通攷》·《경례의의 經禮疑義》·《심경석의 心經釋義》·《찬정소학언해 纂定小學諺解》·《주문초선 朱文抄選》·《계녀서》 등이 있다.
문집은 1717년(숙종 43)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처음으로 편집, 167권을 철활자로 간행하여 《우암집 尤菴集》이라 하였고, 1787년(정조 11) 다시 빠진 글들을 수집, 보완하여 평양감영에서 목판으로 215권 102책을 출간하고 《송자대전 宋子大全》이라 명명하였다. 그 뒤 9대손 병선(秉璿)·병기(秉) 등에 의하여 《송서습유 宋書拾遺》 9권, 《속습유 續拾遺》 1권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1971년 사문학회(斯文學會)에서 합본으로 영인, 《송자대전》 7책으로 간행하였고, 1981년부터 한글 발췌 번역본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4책으로 출간되고 있다.
* 돈암서원의 의의
돈암서원(遯巖書院)은 규모가 큰 서원은 아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서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서원이라는 사학의 형태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오히려 제를 올리고 학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화려한 모습이 보여 지는 것이 더 이상할지도 모른다.
사전 조사하였던 돈암서원비문에 의하면 방, 대청, 툇마루, 행랑을 갖춘 응도당이 있었고, 응도당의 왼쪽에 거경제(居敬齋) 오른쪽에 정의재(精義齋)라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나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로서는 그 건물이 어느 것인지를 분간하기도 어렵고 곳곳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지지 못한 아쉬움이 보였다. 서원 안으로는 화재에 대비한다고는 하나 어울리지 않게 소화전이 버젓이 건물 바로 옆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저기 부식되거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지 않고 허술하게 방치된 부분이 많았다. 지방의 작은 문화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포한 의미가 분명히 보여 지는 것 이상일 것인데 후대에 관리가 소홀하여 심지어 방치된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그 의미를 퇴색 시키는 것으로 마저 보일 정도였다.
다만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닌 만큼 돈암서원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 사적이다.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는 인재를 키우고 선현 · 향현을 제사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구실을 하는 등 설립의 의도 자체만으로도 정치·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후에 그 수가 증가하며 많은 폐단과 민폐를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넓게는 조선 초, 중기 이후의 정치, 사회, 학문적, 인물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서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당시 여러 시대적 상황들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추론을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좀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원이 가지는 현대에서의 중요한 의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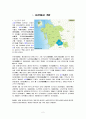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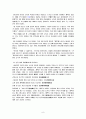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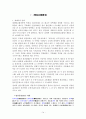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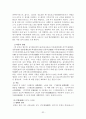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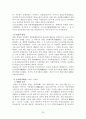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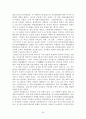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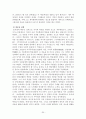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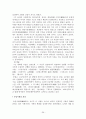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