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대성의 조건
2. 김수영적 모더니즘의 문제의식
3. 고독의 의미 : 유교적 근본주의와 경건성
4. 맺음말
2. 김수영적 모더니즘의 문제의식
3. 고독의 의미 : 유교적 근본주의와 경건성
4. 맺음말
본문내용
人之有文章 猶草木之有榮華耳 (中略) 誠意正心 以培其根 篤行修身 以安其幹 窮經硏禮 以行其津液 博聞遊藝 以敷其條葉 於是類其所覺 以之爲蓄 宣其所蓄 以之爲文 則人之見之者 見以爲文章 斯之謂文章 文章不可以襲取之也.\"
정약용, 「與猶堂全書」, 卷十七, 爲陽德人邊知意贈言.
\'言志가 곧 道\'라는 생각은 성리학의 정체를 목도한 儒者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개혁적 사고였다. 근본주의 정신을 가진 이들은 實學이라는 새로운 대안에 동의하는 대신 先秦儒家로의 復歸를 꿈꾸었다. 그들은 현실이 언어와 실체를 분리시키고, 이념과 정신을 배리케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 근대주의는 똑같은 문제를 시인들에게 안겨 주었다. 그리고 김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대체로 시의 경험이 낮은 시기에는, 우리들은 시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수가 많으나, 시의 어느 정도의 훈련과 지혜를 갖게 되면, 시를 <기다리는> 자세로 성숙해간다는 나의 체험이 건방진 것이 되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나는 이런 일종의 수동적 태세를 의식적으로 실험해 보고 있다.
김수영, 「生活의 克服-담배갑의 메모」(1966.4)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독을 의미한다. 고독을 겪어 내적으로 충일해질 때, 비로소 형식이 나온다. 그는 근대서으이 문제마저도 이렇게 보고 있다. 시의 모더니티란 외부로부터 부과하는 감각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성의 火焰이며, 따라서 그것은 시인이 온몸으로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수영, 「詩月評 : 모더니티의 문제」(1964. 4), 『전집 2』,
자신이 오든류의 이미지스트를 선호했다는 표현은 이런 점에서 음미해야 할 문제이다. 그가 어째서「눈」을 쓰고 \'만세! 만세!\'를 외쳤겠는가. 그는 답한다. \'나는 언어에 밀착했다.\'고. 그가 어째서「美人」을 쓰고 \'됐다! 이 작품은 합격이다.\'며 환호했겠는가. 그는 인용으로 답한다. \"우리들의 입의 입김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세계의 繪畵가 되고, 우리들의 사상과 감정의 기본형이 된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한 줄기의 나풀거리는 산들바람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神的인 입김이 우리들의 신변에서 일지 않고 마법의 음색처럼 우리들의 입술 위에 감돌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필경 모두가 아직도 숲속을 뛰어 다니는 동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수영, 「반시론」(1968), 『전집 2』, p.262.
4. 맺음말
김윤식은 그의 산문이 \'경박하고 날카로운\' 양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김수영의 산문 행위는 시에서 받는 유교적 근본주의의 무게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행위였다고 할 만하다.
김윤식, 「김수영 변증법의 표정」, 『전집 3』, 민음사, p.298.
그것은 화해라기보다는 시와 산문의 싸움 같이 여겨진다. 근대주의의 솔직한 고민이 산문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이와 유사하게 읽는다. 그러나 산문에는 좀처럼 쓰지 않는 한자어들을 시 속에 깔아 두는 시인의 \'의도적 농락\'을 간단없이 넘길 수 있을까.
어쩌면「거대한 뿌리」의 반동적인 발언이 은근슬쩍 흘려놓은 진의를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김수영은 근대성을 미래파적인 관점에서는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관점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은 의식적인 것이고, 그렇게해서 그가 얻은 근대주의로는 유감스럽게도 성공작을 얻지 못한 듯 보인다.「풀」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성공작이라 평하는 작품인데, 그가 필경「孟子」를 참조하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풀을 누이는 것을 백성의 교화에 대한 비유로 삼은 유교 경전과 너무 닮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가.
정약용, 「與猶堂全書」, 卷十七, 爲陽德人邊知意贈言.
\'言志가 곧 道\'라는 생각은 성리학의 정체를 목도한 儒者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개혁적 사고였다. 근본주의 정신을 가진 이들은 實學이라는 새로운 대안에 동의하는 대신 先秦儒家로의 復歸를 꿈꾸었다. 그들은 현실이 언어와 실체를 분리시키고, 이념과 정신을 배리케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 근대주의는 똑같은 문제를 시인들에게 안겨 주었다. 그리고 김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대체로 시의 경험이 낮은 시기에는, 우리들은 시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수가 많으나, 시의 어느 정도의 훈련과 지혜를 갖게 되면, 시를 <기다리는> 자세로 성숙해간다는 나의 체험이 건방진 것이 되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나는 이런 일종의 수동적 태세를 의식적으로 실험해 보고 있다.
김수영, 「生活의 克服-담배갑의 메모」(1966.4)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독을 의미한다. 고독을 겪어 내적으로 충일해질 때, 비로소 형식이 나온다. 그는 근대서으이 문제마저도 이렇게 보고 있다. 시의 모더니티란 외부로부터 부과하는 감각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성의 火焰이며, 따라서 그것은 시인이 온몸으로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수영, 「詩月評 : 모더니티의 문제」(1964. 4), 『전집 2』,
자신이 오든류의 이미지스트를 선호했다는 표현은 이런 점에서 음미해야 할 문제이다. 그가 어째서「눈」을 쓰고 \'만세! 만세!\'를 외쳤겠는가. 그는 답한다. \'나는 언어에 밀착했다.\'고. 그가 어째서「美人」을 쓰고 \'됐다! 이 작품은 합격이다.\'며 환호했겠는가. 그는 인용으로 답한다. \"우리들의 입의 입김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세계의 繪畵가 되고, 우리들의 사상과 감정의 기본형이 된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한 줄기의 나풀거리는 산들바람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神的인 입김이 우리들의 신변에서 일지 않고 마법의 음색처럼 우리들의 입술 위에 감돌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필경 모두가 아직도 숲속을 뛰어 다니는 동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수영, 「반시론」(1968), 『전집 2』, p.262.
4. 맺음말
김윤식은 그의 산문이 \'경박하고 날카로운\' 양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김수영의 산문 행위는 시에서 받는 유교적 근본주의의 무게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행위였다고 할 만하다.
김윤식, 「김수영 변증법의 표정」, 『전집 3』, 민음사, p.298.
그것은 화해라기보다는 시와 산문의 싸움 같이 여겨진다. 근대주의의 솔직한 고민이 산문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이와 유사하게 읽는다. 그러나 산문에는 좀처럼 쓰지 않는 한자어들을 시 속에 깔아 두는 시인의 \'의도적 농락\'을 간단없이 넘길 수 있을까.
어쩌면「거대한 뿌리」의 반동적인 발언이 은근슬쩍 흘려놓은 진의를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김수영은 근대성을 미래파적인 관점에서는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관점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은 의식적인 것이고, 그렇게해서 그가 얻은 근대주의로는 유감스럽게도 성공작을 얻지 못한 듯 보인다.「풀」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성공작이라 평하는 작품인데, 그가 필경「孟子」를 참조하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풀을 누이는 것을 백성의 교화에 대한 비유로 삼은 유교 경전과 너무 닮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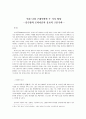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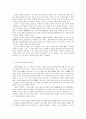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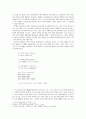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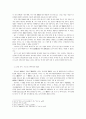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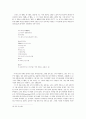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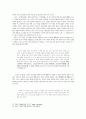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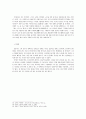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