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경제력 집중에 관한 고찰
1. 경제력 집중
2.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3. 경제력 집중의 원인
III. 한국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영구조의 분석
1. 한국재벌 소유구조의 분석
2. 한국재벌 조직구조의 분석-I
3. 한국재벌 조직구조의 분석-II
4. 재벌성장의 역사적 고찰
IV. 결론
II. 경제력 집중에 관한 고찰
1. 경제력 집중
2.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3. 경제력 집중의 원인
III. 한국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영구조의 분석
1. 한국재벌 소유구조의 분석
2. 한국재벌 조직구조의 분석-I
3. 한국재벌 조직구조의 분석-II
4. 재벌성장의 역사적 고찰
IV. 결론
본문내용
)
}}{{기타 3대그룹소계
}}{{ 13.53
(13.26)
}}{{ 8.93
(10.68)
}}{{ 8.40
(8.17)
}}{{ 10.74
(10.15)
}}{{ 13.61
(14.97)
}}{{ 3.08
(3.66)
}}{{ 전기업 합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들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1년 현재 6개의 기업집단에
소속해 있는 기업의 총 수는 11,982개로서 일본 전체 기업중에 70%를 차지하
며, 이들은 일본 전체의 법인 기업 총 자산 중 70%를,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28%를 점유하였다.
니시야마(西山)(1980)의 논문에 의하면 기업집단의 개념에서 벗어난 입장에
서 오늘날의 일본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현대 일본기
업의 소유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8년 일본 최대 금융회사 중에서 78
개 회사를 선정하여 이들의 주식소유를 조사하였다. 니시야마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 대기업의 대주주는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
관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의한 지분이 75% 이상을 나타낸 것은 전체기업
의 78개 기업 중 61개에 달하였으며, 100% 금융기관 점유의 기업 수도 12개
나 되었다. 금융기관의 지분이 50%이하의 기업수는 8개에 지나지 않았다. 한
편 일본 대기업의 대주주인 은행의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는 다시
일본 최대 은행들의 최대주주는 생명보험회사와 그 기업에 소속된 구성회사
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니시야마의 설명은 오늘날 일본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의 주
장대로 오늘날 일본의 대기업의 지배자들을 전문 경영자라고 할 때, 그리고
일본의 법인 주주들이 채권자로서의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할 때, 전
문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의 미약한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
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경영자에 의한 손실은 거의 무
시될 정도로 미약하다. 일본에서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의 예를 찾는다
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잠재적 영향력 및 예금 예약자나 보험 계약자를 보
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규제\'를 들 수 있을 뿐이다.
4. 한·일 재벌의 차이점{{)강철규 외, op.cit., pp.69∼71.
}}
한국재벌과 일본재벌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각 기업의 특성도 같은 것은
아니다. 한·일 재벌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것이 < 표-5 >에 요약되어 있다.
< 표-5 한국재벌과 일본재벌과의 비교 >
먼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정도를 보면, 87년 한국의 5대 재벌이 광
공업부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이고 일본의 6대 기업집단이 비
금융기업 매출액의 25.2%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이 매우 유사한 상황
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재벌소속 기업들이 각기 자신의 시장에서 비교적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고, 대표적인 대기업의 많은 수가 재벌소속 기업
이라는 점까지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력 집중의 정도가 지표상으로
유사하지만 그 소유구조와 경영방식은 매우 다르다.
일본의 기업집단의 사장회 회원사들은 서로간에 상당히 독립성을 유지하면
서 느슨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계열기업들이 총수의 지시하에 일사불
란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재벌기업에 비해 그들이 개별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
는 총체적 복합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6대 기업집단들이 유사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그나마의 총체적 복
합력도 기업집단간의 견제로 인해 더욱 약화될 소지가 많다. 반면에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재벌소속 기업들이 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
위를 점하는 동시에 다른 재벌소속 기업들과는 거의 경쟁이 없는 상태이므로
재벌의 총체적 복합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소유형태면을 보면, 戰前의 재벌은 한국의 재벌처럼 재벌가족이 실질적
대주주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현대 일본의 기업집단은 완전히 다르다. 즉
일본의 기업집단은 상층부의 사장회 회원사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대주주가 없으며, 굳이 주인을 찾는다면 바로 기업 자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일본의 일부학자들은 일본을 \'법인 자본
주의\'(法人資本主義)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혈연에 의해 기업을
승계시키는 이른바 \'족벌자본주의\'(族閥資本主義)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
국 일본의 기업집단에게는 경제력은 집중되어 있지만 소유는 분산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재벌에게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측면에 더하여 소유까지도 특정
의 개인 및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비록 일본의 기업집단이 그 규모나 경제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한국의 재벌에 결코 뒤지지 않지만 국민들의 지탄은
덜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경영형태면에서 한국의 재벌은 재벌총수가 경영까지도 장악하
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소유구조가 비슷한 전전의 재벌에서도 경영은 전
문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전후의 기업
집단에서는 사장회 회원사들의 경영은 사실상 사장을 정점으로 한 사원집단
에 백지위임되어 있고, 기업의 임원들도 대부분 내부승진자들이다. 따라서 경
영도 한국과 같이 재벌총수가 그룹총괄기구의 도움을 받아 산하 계열기업을
중앙집권적이고 상의하달식(上意下達式)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전문경영인들에 의해 분권적이고 하의상달식(下意上達式)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중 어느 쪽이 사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기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적합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물론
기업집단에서도 하부의 기업그룹에서는 친회사가 자(손)회사를 강력히 통제한
다. 그러나 이들도 친회사의 본업과 수평적 혹은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기
업으로서, 아무 관련이 없는 분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한국재벌과는 차
이가 있다.
}}{{기타 3대그룹소계
}}{{ 13.53
(13.26)
}}{{ 8.93
(10.68)
}}{{ 8.40
(8.17)
}}{{ 10.74
(10.15)
}}{{ 13.61
(14.97)
}}{{ 3.08
(3.66)
}}{{ 전기업 합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들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1년 현재 6개의 기업집단에
소속해 있는 기업의 총 수는 11,982개로서 일본 전체 기업중에 70%를 차지하
며, 이들은 일본 전체의 법인 기업 총 자산 중 70%를,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28%를 점유하였다.
니시야마(西山)(1980)의 논문에 의하면 기업집단의 개념에서 벗어난 입장에
서 오늘날의 일본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현대 일본기
업의 소유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8년 일본 최대 금융회사 중에서 78
개 회사를 선정하여 이들의 주식소유를 조사하였다. 니시야마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 대기업의 대주주는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
관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의한 지분이 75% 이상을 나타낸 것은 전체기업
의 78개 기업 중 61개에 달하였으며, 100% 금융기관 점유의 기업 수도 12개
나 되었다. 금융기관의 지분이 50%이하의 기업수는 8개에 지나지 않았다. 한
편 일본 대기업의 대주주인 은행의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는 다시
일본 최대 은행들의 최대주주는 생명보험회사와 그 기업에 소속된 구성회사
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니시야마의 설명은 오늘날 일본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의 주
장대로 오늘날 일본의 대기업의 지배자들을 전문 경영자라고 할 때, 그리고
일본의 법인 주주들이 채권자로서의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할 때, 전
문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의 미약한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
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경영자에 의한 손실은 거의 무
시될 정도로 미약하다. 일본에서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의 예를 찾는다
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잠재적 영향력 및 예금 예약자나 보험 계약자를 보
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규제\'를 들 수 있을 뿐이다.
4. 한·일 재벌의 차이점{{)강철규 외, op.cit., pp.69∼71.
}}
한국재벌과 일본재벌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각 기업의 특성도 같은 것은
아니다. 한·일 재벌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것이 < 표-5 >에 요약되어 있다.
< 표-5 한국재벌과 일본재벌과의 비교 >
먼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정도를 보면, 87년 한국의 5대 재벌이 광
공업부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이고 일본의 6대 기업집단이 비
금융기업 매출액의 25.2%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이 매우 유사한 상황
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재벌소속 기업들이 각기 자신의 시장에서 비교적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고, 대표적인 대기업의 많은 수가 재벌소속 기업
이라는 점까지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력 집중의 정도가 지표상으로
유사하지만 그 소유구조와 경영방식은 매우 다르다.
일본의 기업집단의 사장회 회원사들은 서로간에 상당히 독립성을 유지하면
서 느슨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계열기업들이 총수의 지시하에 일사불
란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재벌기업에 비해 그들이 개별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
는 총체적 복합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6대 기업집단들이 유사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그나마의 총체적 복
합력도 기업집단간의 견제로 인해 더욱 약화될 소지가 많다. 반면에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재벌소속 기업들이 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
위를 점하는 동시에 다른 재벌소속 기업들과는 거의 경쟁이 없는 상태이므로
재벌의 총체적 복합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소유형태면을 보면, 戰前의 재벌은 한국의 재벌처럼 재벌가족이 실질적
대주주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현대 일본의 기업집단은 완전히 다르다. 즉
일본의 기업집단은 상층부의 사장회 회원사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대주주가 없으며, 굳이 주인을 찾는다면 바로 기업 자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일본의 일부학자들은 일본을 \'법인 자본
주의\'(法人資本主義)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혈연에 의해 기업을
승계시키는 이른바 \'족벌자본주의\'(族閥資本主義)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
국 일본의 기업집단에게는 경제력은 집중되어 있지만 소유는 분산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재벌에게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측면에 더하여 소유까지도 특정
의 개인 및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비록 일본의 기업집단이 그 규모나 경제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한국의 재벌에 결코 뒤지지 않지만 국민들의 지탄은
덜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경영형태면에서 한국의 재벌은 재벌총수가 경영까지도 장악하
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소유구조가 비슷한 전전의 재벌에서도 경영은 전
문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전후의 기업
집단에서는 사장회 회원사들의 경영은 사실상 사장을 정점으로 한 사원집단
에 백지위임되어 있고, 기업의 임원들도 대부분 내부승진자들이다. 따라서 경
영도 한국과 같이 재벌총수가 그룹총괄기구의 도움을 받아 산하 계열기업을
중앙집권적이고 상의하달식(上意下達式)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전문경영인들에 의해 분권적이고 하의상달식(下意上達式)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중 어느 쪽이 사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기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적합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물론
기업집단에서도 하부의 기업그룹에서는 친회사가 자(손)회사를 강력히 통제한
다. 그러나 이들도 친회사의 본업과 수평적 혹은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기
업으로서, 아무 관련이 없는 분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한국재벌과는 차
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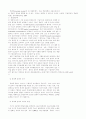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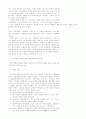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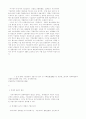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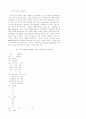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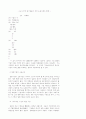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