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쳤다. 전통적 과학관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서로 대립적이어서 어느 편이 발전하거나 득세하면 다른 편은 쇠퇴하
거나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쿤은 과학이 형이상학이나 신념을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들의 역할에 의해서 과학적 탐구가 수행된다고 주장함으로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즉, 과학과 신앙은 동등한 차원에서 영역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전제와 실제적 활동이라는 상하위 차원에서 상호 협조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과학도 형이상학이나 신념 등을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기독교적 신앙의 전제 위에서 과학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과학혁명의 구조>를 과제물로 부여받고는 이것이 만만찮은 상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실제로 책을 읽어가면서는 그 느낌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에 임마뉴엘 윌러스틴의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나 일리야 프리고진, 이사벨 스텐저스가 지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읽을 때-아직까지 다 읽지 못했다-처럼 보잘 것 없는 나의 지식을 실감하게 되었다. 비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앞의 세 권의 내용들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과거 역사-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미래에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는 각각의 태도와 관계 있는 것 같다.
이 주제-과거, 현재, 미래-가 앞으로 반드시 내 나름대로 결론지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하니 흥미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생긴다.
거나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쿤은 과학이 형이상학이나 신념을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들의 역할에 의해서 과학적 탐구가 수행된다고 주장함으로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즉, 과학과 신앙은 동등한 차원에서 영역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전제와 실제적 활동이라는 상하위 차원에서 상호 협조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과학도 형이상학이나 신념 등을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기독교적 신앙의 전제 위에서 과학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과학혁명의 구조>를 과제물로 부여받고는 이것이 만만찮은 상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실제로 책을 읽어가면서는 그 느낌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에 임마뉴엘 윌러스틴의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나 일리야 프리고진, 이사벨 스텐저스가 지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읽을 때-아직까지 다 읽지 못했다-처럼 보잘 것 없는 나의 지식을 실감하게 되었다. 비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앞의 세 권의 내용들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과거 역사-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미래에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는 각각의 태도와 관계 있는 것 같다.
이 주제-과거, 현재, 미래-가 앞으로 반드시 내 나름대로 결론지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하니 흥미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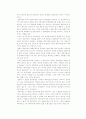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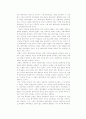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