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행자의 요가의 인식론적 구조
2. 수행자의 요가에 관한 논쟁
Ⅲ. 결론
Ⅱ. 본론
1. 수행자의 요가의 인식론적 구조
2. 수행자의 요가에 관한 논쟁
Ⅲ. 결론
본문내용
am nak lasa bandha) 등]에 의해서는 아니다.
) PVBh 112,1-9. 또한 岩田孝(1986): 359를 참조.
부처님께서 법을 펴신 이래 불교에서는 무아설을 주창하여 사물의 실체(dravya)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불교 논사들이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가 되었다. 불교 쁘라마나학파에서는 아비다르마의 공능(k ritra)의 개념을 계승 발전시켜 존재를 인과효력(arthakriy s marthya)으로 정의한다. 이 개념은 존재란 작용으로 결과를 생산함을 의미한다. 위의 쁘라쥬나의 해석에 의하면 대상이 인식자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됨이다. 따라서 불교 쁘라마나학파에서 이해하는 존재한다는 것은 니야야학파나 미맘사학파의 논사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이 현재의 시간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허망하지 않은 것(avisa v dana)\'으로 인식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쁘라쥬나는 수행자에 의한 \'과거나 미래의 지각을 \'현재에 인식되지 않고 있는 대상의 지각\'으로 바꾸어 분석한다.
) 참조 岩田孝(1986): 359-358.
그러나 여기서 \'현재에 인식되고 있지 않은 대상\' 이란 수습을 행하고 있는 수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상 일반사람들에게 해당된다.
) 참조 PVBh 113,7-8: tasm d at t di pa yat ti ko \'rtha . anyen d yam na pa yati d yam natay vartam nam eva t vat tad iti na do a .
그 이유는 이미 앞서서 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과거나 미래에 존재하는 것도 수행자에게는 수습의 가행, 변제를 통해 현 순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즉, 수행자와 일반사람의 시간개념이 서로 다르다. 수행자는 일반사람과는 달리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나 미래의 대상을 현재에 지각한다.
)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수행자가 공간을 초월하여 인식하는 것도 시간을 초월하여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행자의 증지는 현존하지 않는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착오가 아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요가수행자의 증지에 대해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수행자의 증지는 교설인 아가마(Agama)에 의존하지 않고, 지와 관의 수습을 통해서 생기는 것으로 가행→변제→현량의 단계를 거친다.
2) 증지는 불교 쁘라마나학파에서의 존재의 두 가지 분류 중, 찰나(k a a)의 입장에서는 점진적인 수행에 기반을 둔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sant na)의 입장에서는 점진적 수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3) 수행자의 증지가 현량이 되는 이유는 무분별성과 무착오성을 만족시키는데 있다. 무분별성의 토대는 지의 선명현현(spa atva)이며, 무착오성의 근거는 지의 무허망성(avisa v danatva)이다.
4) 위의 사실을 통해 볼 때, 불교 쁘라마나학파의 수행자의 증지도 선가의 근본종지인 교외별전, 불립문자 등과 그 의미가 상통함을 알 수 있다.
) PVBh 112,1-9. 또한 岩田孝(1986): 359를 참조.
부처님께서 법을 펴신 이래 불교에서는 무아설을 주창하여 사물의 실체(dravya)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불교 논사들이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가 되었다. 불교 쁘라마나학파에서는 아비다르마의 공능(k ritra)의 개념을 계승 발전시켜 존재를 인과효력(arthakriy s marthya)으로 정의한다. 이 개념은 존재란 작용으로 결과를 생산함을 의미한다. 위의 쁘라쥬나의 해석에 의하면 대상이 인식자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됨이다. 따라서 불교 쁘라마나학파에서 이해하는 존재한다는 것은 니야야학파나 미맘사학파의 논사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이 현재의 시간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허망하지 않은 것(avisa v dana)\'으로 인식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쁘라쥬나는 수행자에 의한 \'과거나 미래의 지각을 \'현재에 인식되지 않고 있는 대상의 지각\'으로 바꾸어 분석한다.
) 참조 岩田孝(1986): 359-358.
그러나 여기서 \'현재에 인식되고 있지 않은 대상\' 이란 수습을 행하고 있는 수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상 일반사람들에게 해당된다.
) 참조 PVBh 113,7-8: tasm d at t di pa yat ti ko \'rtha . anyen d yam na pa yati d yam natay vartam nam eva t vat tad iti na do a .
그 이유는 이미 앞서서 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과거나 미래에 존재하는 것도 수행자에게는 수습의 가행, 변제를 통해 현 순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즉, 수행자와 일반사람의 시간개념이 서로 다르다. 수행자는 일반사람과는 달리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나 미래의 대상을 현재에 지각한다.
)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수행자가 공간을 초월하여 인식하는 것도 시간을 초월하여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행자의 증지는 현존하지 않는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착오가 아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요가수행자의 증지에 대해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수행자의 증지는 교설인 아가마(Agama)에 의존하지 않고, 지와 관의 수습을 통해서 생기는 것으로 가행→변제→현량의 단계를 거친다.
2) 증지는 불교 쁘라마나학파에서의 존재의 두 가지 분류 중, 찰나(k a a)의 입장에서는 점진적인 수행에 기반을 둔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sant na)의 입장에서는 점진적 수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3) 수행자의 증지가 현량이 되는 이유는 무분별성과 무착오성을 만족시키는데 있다. 무분별성의 토대는 지의 선명현현(spa atva)이며, 무착오성의 근거는 지의 무허망성(avisa v danatva)이다.
4) 위의 사실을 통해 볼 때, 불교 쁘라마나학파의 수행자의 증지도 선가의 근본종지인 교외별전, 불립문자 등과 그 의미가 상통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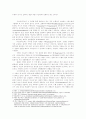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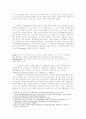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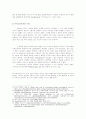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