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송대 임제종
1) 비판의 배경
3. 종밀 비판
1) 종밀의 사종선 분류와 홍주종 비판
2) 송대 임제종의 하택종 비판
4. 맺는말
2.송대 임제종
1) 비판의 배경
3. 종밀 비판
1) 종밀의 사종선 분류와 홍주종 비판
2) 송대 임제종의 하택종 비판
4. 맺는말
본문내용
대변하는 이심전심이나 불입문자 같은 구절들은 당대의 문헌에서 쉬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선종의 사상을 대변하는 \'교외별전 불입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란 사구의 모토는 당대에 확립된 것이 아니라, 송대 임제종 특히 황룡파에 의해서 완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임제종의 양기파에서도 황룡파의 종밀비판을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환오극근은 어느 날 상당법문에서 신회대 회양의 대립구도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사(혜능)는 말하였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덮는다. 항상 동용 가운데 있지만, 그 동용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서 \'본원의 불성이 현현함이라\'고 함은 지해종도요,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고 함도 역시 삼계의 길목을 벗어나기 힘들다.
) 『 悟佛果禪師語錄』(大正藏47, 729下), \"若能各各返照內觀 卽坐自己家堂 所以祖師道 有一物 上柱天 下柱地 常在動用中 動用中收不得 謂之本源佛性顯成知解宗徒 更云說似一物卽不中 亦不免涉三寸路\"
여기서 언급한 신회와 회양의 양자구도를 알리는 부분은 <이것을 일러서 \'본원의 불성이 현현함\'이라고 함은 지해종도요,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고 함도 역시 삼계의 길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한 부분이다. 전자는 신회를 가리키고, 후자는 회양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물건>에 대한 대립되는 양자를 모두 함께 부정하고, 문제 자체를 해소하고 말없는 세계로 \'직입\'하게 한다. 이점은 분명하게 황룡파와는 또 다른 인식의 변화이다. 신회를 비판하고 회양의 입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함께 물리치는 극단이다. 이런 모습은 환오뿐만 아니라 대혜에게서도 발견된다.
남천은 도란 지에도 불지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규봉이 말하는 영지는 하택이 말한 \'지 한 글자가 중묘의 문이라\'고 한 것이다. 황룡사심은 \'지 한 글자는 중과의 문이다\'라고 말한다. 규봉과 하택의 길은 쉽고, 황룡의 길은 어렵게 보인다. 이 속에서 양자를 뛰어난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자기가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오선사는 말하였다. 조주선이 다만 입술 위에 있다면, 무엇이 어렵겠는가? 병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해진 길(양행)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초까지도 양식으로 삼는다.
) 『大慧普覺禪師普說』(大正藏47, 879b), \"若眞達不疑之道 猶如太虛廓然蕩豁 豈可於中彊是非耶.趙州於言下千了百當 南泉道不屬知 不屬不知 圭峰謂之靈知 荷澤謂之知之一字衆妙之門 黃龍死心云 知之一字衆禍之門 要見圭峰荷澤則易 要見死心則難 到這裏須是具超方眼 說似人不得 傳與人不得 所以 悟先師說 趙州禪只在口脣皮上 難奈他何 如善用兵者 不齎糧行 就爾水草糧食\"
신회와 종밀의 \'지\'는 온갖 묘함(중묘)의 문이다. 왜냐하면 지를 통해서 자성용과 수연용이 표출되고, 선교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대 임제종의 황룡파에서 보면, 지는 지해의 분별이요, 그래서 온갖 재난의 길(중화지문)인 것이다. 그러나 대혜는 신회와 종밀의 입장과 이를 비판하고 회양을 옹립하는 황룡파의 입장, 모두에서 벗어난 안목을 갖추도록 요청한다. 이점은 분명하게 북송의 황룡파와는 다른 시각으로, 교외별전에 의한 사자상승의 선명성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남송 양기파의 인식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양기파에 의해서 성립된, 간화선사상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4. 맺는 말
종밀의 화엄철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 하나는 법통문제를 중심으로 한 선종사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문제이다.
종밀의 선종사의 인식은 철저하게 하택신회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자상승의 전통은 일인에게 적용되었는데 제칠조에까지 적용되며, 그는 바로 혜능의 지시에 의해서 북쪽에서 남종을 선양한 신회라는 주장을 한다. 이점에 대해서 각범은 신회를 옹립하려는 종밀의 주장일 뿐이고, 진실한 혜능의 계승자는 회양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혜능을 육조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신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된 전의설은 선종사의 이해에 따라서 이후 계속적인 변천을 겪는다. 그 변화는 세 가지인데, 종밀 이전에는 대체로 육대까지 가사가 전승되지만, 종밀은 신회를 염두에 두고서 칠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송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경덕전등록』이나 덕이본『단경』과 같은 선종사서들은 다만 가사를 육대까지만 전승되고 그 이후에는 전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혜능 이후 신회를 칠대로 옹립하는 종밀의 견해에 대한 부정을 비판인 것이다.
다음으로 종밀은 불변과 수연이라는 화엄적인 심성론에 입각하여, 초기 선종의 제파를 사종선으로 분류하여 하택종의 원만성을 입증하려한다. 그는 특히 홍주종의 심성론과 수증론이 가지는 한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심성론에서는 자성용을 부인하고, 수연용만을 인정한 점이나, 수증론에서 사회 참여적이고 윤리적인 강점이 있는 점수의 길을 봉쇄하고, 초월만을 강조하는 돈오만을 주장한 점을 힐난하였다.
그러나 각범을 비롯한 송대 임제종은 종밀의 선교일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교외별전의 교의를 확립시켰다고 보여진다. 먼저 사종선의 분류는 현실적인 객관성보다는 종밀의 분류방식에 꿰맞추는 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마조는 결코 자성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며, 수연용에 결코 윤리적인 측면이 무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종밀의 지일자는 회통철학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은 분별이고 온갖 재난의 문이라고 혹평한다. 왜냐하면 지로서는 참다운 교외별전의 입장에 계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혜능의 문답에서 보여주는 신회의 입장은 \'도를 가볍고 쉽게\' 처리한 지해종도의 길이라고 금지한다.
이런 송대 임제종의 종밀비판은 결국은 송대 선종의 특징인 불입문자 교외별전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점은 멀게는 간화선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종밀이 그랬듯이 역시 객관적인 이해이기보다는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선사상이 형성되면서 야기되는 종파적 견해가 크게 작용한 측면도 있음도 지적할 수 있겠다.
한편 임제종의 양기파에서도 황룡파의 종밀비판을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환오극근은 어느 날 상당법문에서 신회대 회양의 대립구도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사(혜능)는 말하였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덮는다. 항상 동용 가운데 있지만, 그 동용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서 \'본원의 불성이 현현함이라\'고 함은 지해종도요,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고 함도 역시 삼계의 길목을 벗어나기 힘들다.
) 『 悟佛果禪師語錄』(大正藏47, 729下), \"若能各各返照內觀 卽坐自己家堂 所以祖師道 有一物 上柱天 下柱地 常在動用中 動用中收不得 謂之本源佛性顯成知解宗徒 更云說似一物卽不中 亦不免涉三寸路\"
여기서 언급한 신회와 회양의 양자구도를 알리는 부분은 <이것을 일러서 \'본원의 불성이 현현함\'이라고 함은 지해종도요,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고 함도 역시 삼계의 길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한 부분이다. 전자는 신회를 가리키고, 후자는 회양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물건>에 대한 대립되는 양자를 모두 함께 부정하고, 문제 자체를 해소하고 말없는 세계로 \'직입\'하게 한다. 이점은 분명하게 황룡파와는 또 다른 인식의 변화이다. 신회를 비판하고 회양의 입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함께 물리치는 극단이다. 이런 모습은 환오뿐만 아니라 대혜에게서도 발견된다.
남천은 도란 지에도 불지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규봉이 말하는 영지는 하택이 말한 \'지 한 글자가 중묘의 문이라\'고 한 것이다. 황룡사심은 \'지 한 글자는 중과의 문이다\'라고 말한다. 규봉과 하택의 길은 쉽고, 황룡의 길은 어렵게 보인다. 이 속에서 양자를 뛰어난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자기가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오선사는 말하였다. 조주선이 다만 입술 위에 있다면, 무엇이 어렵겠는가? 병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해진 길(양행)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초까지도 양식으로 삼는다.
) 『大慧普覺禪師普說』(大正藏47, 879b), \"若眞達不疑之道 猶如太虛廓然蕩豁 豈可於中彊是非耶.趙州於言下千了百當 南泉道不屬知 不屬不知 圭峰謂之靈知 荷澤謂之知之一字衆妙之門 黃龍死心云 知之一字衆禍之門 要見圭峰荷澤則易 要見死心則難 到這裏須是具超方眼 說似人不得 傳與人不得 所以 悟先師說 趙州禪只在口脣皮上 難奈他何 如善用兵者 不齎糧行 就爾水草糧食\"
신회와 종밀의 \'지\'는 온갖 묘함(중묘)의 문이다. 왜냐하면 지를 통해서 자성용과 수연용이 표출되고, 선교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대 임제종의 황룡파에서 보면, 지는 지해의 분별이요, 그래서 온갖 재난의 길(중화지문)인 것이다. 그러나 대혜는 신회와 종밀의 입장과 이를 비판하고 회양을 옹립하는 황룡파의 입장, 모두에서 벗어난 안목을 갖추도록 요청한다. 이점은 분명하게 북송의 황룡파와는 다른 시각으로, 교외별전에 의한 사자상승의 선명성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남송 양기파의 인식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양기파에 의해서 성립된, 간화선사상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4. 맺는 말
종밀의 화엄철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 하나는 법통문제를 중심으로 한 선종사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문제이다.
종밀의 선종사의 인식은 철저하게 하택신회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자상승의 전통은 일인에게 적용되었는데 제칠조에까지 적용되며, 그는 바로 혜능의 지시에 의해서 북쪽에서 남종을 선양한 신회라는 주장을 한다. 이점에 대해서 각범은 신회를 옹립하려는 종밀의 주장일 뿐이고, 진실한 혜능의 계승자는 회양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혜능을 육조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신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된 전의설은 선종사의 이해에 따라서 이후 계속적인 변천을 겪는다. 그 변화는 세 가지인데, 종밀 이전에는 대체로 육대까지 가사가 전승되지만, 종밀은 신회를 염두에 두고서 칠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송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경덕전등록』이나 덕이본『단경』과 같은 선종사서들은 다만 가사를 육대까지만 전승되고 그 이후에는 전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혜능 이후 신회를 칠대로 옹립하는 종밀의 견해에 대한 부정을 비판인 것이다.
다음으로 종밀은 불변과 수연이라는 화엄적인 심성론에 입각하여, 초기 선종의 제파를 사종선으로 분류하여 하택종의 원만성을 입증하려한다. 그는 특히 홍주종의 심성론과 수증론이 가지는 한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심성론에서는 자성용을 부인하고, 수연용만을 인정한 점이나, 수증론에서 사회 참여적이고 윤리적인 강점이 있는 점수의 길을 봉쇄하고, 초월만을 강조하는 돈오만을 주장한 점을 힐난하였다.
그러나 각범을 비롯한 송대 임제종은 종밀의 선교일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교외별전의 교의를 확립시켰다고 보여진다. 먼저 사종선의 분류는 현실적인 객관성보다는 종밀의 분류방식에 꿰맞추는 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마조는 결코 자성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며, 수연용에 결코 윤리적인 측면이 무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종밀의 지일자는 회통철학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은 분별이고 온갖 재난의 문이라고 혹평한다. 왜냐하면 지로서는 참다운 교외별전의 입장에 계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혜능의 문답에서 보여주는 신회의 입장은 \'도를 가볍고 쉽게\' 처리한 지해종도의 길이라고 금지한다.
이런 송대 임제종의 종밀비판은 결국은 송대 선종의 특징인 불입문자 교외별전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점은 멀게는 간화선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종밀이 그랬듯이 역시 객관적인 이해이기보다는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선사상이 형성되면서 야기되는 종파적 견해가 크게 작용한 측면도 있음도 지적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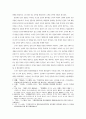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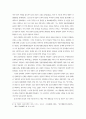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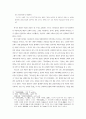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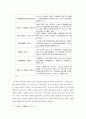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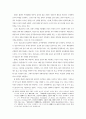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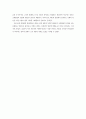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