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Ⅱ. 『어록』에 나타난 `반야`와 관련된 어구의 고찰
1) 반야에 의한 입론
2) 정혜등학
3) 심불기, 염불기
4) 무념, 무주심
Ⅲ. 신회의 반야에 의한 선사상의 특질
Ⅳ. 결어
Ⅱ. 『어록』에 나타난 `반야`와 관련된 어구의 고찰
1) 반야에 의한 입론
2) 정혜등학
3) 심불기, 염불기
4) 무념, 무주심
Ⅲ. 신회의 반야에 의한 선사상의 특질
Ⅳ. 결어
본문내용
는 중도 또한 사라지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무념은 곧 일념이고, 일념은 바로 일절지이다. 일절지는 바로 깊고 깊은 반야파나밀이다. 반야파나밀은 바로 여래선이다. …… 내가 여래를 관하니, 전제가 오지 않고, 후제도 가지 않는다. 지금 이미 머뭄이 없고[무주], 머뭄이 없으므로 곧 여래선이다. 여래선이란 바로 제일의공이니, 이와 같은 것이다.
) 『南陽和尙問答雜徵義』, 石井本, p.79.
\"有無雙遣中道亦亡者, 卽是無念. 無念卽是一念, 一念卽是一切智. 一切智卽是甚深般若波羅蜜. 般若波羅蜜卽是如來禪. …… 我觀如來, 前際不來, 后際不去, 今旣無住, 以無住故, 卽如來禪. 如來禪者, 卽是第一義空, 爲如此也.\"
\'무념\'은 바로 \'반야\'의 \'중도\'보다도 더욱 \'반야공관\'에 철저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일체지\'이며, 깊고 깊은 \'반야파나밀\'로서 그에 의하여 설한 선법은 \'여래선\'이라고 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회선사에 의한 \'여래선\'의 제시는 선종사와 선의 분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본고의 주제를 넘는 까닭에 언급을 생략하여 다른 연구에 맡기기로 하겠다.
Ⅲ. 신회선사의 \"반야\"에 의한 선사상의 특질
이상의 신회선사의 『어록』에 있어서 \'반야\'의 이해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우선 신회선사는 철저하게 \'반야\'를 통하여 그의 선사상을 입론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는 \'무상보제\'를 발심할 것을 강조하고, 이 \'무상보제\'가 불과의 정인과 정연을 이루는데 관건임을 설하고 있다. 나아가 선사는 다시 이러한 \'반야(반야파라밀)\'로부터 \'법화\'의 \'일불승\', 나아가서 전체적인 불교의 교의를 포괄하려는 의도까지도 보이고 있다. 선사는 \'무상보제\'의 발심에 의한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중도의 \'제일의체\'임을 밝히고, \'반야파라밀\'의 수행이 바로 제불여래의 출처라고 단정한다. 이러한 입론은 선사의 \'정혜등학[정혜쌍수]\', \'심불기\' 및 \'염불기\', \'무념\' 및 \'무주\'의 세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념\'에 의한 \'여래선\'의 제시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정혜등학\'에 있어서 신회선사는 계 정 혜 삼학을 \'삼학등지\'로 설하고, 그를 다시 계와 정을 하나로 묶어 \'정\'과 \'혜\'로 함축시키고, 또한 \'정혜등학\'으로 귀결시킨다. 선사는 다시 \'정혜등학\'의 수행적인 관점으로부터의 당연한 귀결인 \'정혜쌍수\'를 설하고,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직입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둘째, 이렇게 \'정혜등학\', \'정혜쌍수\'를 표방한 신회선사는 다시 \'정\'의 핵심으로서 \'심불기\', \'염불기\'를 설한다. 선사는 \'심불기\'를 \'정\'의 요추로서 설하는데, \'상\'의 근원을 바로 \'마음의 일어남[심기]\'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부정인 \'심불기\'를 \'소상\'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선사는 보다 세세하게 \'염불기\'를 설하는데, 그는 \'심불기\'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염불기\', \'심불기\'는 자연스럽게 \'무념\', \'무주(심)\'로 귀납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무념\', \'무주\'는 바로 신회선사의 종지이다. 선사의 \'무념\'은 \'불이법\'과 \'진여\'로서 설명되고, 그는 어의적인 \'생각[염]이 없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야파나밀\'과 같은 것이며, \'일행삼매\'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선사는 \'무념\'을 바로 \'실상\', \'제일의체[제법성공]\'와 같은 것으로 설하여 \'무념\'을 단순한 하나의 선법이 아니라 그대로 제법이 존재하는 근거로까지 격상시키고 있음이 추론된다. 선사는 무념을 보는 것은 곧 성을 보는 것[견성]이요, 그것은 바로 \'돈오해탈\'이라는 것이라고 설하고, 최종적으로 \'반야\'의 \'중도\'에 의하여 설한 선법은 \'여래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앞에서 『어록』을 통하여 살펴본 \'반야\'와 관련된 신회의 선사상의 특질인데, 이로부터 선사의 선사상은 철저한 \'반야\'사상의 홍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사의 선사상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상적 주류가 흠뻑 배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열반경』에 의한 \'불성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반불성론\'이다. \"일일신구유불성\", \"중생심중각유불성\", \"자신중유불성\" 등등 선사의 『어록』 도처에 \'불성론\'과 관련이 있는 문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신회선사의 선사상, 나아가 전체적인 중국선은 \'반야\'와 \'열반불성론\'의 철저한 화회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불성론의 발전, 즉 양무제의 \'진신론\'과 여산 혜원의 \'법성론\'을 거쳐 도생의 \'돈오성불론\'으로 성립되고, 다시 열반사들과 『대승기신론』에 의한 \'여래장\'사상이 부가되어 나타난 \'불성론\'의 과정이 없었다면 중국선과 선종의 출현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신회선사의 \'반야\'사상과의 관계를 그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Ⅳ. 결어
신회선사는 사실상 \'조사선\'의 홍양자라고 할 수 있다. 신회선사를 배제하고서 조사선의 흥성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선사의 \'반야\'에 의한 선사상은 규봉 종밀과 함께 \'지해종도\'로 조사선에서 비판되고, 또한 \'여래선\'으로 분류되지만, 신회선사의 활대 \'무차대회\'를 통한 혜능의 남종을 위한 정통성 논쟁은 결국 조사선이 발흥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신회선사의 \'반야\'를 중심으로 한 선사상은 이후 등장하는 조사선의 활달한 선풍에 그 내재적 성립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사의 선사상은 도신, 홍인의 양대선사에 의하여 형성된 \'동산법문\'의 선법을 실질적으로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신선사의 \'수일불이\'와 홍인선사의 \'수본진심\' 역시 \'반야\'의 \'일행삼매\'가 성립의 논리적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종사적인 접근은 배제하고 다만 『어록』에 나타난 \'반야\'사상과의 관계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사는 전체적인 선사상을 \'반야\'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여래선\'의 제시로 귀결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선사를 선에 있어서 \'반야\'사상의 적극적인 유포자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南陽和尙問答雜徵義』, 石井本, p.79.
\"有無雙遣中道亦亡者, 卽是無念. 無念卽是一念, 一念卽是一切智. 一切智卽是甚深般若波羅蜜. 般若波羅蜜卽是如來禪. …… 我觀如來, 前際不來, 后際不去, 今旣無住, 以無住故, 卽如來禪. 如來禪者, 卽是第一義空, 爲如此也.\"
\'무념\'은 바로 \'반야\'의 \'중도\'보다도 더욱 \'반야공관\'에 철저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일체지\'이며, 깊고 깊은 \'반야파나밀\'로서 그에 의하여 설한 선법은 \'여래선\'이라고 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회선사에 의한 \'여래선\'의 제시는 선종사와 선의 분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본고의 주제를 넘는 까닭에 언급을 생략하여 다른 연구에 맡기기로 하겠다.
Ⅲ. 신회선사의 \"반야\"에 의한 선사상의 특질
이상의 신회선사의 『어록』에 있어서 \'반야\'의 이해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우선 신회선사는 철저하게 \'반야\'를 통하여 그의 선사상을 입론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는 \'무상보제\'를 발심할 것을 강조하고, 이 \'무상보제\'가 불과의 정인과 정연을 이루는데 관건임을 설하고 있다. 나아가 선사는 다시 이러한 \'반야(반야파라밀)\'로부터 \'법화\'의 \'일불승\', 나아가서 전체적인 불교의 교의를 포괄하려는 의도까지도 보이고 있다. 선사는 \'무상보제\'의 발심에 의한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중도의 \'제일의체\'임을 밝히고, \'반야파라밀\'의 수행이 바로 제불여래의 출처라고 단정한다. 이러한 입론은 선사의 \'정혜등학[정혜쌍수]\', \'심불기\' 및 \'염불기\', \'무념\' 및 \'무주\'의 세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념\'에 의한 \'여래선\'의 제시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정혜등학\'에 있어서 신회선사는 계 정 혜 삼학을 \'삼학등지\'로 설하고, 그를 다시 계와 정을 하나로 묶어 \'정\'과 \'혜\'로 함축시키고, 또한 \'정혜등학\'으로 귀결시킨다. 선사는 다시 \'정혜등학\'의 수행적인 관점으로부터의 당연한 귀결인 \'정혜쌍수\'를 설하고,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직입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둘째, 이렇게 \'정혜등학\', \'정혜쌍수\'를 표방한 신회선사는 다시 \'정\'의 핵심으로서 \'심불기\', \'염불기\'를 설한다. 선사는 \'심불기\'를 \'정\'의 요추로서 설하는데, \'상\'의 근원을 바로 \'마음의 일어남[심기]\'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부정인 \'심불기\'를 \'소상\'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선사는 보다 세세하게 \'염불기\'를 설하는데, 그는 \'심불기\'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염불기\', \'심불기\'는 자연스럽게 \'무념\', \'무주(심)\'로 귀납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무념\', \'무주\'는 바로 신회선사의 종지이다. 선사의 \'무념\'은 \'불이법\'과 \'진여\'로서 설명되고, 그는 어의적인 \'생각[염]이 없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야파나밀\'과 같은 것이며, \'일행삼매\'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선사는 \'무념\'을 바로 \'실상\', \'제일의체[제법성공]\'와 같은 것으로 설하여 \'무념\'을 단순한 하나의 선법이 아니라 그대로 제법이 존재하는 근거로까지 격상시키고 있음이 추론된다. 선사는 무념을 보는 것은 곧 성을 보는 것[견성]이요, 그것은 바로 \'돈오해탈\'이라는 것이라고 설하고, 최종적으로 \'반야\'의 \'중도\'에 의하여 설한 선법은 \'여래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앞에서 『어록』을 통하여 살펴본 \'반야\'와 관련된 신회의 선사상의 특질인데, 이로부터 선사의 선사상은 철저한 \'반야\'사상의 홍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사의 선사상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상적 주류가 흠뻑 배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열반경』에 의한 \'불성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반불성론\'이다. \"일일신구유불성\", \"중생심중각유불성\", \"자신중유불성\" 등등 선사의 『어록』 도처에 \'불성론\'과 관련이 있는 문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신회선사의 선사상, 나아가 전체적인 중국선은 \'반야\'와 \'열반불성론\'의 철저한 화회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불성론의 발전, 즉 양무제의 \'진신론\'과 여산 혜원의 \'법성론\'을 거쳐 도생의 \'돈오성불론\'으로 성립되고, 다시 열반사들과 『대승기신론』에 의한 \'여래장\'사상이 부가되어 나타난 \'불성론\'의 과정이 없었다면 중국선과 선종의 출현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신회선사의 \'반야\'사상과의 관계를 그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Ⅳ. 결어
신회선사는 사실상 \'조사선\'의 홍양자라고 할 수 있다. 신회선사를 배제하고서 조사선의 흥성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선사의 \'반야\'에 의한 선사상은 규봉 종밀과 함께 \'지해종도\'로 조사선에서 비판되고, 또한 \'여래선\'으로 분류되지만, 신회선사의 활대 \'무차대회\'를 통한 혜능의 남종을 위한 정통성 논쟁은 결국 조사선이 발흥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신회선사의 \'반야\'를 중심으로 한 선사상은 이후 등장하는 조사선의 활달한 선풍에 그 내재적 성립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사의 선사상은 도신, 홍인의 양대선사에 의하여 형성된 \'동산법문\'의 선법을 실질적으로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신선사의 \'수일불이\'와 홍인선사의 \'수본진심\' 역시 \'반야\'의 \'일행삼매\'가 성립의 논리적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종사적인 접근은 배제하고 다만 『어록』에 나타난 \'반야\'사상과의 관계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사는 전체적인 선사상을 \'반야\'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여래선\'의 제시로 귀결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선사를 선에 있어서 \'반야\'사상의 적극적인 유포자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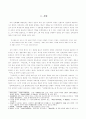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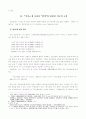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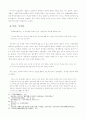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