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Ⅰ.大慧의 사회인식과 간화선
Ⅱ. 수선사의 현실참여 경향과 간화선
맺음말
Ⅰ.大慧의 사회인식과 간화선
Ⅱ. 수선사의 현실참여 경향과 간화선
맺음말
본문내용
산이 보내준 「無極說」의 의미를 터득하고 無極老人이란 자호를 사용할 만큼 『주역』에 정통했던 것이다.
) 李齊賢,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幷序」『東文選』 권118
「中吳蒙山異禪師 嘗作無極說 附海舶 以寄之 師默領其意 自號無極老人」
혼구가 몽산과의 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당시 남송대의 성리학적 경향을 이해할 만큼 『周易』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元으로부터 성리학이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在野의 학자나 승려들에 의해 성리학이 연구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李齊賢, 『 翁稗說』 前集2
「嘗見神孝寺堂頭正文 年八十 善說語孟詩書 自言學於儒者安杜俊 昔一士人入宋 聞荊公退處金陵 往從之受毛詩 七傳而至杜俊 故詩則專用王氏義 語孟及書所說 皆與朱子章句蔡氏傳合 當時是二書 未至東方 不知杜俊何從得其義」
이상에서 혜심, 충지, 일연 등의 경우를 통해 그들이 공통적으로 유교적 기반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당시 선승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더욱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미 유교로부터 불교에 이르기까지 무릇 내외의 모든 경서를 통박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심지어 불교를 천양할 때나 저술과 게송 등을 지을 때 그 모두가 恢恢하며 游刃有餘하였다.
) 李奎報, 「高麗國曹溪山제2세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幷序」 『東文選』 권118
국사의 휘는 混元이요, 학문이 내외에 통하여 드디어 山 僧徒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 金坵 撰, 「臥龍山慈雲寺王師贈諡眞明國師碑銘」『東文選』 권117
스님의 휘는 天英이나 후에 天安으로 개명하였다. ...스님께서는 내외의 모든 학문에 깊이 정통하였으며 무릇 저술은 모두 뛰어난 명작이라서 비록 고인들의 저작들 중에도 대비할 만한 작품이 많지 아니하였다.
) 李益培, 「曹溪山 제5세 贈諡慈眞圓悟國師 碑銘 幷序」
위의 비문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수선사의 선승들은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면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수선사의 역대 주법들과 일연 등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유교적 소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선사를 주도한 역대 주법들이 대부분 지방사회의 향리층이나 독서층 출신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당시 천태종 계통의 백련사 결사를 주도한 역대 주법들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며, 신앙결사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의 불교계를 주도한 인물들이 주로 귀족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 출신 성분상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더욱이 혜심 이후에는 수선사가 차츰 선사상을 강조함으로써 독서층이나 문신관료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들이 단월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蔡尙植, 앞의 책 41∼43쪽 참조.
따라서 13세기 선승들이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였던 배경에는 간화선의 사회사상적 경향과 함께 그들의 출신성분이 독서층이기 때문에 유학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던 것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고려 불교의 성격이 점차 윤리화, 세속화하는 단서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불교가 고려사회의 주도이념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상실하고 서서히 유학이 주도적인 경향으로 대체되어 나가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간화선이 지니는 이러한 사회사상적 경향은 이 시기 동아시아 역사에 공통적인 사실이 주목된다. 즉 중국의 남송, 원대에 표방된 간화선의 민족의식, 국가의식은 고려, 일본, 베트남 역사에서 13세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3세기 말 몽고의 침략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의 임제종 계통이 神國思想을 표방할 정도로 외적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런데 이를 막부와 밀착되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12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의 해로를 통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榮西(1141∼1215)라든가 道元(1200∼1253) 등을 필두로 하여 선승들이 송에 유학하는 경향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들이 귀국하여 각각 임제종, 조동종을 개창하는 등의 분위기가 연결되면서, 특히 13세기 후반 이후 몽고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던 남송의 많은 임제종 승려들이 일본으로 초청받아 들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남송에서 몽고의 침략을 직접 겪으면서 가지게 된 경험이 임제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몽항쟁을 유도했을 것이며, 이는 일본 임제종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 蔡尙植, 「麗.蒙의 일본정벌과 관련된 외교문서의 추이」『韓國民族文化』 9, 1997 참조.
川添昭二, 「鎌倉佛敎の群像-蒙古襲來との關連て-」『人間とは何か』, 九州大學出版會, 1986, 37∼38쪽에서 南宋禪은 북방민족의 압박을 계기로 민족적.국가주의적 경향이 농후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陳 왕조(1225∼1400)는 1257년, 1284∼1285년, 1287∼1288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원의 침입을 물리쳤다. 그런데 진의 역대 황제들은 불교를 보호하고 특히 선의 경지를 추구하여 자신들을 大師라 하였다. 특히 仁宗(1258∼1308)은 원의 침략을 물리치고 출가하였으며, 임제선을 받아들여 竹林派를 창건하였다.
) 劉仁善, 『베트남사』, 민음사, 1984, 123∼140쪽 참조.
죽림파의 선은 천봉에 의해 전해진 임제선과 전통적인 無言通派의 선을 결합시켜 월남화한 것으로 간화선의 실천을 지향한 대혜종고를 그 전형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래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동향에 대해 결사운동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이후 결사운동이 무신정권과 결탁되면서 체제지향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 국내적인 상황만을 고려하여 단순히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든지 체제 결탁이라는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시각보다는 당시의 대외적인 위기 상황과 결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당시 사상계를 주도하였던 간화선풍이 13세기 동아시아의 일반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위기상황에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을 지니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 李齊賢,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幷序」『東文選』 권118
「中吳蒙山異禪師 嘗作無極說 附海舶 以寄之 師默領其意 自號無極老人」
혼구가 몽산과의 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당시 남송대의 성리학적 경향을 이해할 만큼 『周易』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元으로부터 성리학이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在野의 학자나 승려들에 의해 성리학이 연구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李齊賢, 『 翁稗說』 前集2
「嘗見神孝寺堂頭正文 年八十 善說語孟詩書 自言學於儒者安杜俊 昔一士人入宋 聞荊公退處金陵 往從之受毛詩 七傳而至杜俊 故詩則專用王氏義 語孟及書所說 皆與朱子章句蔡氏傳合 當時是二書 未至東方 不知杜俊何從得其義」
이상에서 혜심, 충지, 일연 등의 경우를 통해 그들이 공통적으로 유교적 기반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당시 선승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더욱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미 유교로부터 불교에 이르기까지 무릇 내외의 모든 경서를 통박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심지어 불교를 천양할 때나 저술과 게송 등을 지을 때 그 모두가 恢恢하며 游刃有餘하였다.
) 李奎報, 「高麗國曹溪山제2세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幷序」 『東文選』 권118
국사의 휘는 混元이요, 학문이 내외에 통하여 드디어 山 僧徒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 金坵 撰, 「臥龍山慈雲寺王師贈諡眞明國師碑銘」『東文選』 권117
스님의 휘는 天英이나 후에 天安으로 개명하였다. ...스님께서는 내외의 모든 학문에 깊이 정통하였으며 무릇 저술은 모두 뛰어난 명작이라서 비록 고인들의 저작들 중에도 대비할 만한 작품이 많지 아니하였다.
) 李益培, 「曹溪山 제5세 贈諡慈眞圓悟國師 碑銘 幷序」
위의 비문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수선사의 선승들은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면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수선사의 역대 주법들과 일연 등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유교적 소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선사를 주도한 역대 주법들이 대부분 지방사회의 향리층이나 독서층 출신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당시 천태종 계통의 백련사 결사를 주도한 역대 주법들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며, 신앙결사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의 불교계를 주도한 인물들이 주로 귀족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 출신 성분상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더욱이 혜심 이후에는 수선사가 차츰 선사상을 강조함으로써 독서층이나 문신관료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들이 단월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蔡尙植, 앞의 책 41∼43쪽 참조.
따라서 13세기 선승들이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였던 배경에는 간화선의 사회사상적 경향과 함께 그들의 출신성분이 독서층이기 때문에 유학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던 것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고려 불교의 성격이 점차 윤리화, 세속화하는 단서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불교가 고려사회의 주도이념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상실하고 서서히 유학이 주도적인 경향으로 대체되어 나가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간화선이 지니는 이러한 사회사상적 경향은 이 시기 동아시아 역사에 공통적인 사실이 주목된다. 즉 중국의 남송, 원대에 표방된 간화선의 민족의식, 국가의식은 고려, 일본, 베트남 역사에서 13세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3세기 말 몽고의 침략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의 임제종 계통이 神國思想을 표방할 정도로 외적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런데 이를 막부와 밀착되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12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의 해로를 통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榮西(1141∼1215)라든가 道元(1200∼1253) 등을 필두로 하여 선승들이 송에 유학하는 경향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들이 귀국하여 각각 임제종, 조동종을 개창하는 등의 분위기가 연결되면서, 특히 13세기 후반 이후 몽고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던 남송의 많은 임제종 승려들이 일본으로 초청받아 들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남송에서 몽고의 침략을 직접 겪으면서 가지게 된 경험이 임제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몽항쟁을 유도했을 것이며, 이는 일본 임제종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 蔡尙植, 「麗.蒙의 일본정벌과 관련된 외교문서의 추이」『韓國民族文化』 9, 1997 참조.
川添昭二, 「鎌倉佛敎の群像-蒙古襲來との關連て-」『人間とは何か』, 九州大學出版會, 1986, 37∼38쪽에서 南宋禪은 북방민족의 압박을 계기로 민족적.국가주의적 경향이 농후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陳 왕조(1225∼1400)는 1257년, 1284∼1285년, 1287∼1288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원의 침입을 물리쳤다. 그런데 진의 역대 황제들은 불교를 보호하고 특히 선의 경지를 추구하여 자신들을 大師라 하였다. 특히 仁宗(1258∼1308)은 원의 침략을 물리치고 출가하였으며, 임제선을 받아들여 竹林派를 창건하였다.
) 劉仁善, 『베트남사』, 민음사, 1984, 123∼140쪽 참조.
죽림파의 선은 천봉에 의해 전해진 임제선과 전통적인 無言通派의 선을 결합시켜 월남화한 것으로 간화선의 실천을 지향한 대혜종고를 그 전형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래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동향에 대해 결사운동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이후 결사운동이 무신정권과 결탁되면서 체제지향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 국내적인 상황만을 고려하여 단순히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든지 체제 결탁이라는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시각보다는 당시의 대외적인 위기 상황과 결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당시 사상계를 주도하였던 간화선풍이 13세기 동아시아의 일반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위기상황에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을 지니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추천자료
 르네상스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고찰
르네상스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고찰 서양의 등장을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적 틀로 설명
서양의 등장을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적 틀로 설명 [리더십]유목이동문명제국의 CEO와 칭기스칸의 리더십 및 경영전략
[리더십]유목이동문명제국의 CEO와 칭기스칸의 리더십 및 경영전략  교회성장사
교회성장사 스페인 속 아랍 건축 - 알람브라 궁전을 중심으로
스페인 속 아랍 건축 - 알람브라 궁전을 중심으로 [벨기에][벨기에 문화][벨기에 역사][벨기에 경제][벨기에 교육][벨기에 사회체육제도][벨기...
[벨기에][벨기에 문화][벨기에 역사][벨기에 경제][벨기에 교육][벨기에 사회체육제도][벨기... [스웨덴][스웨덴문화][스웨덴 문학][스웨덴 사회복지][스웨덴 산업][스웨덴 지리][스웨덴 기...
[스웨덴][스웨덴문화][스웨덴 문학][스웨덴 사회복지][스웨덴 산업][스웨덴 지리][스웨덴 기... 서양 음악사
서양 음악사 프랑스 문학사
프랑스 문학사 막달라 마리아의 도상 변천과 시대적 배경
막달라 마리아의 도상 변천과 시대적 배경 [전자출판]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정의,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중요성, 전자출판(...
[전자출판]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정의,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중요성, 전자출판(... [국제사회] 우마이야 왕조, 압바스 왕조의 역사, 사회, 문화 분석 (2012년 추천 우수)
[국제사회] 우마이야 왕조, 압바스 왕조의 역사, 사회, 문화 분석 (2012년 추천 우수) 프랑스문학사
프랑스문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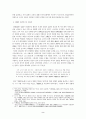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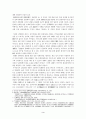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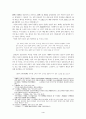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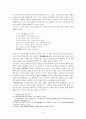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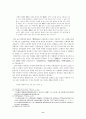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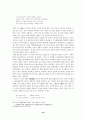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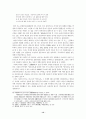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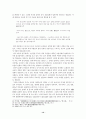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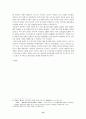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