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암흑기라는 것
2. 친일문학의 전개
3. 친일문학의 작품 세계
4. 친일문학에 대한 물음
2. 친일문학의 전개
3. 친일문학의 작품 세계
4. 친일문학에 대한 물음
본문내용
의 문학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친일문학론자들은 한국의 문학이 일본의 규슈(九州)나 홋까이도(北海道)와 같은 한 지방 문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까지도 편 바 있다.
친일문학에 대한 세 번째의 물음은 그 언어에 관련된 것이다. 『국민문학』이 1941년 5월호부터 한글판을 폐지함과 동시에 조선어 말살정책의 기운으로 대부분의 창작활동이 일본어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어로 씌어진 작품들의 문학사적 귀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속문주의(屬文主義)를 취한다면 일본문학이 되고, 속소재주의(屬素材主義)의 관점이라면 한국문학이 될 것이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김윤식의 견해다.
김윤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무영(李無影)의 <청와(靑瓦)의 가(家)> 최재서의 <비시(非時)의 화(花)>, <민족(民族)의 결혼(結婚)> 등은 일본 국가에 이르는 혼을 발견하려고 쓴 것이지만 그 소재가 \'조선\'일 뿐 아니라 \'조선적 특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김사량(金史良)의 <물오리도(島)>, <태백산맥(太白山脈)>, 유진오(兪鎭午)의 <남곡선생(南谷先生)>, 조용만(趙容萬)의 <선(船)의 중(中)>, 오영진(吳泳鎭)의 <맹진사댁 경사(慶事)> 등은 일본어로 썼다 해도 \"반민족 또는 친일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어로 표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친일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사고와, 비록 일본어로 썼더라도 친일문학으로 보기 어렵다는 두 가지 견해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보인다. 전자의 주장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후자의 주장은 한글 이전이나 이후에 쓰인 한문 작품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문학을 보는 시각의 문제다. 이 점에서 김윤식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많다. 그는 일본혼을 지향한 친일문학이라 할지라도 \'깊이 통찰해 본다면 그 무엇인가의 불합리, 추태, 고민이 스며 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며 우리 문학사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학이 진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영향론적 관계를 우리가 인정할 때 이러한 판단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친일문학에 대한 조사와 정리는 임종국(林鍾國)에 의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진행되어 있고,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71.
우리가 이 자료에 추가할 것이란 별로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같은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대우 문제다. 많은 논자들이 적극적 동조냐 소극적 동조냐, 혹은 적극적 동참을 주장한 내용이냐 아니면 단순한 반영이냐를 놓고 등급을 매기고 분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류란 체계적 지식을 위한 준비이며 목표이지만, 친일문학에 있어 그것을 분류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문학사란 문학작품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의미의 맥락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친일문학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을 일단 누르고 그것이 우리 것임을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밉더라도, 혹은 탕아(蕩兒)이거나 죄인(罪人)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추한 곳까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식일 것이다.
버리고 싶다는 것은 감정이지 논리가 아니다. 감안한다면, 일본이 패전국이면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반성과 역사를 아끼는 태도라고는 볼 수 없는가.
일제말의 암흑시대가 비록 부끄럽고 아픈 추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백이 아니다. 오히려 추하지만 분명 채워져 있는 우리 문학사의 한 대목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김윤식의 다음과 같은 말은 친일문학을 보는 우리의 관점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자기 비판이나 역사에의 변명은 제3의 관점을 도입하지 않는 한 무의미할 것이다. 즉 김사량(金史良)류처럼 조선어 제일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붓만 끊으면 저항이냐라는 반문과, 이태준(李泰俊)류의 일본어로 작품만 쓴 것이 아무리 저항적이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대립은 어쩌면 난쟁이 키재기 놀음인지도 모른다. 을유(乙酉) 해방(解放) 문학(文學)의 전개가 이 두 전제를 철저히 극복했느냐의 검정은 그 다음 차례에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다.
김윤식, 『문학사와 비평』, 일지사, 1975.
친일문학에 대한 세 번째의 물음은 그 언어에 관련된 것이다. 『국민문학』이 1941년 5월호부터 한글판을 폐지함과 동시에 조선어 말살정책의 기운으로 대부분의 창작활동이 일본어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어로 씌어진 작품들의 문학사적 귀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속문주의(屬文主義)를 취한다면 일본문학이 되고, 속소재주의(屬素材主義)의 관점이라면 한국문학이 될 것이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김윤식의 견해다.
김윤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무영(李無影)의 <청와(靑瓦)의 가(家)> 최재서의 <비시(非時)의 화(花)>, <민족(民族)의 결혼(結婚)> 등은 일본 국가에 이르는 혼을 발견하려고 쓴 것이지만 그 소재가 \'조선\'일 뿐 아니라 \'조선적 특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김사량(金史良)의 <물오리도(島)>, <태백산맥(太白山脈)>, 유진오(兪鎭午)의 <남곡선생(南谷先生)>, 조용만(趙容萬)의 <선(船)의 중(中)>, 오영진(吳泳鎭)의 <맹진사댁 경사(慶事)> 등은 일본어로 썼다 해도 \"반민족 또는 친일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어로 표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친일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사고와, 비록 일본어로 썼더라도 친일문학으로 보기 어렵다는 두 가지 견해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보인다. 전자의 주장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후자의 주장은 한글 이전이나 이후에 쓰인 한문 작품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문학을 보는 시각의 문제다. 이 점에서 김윤식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많다. 그는 일본혼을 지향한 친일문학이라 할지라도 \'깊이 통찰해 본다면 그 무엇인가의 불합리, 추태, 고민이 스며 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며 우리 문학사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학이 진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영향론적 관계를 우리가 인정할 때 이러한 판단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친일문학에 대한 조사와 정리는 임종국(林鍾國)에 의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진행되어 있고,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71.
우리가 이 자료에 추가할 것이란 별로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같은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대우 문제다. 많은 논자들이 적극적 동조냐 소극적 동조냐, 혹은 적극적 동참을 주장한 내용이냐 아니면 단순한 반영이냐를 놓고 등급을 매기고 분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류란 체계적 지식을 위한 준비이며 목표이지만, 친일문학에 있어 그것을 분류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문학사란 문학작품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의미의 맥락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친일문학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을 일단 누르고 그것이 우리 것임을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밉더라도, 혹은 탕아(蕩兒)이거나 죄인(罪人)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추한 곳까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식일 것이다.
버리고 싶다는 것은 감정이지 논리가 아니다. 감안한다면, 일본이 패전국이면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반성과 역사를 아끼는 태도라고는 볼 수 없는가.
일제말의 암흑시대가 비록 부끄럽고 아픈 추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백이 아니다. 오히려 추하지만 분명 채워져 있는 우리 문학사의 한 대목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김윤식의 다음과 같은 말은 친일문학을 보는 우리의 관점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자기 비판이나 역사에의 변명은 제3의 관점을 도입하지 않는 한 무의미할 것이다. 즉 김사량(金史良)류처럼 조선어 제일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붓만 끊으면 저항이냐라는 반문과, 이태준(李泰俊)류의 일본어로 작품만 쓴 것이 아무리 저항적이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대립은 어쩌면 난쟁이 키재기 놀음인지도 모른다. 을유(乙酉) 해방(解放) 문학(文學)의 전개가 이 두 전제를 철저히 극복했느냐의 검정은 그 다음 차례에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다.
김윤식, 『문학사와 비평』, 일지사, 1975.
추천자료
 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문학사 관련 분석 - 작품 : 광야(이육사)
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문학사 관련 분석 - 작품 : 광야(이육사) 만해 한용운의 삶과 문학에 관하여
만해 한용운의 삶과 문학에 관하여 [신소설][혈의 누][이인직]신소설의 작가, 형식적인 기법, 한계 및 근대문학적 면모 고찰(신...
[신소설][혈의 누][이인직]신소설의 작가, 형식적인 기법, 한계 및 근대문학적 면모 고찰(신... 만주사변 - 중국역사의 암흑기
만주사변 - 중국역사의 암흑기 아동문학작가 이원수의 작품세계
아동문학작가 이원수의 작품세계 [김동인][인형작조종술 창작관][김동인 배따라기][김동인 광염소나타]김동인 생애, 김동인 작...
[김동인][인형작조종술 창작관][김동인 배따라기][김동인 광염소나타]김동인 생애, 김동인 작... 윤동주의 생애와 윤동주의 시 세계, 윤동주의 시 분석 및 윤동주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윤동...
윤동주의 생애와 윤동주의 시 세계, 윤동주의 시 분석 및 윤동주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윤동... '해에게서 소년에게' 문학사적 의의 연구
'해에게서 소년에게' 문학사적 의의 연구 (소설창작론)이태준의 단편 「패강냉」(패강랭)을 읽고 작품의 줄거리와 문학사적 의의에 대...
(소설창작론)이태준의 단편 「패강냉」(패강랭)을 읽고 작품의 줄거리와 문학사적 의의에 대... 2013년 1학기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3년 1학기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기말시험 핵심체크 현대건축의 흐름, 건축가의 흐름, 근대사회의 흐름, 근현대사상의 흐름, 현대철학의 흐름, 그...
현대건축의 흐름, 건축가의 흐름, 근대사회의 흐름, 근현대사상의 흐름, 현대철학의 흐름, 그... [한국현대시의 힘] 한 편의 친일시도 거부한 천재 시인 오장환
[한국현대시의 힘] 한 편의 친일시도 거부한 천재 시인 오장환 2014년 1학기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4년 1학기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기말시험 핵심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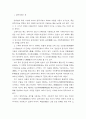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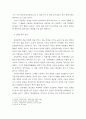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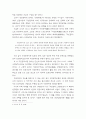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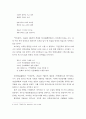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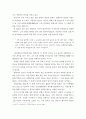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