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노동자 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내셔날의 역사: 노조와 정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1) 제1인터내셔날: 노조우위모델
2) 제2, 3 인터내셔날: 정당우위 모델
3) 전후 시기 유럽 노동자 정치운동의 형식으로서의 정당과 노조의 분업모델
3. 전후 유럽노동자 정치운동의 일반적-구조적 조건
4. 유럽 노동운동 정치세력화의 양대 모델-프랑스와 스웨덴
1) 프랑스: PCF(프랑스 공산당)과 CGT(노동자 총동맹)의 관계를 중심으로
2) 스웨덴: 사회 코포라티즘의 전제로서의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유착모델
5. 결론에 대신하여: 현재의 유럽노동운동에 대한 약간의 정치적 평가
2. 노동자 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내셔날의 역사: 노조와 정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1) 제1인터내셔날: 노조우위모델
2) 제2, 3 인터내셔날: 정당우위 모델
3) 전후 시기 유럽 노동자 정치운동의 형식으로서의 정당과 노조의 분업모델
3. 전후 유럽노동자 정치운동의 일반적-구조적 조건
4. 유럽 노동운동 정치세력화의 양대 모델-프랑스와 스웨덴
1) 프랑스: PCF(프랑스 공산당)과 CGT(노동자 총동맹)의 관계를 중심으로
2) 스웨덴: 사회 코포라티즘의 전제로서의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유착모델
5. 결론에 대신하여: 현재의 유럽노동운동에 대한 약간의 정치적 평가
본문내용
지고 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실업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노동자 정치운동의 대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운동의 독자성과 연대성의 관점에서 논의하는게 노조운동과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것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아니 당장 자본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그에따른 대량실업은 유럽의 문제가 아닌 정확히 이제 바로 한국 노동자운동의 문제, 그것도 아주 절실한 정치적 문제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총선이나 지자체선거에 서 몇 석이나 얻을 것인가 따위를 궁리하는 식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한마디로 복잡한 애기 할 거 없이 \'그런 거 해서 뭐 하냐\'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의, 그리고 노조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노조운동 지도자나 과거 노동운동주변에서 기웃되다가 이제 세상이 변했느니 하면서 금뱃지 하나 달아보려고 운동을 파는 그러한 인물들의 정치적 출세주의와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은가.
본고가 인터내셔날의 역사와 프랑스와 스웨덴 유형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정치세력화에는 왕도가 없다는 점이다.
) 발렌주엘라에 대한 김영수의 비판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것으로 여져진다. 발렌주엘라는 노동자 계급운동에 대한 각 국가의 통제정책을 토대로 \'노동조합운동에 강성적이고 정치공간이 폐쇄적인 국가, 노동조합운동에 연성적이고 정치공간이 폐쇄적인 국가, 노동조합운동에 강성적이고 정치공간이 개방적인 국가, 노동조합운동에 연성적이고 정치공간이 개방적인 국가\'로 정권의 성격을 분류한 뒤 각 국가에서 나타났던 정당과 노동조합간의 상호연대관계의 긴밀성의 정도를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양상을 \'사회민주당형\', \'경쟁형,\' \'압력집단형\', \'국가후원형\', \'대결형\'등 5가지로 유형화한다. 김영수는 이러한 발렌주엘라의 연구가 노동자 계급정치 유형화에서 국가-자본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역량을 사상시킨 결과, 노동자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운동간의 상호관계형성에 규정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 그리고 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호관계의 성격과 내용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측면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김영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김영수, 앞의 글, p. 62. 참조. 그리고 위의 발렌주엘라의 주장에 관해서는 J. S. Vallenzuela (1992) \"Labour Movements and Political System: Some Variations,\" in Mario Regini (ed.) (1982) The Future of Labor Movements, London: Sage 참조.
극단적으로 말해서 각각의 나라에는 고유한 그 나라의 정치정세와 노동자 정치운동의 조건에 따른 정치세력화의 논리가 내재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다시말해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이를 발견하여 노동자정치와 관련된 일반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락카토스(Lakatos)의 과학철학적 방법을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에 원용, 일반이론을 방어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를 퇴보적 연구프로그램(Degenerative Research Program)으로, 그리고 변형사례(Anomaly Case)를 추출하여 이론적 확장벨트를 건설함으로써 일반이론을 더욱 풍부히 하는 발전적 프로그램(Progressive Research Program)으로 구분하는 글로는 M. Burawoy, M. (1990) \"Marxism as Science: Historical Challenges and Theoretical Growth,\" American Sociology Review, No. 55, Dec. 참조.
사정이 이러할 때, 본고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고찰과 각국의 사례를 통해 지금 현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 다시말해서 해서는 안될 유의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본고는 이러한 유의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것의 오류을 들고자 한다. 이러한 오류에는 사민주의적 정치세력화와 볼세비키적 전위정당의 건설이라는 그 노선상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노조와 정당을 기능형식적으로 이분화하는 분업모델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역할분담에 다른 분담모델은 우리가 채택해서는 안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형이다. 이에 대한 답은 오히려 변이에 대한 탐구로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준거로 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델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적극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모델링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현대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자계급 구성의 내용적 변화와 같은 고도한 이론적 문제의 규명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탐구를 올바로 하기위해서 조차 우리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왔던 제반 이론적 전제에 대한 의심일 일이다.
과연 지금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조건하에서 정치적 전위라고 일컫어 지는 정치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점에서 대중조직인 노조의 성원들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 아니 구분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치세력화의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정치세력화의 주체의 모습은 이전의 볼세비키와 같이 정치적 전위로서 노동자를 그야말로 계몽하고 학습시켜 계급의식을 주입시키는 선각자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닐 것이다. 소수의 자각된 혁명가 집단에 의해 국가를 외부로부터 파괴해가는 그러한 볼세비키적 전위당 노선이나 신자유주의의 공세앞에 무기력한 사민주의적 의회정당은 더 이상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정당이론이 공유하는 맹점은 앞에서도 지적한바 있듯이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을 확연히 분리하는 이원주의적 관점이며, 이러한 이원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노동자 대중의 활력을 정치조직의 동력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는 것만이 우리 앞에 놓여진 거의 유일한 정치세력화의 대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본고가 인터내셔날의 역사와 프랑스와 스웨덴 유형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정치세력화에는 왕도가 없다는 점이다.
) 발렌주엘라에 대한 김영수의 비판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것으로 여져진다. 발렌주엘라는 노동자 계급운동에 대한 각 국가의 통제정책을 토대로 \'노동조합운동에 강성적이고 정치공간이 폐쇄적인 국가, 노동조합운동에 연성적이고 정치공간이 폐쇄적인 국가, 노동조합운동에 강성적이고 정치공간이 개방적인 국가, 노동조합운동에 연성적이고 정치공간이 개방적인 국가\'로 정권의 성격을 분류한 뒤 각 국가에서 나타났던 정당과 노동조합간의 상호연대관계의 긴밀성의 정도를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양상을 \'사회민주당형\', \'경쟁형,\' \'압력집단형\', \'국가후원형\', \'대결형\'등 5가지로 유형화한다. 김영수는 이러한 발렌주엘라의 연구가 노동자 계급정치 유형화에서 국가-자본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역량을 사상시킨 결과, 노동자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운동간의 상호관계형성에 규정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 그리고 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호관계의 성격과 내용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측면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김영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김영수, 앞의 글, p. 62. 참조. 그리고 위의 발렌주엘라의 주장에 관해서는 J. S. Vallenzuela (1992) \"Labour Movements and Political System: Some Variations,\" in Mario Regini (ed.) (1982) The Future of Labor Movements, London: Sage 참조.
극단적으로 말해서 각각의 나라에는 고유한 그 나라의 정치정세와 노동자 정치운동의 조건에 따른 정치세력화의 논리가 내재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다시말해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이를 발견하여 노동자정치와 관련된 일반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락카토스(Lakatos)의 과학철학적 방법을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에 원용, 일반이론을 방어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를 퇴보적 연구프로그램(Degenerative Research Program)으로, 그리고 변형사례(Anomaly Case)를 추출하여 이론적 확장벨트를 건설함으로써 일반이론을 더욱 풍부히 하는 발전적 프로그램(Progressive Research Program)으로 구분하는 글로는 M. Burawoy, M. (1990) \"Marxism as Science: Historical Challenges and Theoretical Growth,\" American Sociology Review, No. 55, Dec. 참조.
사정이 이러할 때, 본고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고찰과 각국의 사례를 통해 지금 현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 다시말해서 해서는 안될 유의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본고는 이러한 유의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것의 오류을 들고자 한다. 이러한 오류에는 사민주의적 정치세력화와 볼세비키적 전위정당의 건설이라는 그 노선상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노조와 정당을 기능형식적으로 이분화하는 분업모델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역할분담에 다른 분담모델은 우리가 채택해서는 안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형이다. 이에 대한 답은 오히려 변이에 대한 탐구로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준거로 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델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적극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모델링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현대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자계급 구성의 내용적 변화와 같은 고도한 이론적 문제의 규명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탐구를 올바로 하기위해서 조차 우리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왔던 제반 이론적 전제에 대한 의심일 일이다.
과연 지금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조건하에서 정치적 전위라고 일컫어 지는 정치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점에서 대중조직인 노조의 성원들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 아니 구분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치세력화의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정치세력화의 주체의 모습은 이전의 볼세비키와 같이 정치적 전위로서 노동자를 그야말로 계몽하고 학습시켜 계급의식을 주입시키는 선각자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닐 것이다. 소수의 자각된 혁명가 집단에 의해 국가를 외부로부터 파괴해가는 그러한 볼세비키적 전위당 노선이나 신자유주의의 공세앞에 무기력한 사민주의적 의회정당은 더 이상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정당이론이 공유하는 맹점은 앞에서도 지적한바 있듯이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을 확연히 분리하는 이원주의적 관점이며, 이러한 이원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노동자 대중의 활력을 정치조직의 동력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는 것만이 우리 앞에 놓여진 거의 유일한 정치세력화의 대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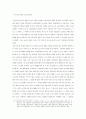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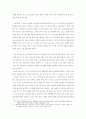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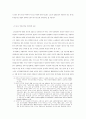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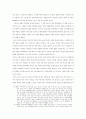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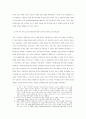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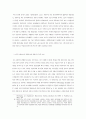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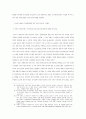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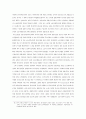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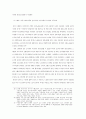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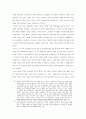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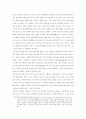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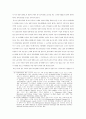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