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왜 디지털인가? 몸의 도시, 육체적 도시로의 전환?
2. 디지털 도시경관: 디지털 스펙터클의 사회
3. 디지털 일상경관(Digital Lifescape)과 문화공간
4. 디지털시대와 공간의 문화정치
2. 디지털 도시경관: 디지털 스펙터클의 사회
3. 디지털 일상경관(Digital Lifescape)과 문화공간
4. 디지털시대와 공간의 문화정치
본문내용
년들의 정서와 욕망이 꿈틀거리고 해소되는 \'미디어방\'의 3박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화공간 은 가정과 학교와 거리에서 벗어나 나만의 희망과 꿈, 나만의 즐거움과 쾌락, 나만의 멋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욕망, 실컷 노래부르고, 맘대로 보고, 열심히 만지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나의 감성을 자유롭게 펼치고 싶은 욕망, 노래의 가사와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과 함께 호흡하면서, 게임 속의 전사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서 몸안에서 꿈틀거리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느끼고 나의 몸을 확장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곳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욕망들이 담겨 있는 곳이다.
4. 디지털시대와 공간의 문화정치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인간의 확장과 통합을 통한 인간성의 구현과 몸의 도시, 육체적 도시의 건설이라는 점을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곧 즐거운 세상,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성의 구현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생성해 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나의 감수성을 무디게 만드는 사회구조와 규범, 가치체계에 대한 감성적 저항이 필요하다. 즉 나의 몸이 원하는 대로, 나의 육체적, 감성적 욕망의 흐름을 따라 적극적, 유동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디지털 육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육체의 생성은 그것을 가능케하는 디지털 공간의 창출, 혼자가 아닌 함께 대화하고 부대끼며 만들어나가는 디지털 커뮤니티의 형성과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디지털 도시가 창출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이라는 열린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디지털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부여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네가지 즉, 일상성, 정체성, 성찰성, 공공성을 강조하고 싶다. 일상성은 일상생활공간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생생한 경험 및 감각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과 무의식이 결합된 \'몸\'으로 일상공간을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공간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확립해야 한다. 정체성은 인간주체의 생기있는 문화적 욕망(질, 내용)과 물리적 공간(양, 형식)이 어울릴 때 형성된다.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조성만이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욕망이 담긴 문화적 공간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삶의 질을 왜곡하는 일상공간의 모순을 분명히 읽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공간에 대한 성찰, 타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상공간과 문화공간은 배타적이지 않아야 한다. 공간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상품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디지털 환경은 어떠한가? 사이버공간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문화적 검열이 존재하고, 도메인주소의 배타적 장악으로 인해 자유로운 진입이 봉쇄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욕망과 감수성은 자본논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현실공간 역시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물리적 환경은 어느정도 구축되었지만, 그 컨텐츠와 내용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감수성의 계발과, 상상력, 실험과 도전정신이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히는 문화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디지털 문화와 디지털 공간의 창출을 위한 문화정치적 실천과 기획이 중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4. 디지털시대와 공간의 문화정치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인간의 확장과 통합을 통한 인간성의 구현과 몸의 도시, 육체적 도시의 건설이라는 점을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곧 즐거운 세상,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성의 구현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생성해 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나의 감수성을 무디게 만드는 사회구조와 규범, 가치체계에 대한 감성적 저항이 필요하다. 즉 나의 몸이 원하는 대로, 나의 육체적, 감성적 욕망의 흐름을 따라 적극적, 유동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디지털 육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육체의 생성은 그것을 가능케하는 디지털 공간의 창출, 혼자가 아닌 함께 대화하고 부대끼며 만들어나가는 디지털 커뮤니티의 형성과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디지털 도시가 창출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이라는 열린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디지털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부여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네가지 즉, 일상성, 정체성, 성찰성, 공공성을 강조하고 싶다. 일상성은 일상생활공간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생생한 경험 및 감각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과 무의식이 결합된 \'몸\'으로 일상공간을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공간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확립해야 한다. 정체성은 인간주체의 생기있는 문화적 욕망(질, 내용)과 물리적 공간(양, 형식)이 어울릴 때 형성된다.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조성만이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욕망이 담긴 문화적 공간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삶의 질을 왜곡하는 일상공간의 모순을 분명히 읽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공간에 대한 성찰, 타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상공간과 문화공간은 배타적이지 않아야 한다. 공간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상품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디지털 환경은 어떠한가? 사이버공간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문화적 검열이 존재하고, 도메인주소의 배타적 장악으로 인해 자유로운 진입이 봉쇄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욕망과 감수성은 자본논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현실공간 역시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물리적 환경은 어느정도 구축되었지만, 그 컨텐츠와 내용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감수성의 계발과, 상상력, 실험과 도전정신이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히는 문화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디지털 문화와 디지털 공간의 창출을 위한 문화정치적 실천과 기획이 중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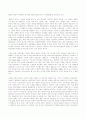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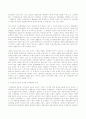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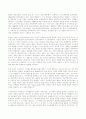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