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성격
Ⅱ. 지경의 원리와 구조
Ⅲ. 경의 실천
Ⅳ. 불경의 병상과 치료
Ⅴ. 맺는말-특성과 의의
Ⅱ. 지경의 원리와 구조
Ⅲ. 경의 실천
Ⅳ. 불경의 병상과 치료
Ⅴ. 맺는말-특성과 의의
본문내용
8b~30a (2-76), \'答金而精\', \"非以主靜爲不可也, 然亦不當厭 博約之煩, 而塊然以主靜.\"
-286-
마음의 병은 기본적으로 고요함이나 활동의 어느 한 쪽에 빠지는 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일이 없을 때\' 마음을 간직하는 방법이 한편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생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요함[靜]에 빠져 활동[動]이 없고자 하는 것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생각을 한번도 그치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은 활동[動]에 치우쳐 고요한[靜] 때가 없는 것이라 하여 動·靜 이 분리되어 한 쪽에 치우친 공부의 병폐를 지적한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주자가 말한 \'항상 잠들어 깨지 않거나, 항상 행하며 그치지 않는 병\'[常寐無覺常行不輟之病]이라 하여, 그 옳지 않음을 지적한다.
) <퇴계>, 28-24a (2-73), \'答金惇敍\', \"今論無事時持心之法, 一要常惺惺而遺去思慮, 是一於靜而欲無動也, 一要未嘗息念而不替其窮理, 是偏於動而無靜時也.\"
-287-
또 하나 마음의 중요한 病狀은 마음 속에 생각이 얽혀서 풀리지 않는 현상이다. 그는 착한 생각이나 마땅한 일이라도 마음 속에서 풀리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한 덩어리의 사사로운 생각[私意]이 되는 것이라 파악한다. 따라서 반드시 天理로 흔적없이 융화시켜야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이 마음 속에 남아서 방해가 된다 하여 일을 싫어하고 잊으려하며 활동을 싫어하여 고요함에 빠져 있으면, 老佛의 무리가 빠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儒學者도 털끝만큼의 착오가 있으면 망각과 고요함의 병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퇴계>, 28-3 (2-63), \'答金惇敍\', \"夫罪己責躬, 是乃善端之發, 非私意也, 然此一事橫在 裏而不釋, 則亦同歸於私意吝習, 必須天理融和無痕, 然後心得其正矣.\"
또한 그는 敬의 기본성격인 主一과 사물의 변화에 대응하는 主事를 無事時와 有事時로 대응시키고 있다. 주자의 \'答呂子約\'에서는 \"主一은 \'專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이 없으면[無事] 담담하며 안정하고 고요하여 활동으로 나가지 않으며, 일이 있으면[有事] 그 일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일에로 나가지는 않는다. 여기서 主事는 主一에 일치할 수도 있지만, 만약 얽매임의 私意가 있으면 일이 지나갔는데도 마음이 잊지 못하기도 하고, 몸이 여기에 있는데도 마음은 저기에 있는 \'산란하여 멋대로 함\'이 되어 主一無適과 상반되게 된다.\"고 파악한다.
) <퇴계>, 28-19a (2-71), \'答金惇敍\', \"若是有所係戀, 却是私意, 必有事已 過而心未忘, 身在此而心在彼者, 此其支離畔援, 與主一無適, 非但不同, 直是相反, ---以爲一可以御萬, 萬不可以命一, 故心能主宰專一, 則有不待思而能隨事 中絶.\"
따라서 敬의 主一을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 일에 오로지 대응하면서 다른 일을 생각에 남겨두지 않고, 다른 일에 옮기면 지난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비우고 순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수양의 기본방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제기하고 있다. 퇴계는 \'이치의 탐구\'와 \'경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공부방법이 서로 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 敬의 실천이 미숙하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이에대해 지속적으로 힘써 敬을 실천해 가면 과일이 익어 맛이 들듯 서로가 방해되지 않고 조화·일치됨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의 지속적인 축적이 없으면 마치 씨뿌리지 않고 김매지 않은 채 밭에서 곡식이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공허함을 지적한다.
) <퇴계>, 29-5a (2-89), \'答金而精\', \"到那熟時, 始可以無妨碍之病, 然於克復存養之功, 不能眞積力久, 而欲望到熟處, 何異不種不耘, 而望田之有熟乎.\"
이처럼 敬의 확고한 실천과 그 실천의 원숙함이 마음에 일어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방법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88-
Ⅴ. 맺는말-特性과 意義
퇴계의 수양론은 敬을 핵심개념으로 하며 그의 학문방법론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는 聖人을 지향하는 인격형성의 출발에서 聖人을 성취하는 종결까지 敬의 수양론을 일관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는 마음이 대상세계의 무한한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의식의 분산을 억제하며,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天理에의 일치를 추구하는, 主一無適의 긴장된 집중을 실현한다. 敬은 고요할 때나 활동할 때를 일관하는 것으로서, 한가할 때 마음을 간직하고 성품을 배양하는 存養과 활동할 때 행동의 기미를 살피는 省察의 양면이 요구된다. 또한 敬에는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모습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반듯한 모습의 整齊嚴肅과 내면에서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인 常惺惺法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자의 \'敬齋箴\'에 제시된 敬의 기본구조로서 퇴계에 있어서 敬의 수양론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체계라 할 수 있다.
그는 敬의 실천방법에서 단계적 과정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한다. 動·靜과 表·裏를 포용 조화하여 고요할 때 앉는 자세로서 靜坐나 활동할 때 글씨 쓰는 寫字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일치되고 엄숙함이 실천된다. 이러한 敬의 실천은 마음과 행위의 평면적 상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의 축적을 통해 순수하게 익숙한 상태에로 성숙시켜 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곧 敬은 수양론에서 인격형성의 과정을 중시하며 인격적 이상의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퇴계는 敬의 상실에서 오는 마음의 病을 진단하며 치료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격형성의 치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마음이 번잡함이나 고요함의 한 쪽에 치우치는 병폐와 얽매이고 분열하는 病狀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持敬의 일관된 수양법을 치료의 藥으로 제시함으로써, 마음의 부정적 작용에 대한 대응방법을 치밀하게 확립한다.
-289-
이러한 그의 유교적 수양론은 과도한 욕망의 개방과 사물의 자극으로 황폐화하고, 가치의식의 분열과 이념의 갈등으로 혼미에 빠진 현대인의 정신질병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대응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이상이요 인간의 보편적 요구로서 인격적 가능성의 계발과 인간의 품위를 향상시켜 가는 데 있어서 敬의 수양론은 우리 시대에서도 유익한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6-
마음의 병은 기본적으로 고요함이나 활동의 어느 한 쪽에 빠지는 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일이 없을 때\' 마음을 간직하는 방법이 한편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생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요함[靜]에 빠져 활동[動]이 없고자 하는 것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생각을 한번도 그치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은 활동[動]에 치우쳐 고요한[靜] 때가 없는 것이라 하여 動·靜 이 분리되어 한 쪽에 치우친 공부의 병폐를 지적한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주자가 말한 \'항상 잠들어 깨지 않거나, 항상 행하며 그치지 않는 병\'[常寐無覺常行不輟之病]이라 하여, 그 옳지 않음을 지적한다.
) <퇴계>, 28-24a (2-73), \'答金惇敍\', \"今論無事時持心之法, 一要常惺惺而遺去思慮, 是一於靜而欲無動也, 一要未嘗息念而不替其窮理, 是偏於動而無靜時也.\"
-287-
또 하나 마음의 중요한 病狀은 마음 속에 생각이 얽혀서 풀리지 않는 현상이다. 그는 착한 생각이나 마땅한 일이라도 마음 속에서 풀리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한 덩어리의 사사로운 생각[私意]이 되는 것이라 파악한다. 따라서 반드시 天理로 흔적없이 융화시켜야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이 마음 속에 남아서 방해가 된다 하여 일을 싫어하고 잊으려하며 활동을 싫어하여 고요함에 빠져 있으면, 老佛의 무리가 빠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儒學者도 털끝만큼의 착오가 있으면 망각과 고요함의 병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퇴계>, 28-3 (2-63), \'答金惇敍\', \"夫罪己責躬, 是乃善端之發, 非私意也, 然此一事橫在 裏而不釋, 則亦同歸於私意吝習, 必須天理融和無痕, 然後心得其正矣.\"
또한 그는 敬의 기본성격인 主一과 사물의 변화에 대응하는 主事를 無事時와 有事時로 대응시키고 있다. 주자의 \'答呂子約\'에서는 \"主一은 \'專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이 없으면[無事] 담담하며 안정하고 고요하여 활동으로 나가지 않으며, 일이 있으면[有事] 그 일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일에로 나가지는 않는다. 여기서 主事는 主一에 일치할 수도 있지만, 만약 얽매임의 私意가 있으면 일이 지나갔는데도 마음이 잊지 못하기도 하고, 몸이 여기에 있는데도 마음은 저기에 있는 \'산란하여 멋대로 함\'이 되어 主一無適과 상반되게 된다.\"고 파악한다.
) <퇴계>, 28-19a (2-71), \'答金惇敍\', \"若是有所係戀, 却是私意, 必有事已 過而心未忘, 身在此而心在彼者, 此其支離畔援, 與主一無適, 非但不同, 直是相反, ---以爲一可以御萬, 萬不可以命一, 故心能主宰專一, 則有不待思而能隨事 中絶.\"
따라서 敬의 主一을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 일에 오로지 대응하면서 다른 일을 생각에 남겨두지 않고, 다른 일에 옮기면 지난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비우고 순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수양의 기본방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제기하고 있다. 퇴계는 \'이치의 탐구\'와 \'경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공부방법이 서로 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 敬의 실천이 미숙하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이에대해 지속적으로 힘써 敬을 실천해 가면 과일이 익어 맛이 들듯 서로가 방해되지 않고 조화·일치됨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의 지속적인 축적이 없으면 마치 씨뿌리지 않고 김매지 않은 채 밭에서 곡식이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공허함을 지적한다.
) <퇴계>, 29-5a (2-89), \'答金而精\', \"到那熟時, 始可以無妨碍之病, 然於克復存養之功, 不能眞積力久, 而欲望到熟處, 何異不種不耘, 而望田之有熟乎.\"
이처럼 敬의 확고한 실천과 그 실천의 원숙함이 마음에 일어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방법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88-
Ⅴ. 맺는말-特性과 意義
퇴계의 수양론은 敬을 핵심개념으로 하며 그의 학문방법론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는 聖人을 지향하는 인격형성의 출발에서 聖人을 성취하는 종결까지 敬의 수양론을 일관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는 마음이 대상세계의 무한한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의식의 분산을 억제하며,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天理에의 일치를 추구하는, 主一無適의 긴장된 집중을 실현한다. 敬은 고요할 때나 활동할 때를 일관하는 것으로서, 한가할 때 마음을 간직하고 성품을 배양하는 存養과 활동할 때 행동의 기미를 살피는 省察의 양면이 요구된다. 또한 敬에는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모습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반듯한 모습의 整齊嚴肅과 내면에서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인 常惺惺法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자의 \'敬齋箴\'에 제시된 敬의 기본구조로서 퇴계에 있어서 敬의 수양론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체계라 할 수 있다.
그는 敬의 실천방법에서 단계적 과정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한다. 動·靜과 表·裏를 포용 조화하여 고요할 때 앉는 자세로서 靜坐나 활동할 때 글씨 쓰는 寫字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일치되고 엄숙함이 실천된다. 이러한 敬의 실천은 마음과 행위의 평면적 상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의 축적을 통해 순수하게 익숙한 상태에로 성숙시켜 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곧 敬은 수양론에서 인격형성의 과정을 중시하며 인격적 이상의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퇴계는 敬의 상실에서 오는 마음의 病을 진단하며 치료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격형성의 치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마음이 번잡함이나 고요함의 한 쪽에 치우치는 병폐와 얽매이고 분열하는 病狀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持敬의 일관된 수양법을 치료의 藥으로 제시함으로써, 마음의 부정적 작용에 대한 대응방법을 치밀하게 확립한다.
-289-
이러한 그의 유교적 수양론은 과도한 욕망의 개방과 사물의 자극으로 황폐화하고, 가치의식의 분열과 이념의 갈등으로 혼미에 빠진 현대인의 정신질병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대응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이상이요 인간의 보편적 요구로서 인격적 가능성의 계발과 인간의 품위를 향상시켜 가는 데 있어서 敬의 수양론은 우리 시대에서도 유익한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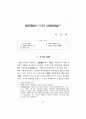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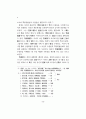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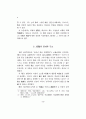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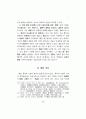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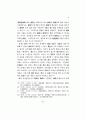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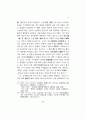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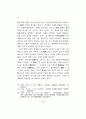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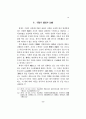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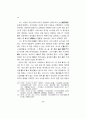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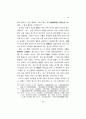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