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논
Ⅱ. 임헌회의 [오현수언]
Ⅲ. [학문]의 근본의
Ⅳ. [독서] 수학의 요
Ⅴ. 심득궁행의 학
Ⅵ. 결 논
Ⅱ. 임헌회의 [오현수언]
Ⅲ. [학문]의 근본의
Ⅳ. [독서] 수학의 요
Ⅴ. 심득궁행의 학
Ⅵ. 결 논
본문내용
59 참조
을 가리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인생의 보편적 근원의 인식인 것이요, 단순한 훈고학적 유학多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퇴계 선생은 李德弘이 처음으로 學에 뜻을 두었을 무렵 「啓蒙」을 공부하고자 희망했으나 선생은 「君第讀四書」(「敎人」장 제5조)를 가르치고 성급하게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즉 四書를 독서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朱子書는 어디서 읽는가 하면 前出된 바와 같이 「知爲學之方」하고 「感奮興起」하여 「做工積習旣久」 「然後」에 四書를 「回看」하면 味讀할 수가 있어서 身上수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에 四書를 읽고 다음에 朱子書를 읽어서 「爲學之方」을 체득한 뒤에 다시 한 번 되돌아와서 四書를 「回看」(회간 論者註)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선생은 「독서」장 제1조에서도
-169-
旣得新知 又必溫故 一卷旣畢 通誦一卷 二卷旣畢亦通誦二卷…….
라고 교시하고 있다. 「回看」은 각각의 독서에 의한 「旣得新知」의 단계를 지난 뒤에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立志 → 「方」 認知→ 回看
이라고 하는 교육의 역동적 구조의 제1相을 교시한 셈이 된다.
선생은 「小學」은 「體用具備」의 書요 『近思錄』은 「義理精微」의 書며 『心經』은 「初學用工之地」격인 書라고 인정되고 있지만 그것도 「以余觀之 無踰於朱子書」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데 이르러는 학습자의 자질과 병통이 萬不同이므로
-170-
因材施敎 對證下藥 (「讀書」장 제5조)
을 취지로 삼았다. 개성에 적합한 교육 방법에의 깊은 자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측에서 말하면 「親切的當」(제8조)임을 지적하고 있다.
初學入門之書를 당시 「小學」으로 삼아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퇴계 선생은 이 「體用具備」의 書인 소학을 마치 「修正基址」와 같은 것으로 가옥에 비유하면 「備其材木」인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大學」은 「大厦千萬間」과 같은 것으로서 「結構於基址」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나(「讀書」 제22조) 이것들의 경우에도 「潛求默玩」(제14조)「止是熟」(제12조)을 힘쓰고
書之所讀 夜必思繹(「讀書」章 제15조)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回看」의 구체상을 지적한 것일 것이다.
Ⅴ. 心得躬行의 學
퇴계 선생은 「爲己之學」과 「爲人之學」과를 峻別하고 계시다. 즉,
「爲己之學」
˚˚ ˚
以道理爲吾人之所當知
˚˚ ˚
(以)德行爲吾人之所當行
近裏著工 期 心得
而者 是也
躬行
그리고 이에 대해서
-171-
「爲人之學」
不務 心得
躬行 而飾虛徇外
以求名取譽者是也
라 하고 계시다(「敎人」장 제11조).
「道理」를 「알」고 「德行」을 「행」하는 일은 吾人의 「장차 해야 할」 바이며 이 양자가 분열, 괴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양자 일체의 착수점은 「近裏著工」이며 일상 생활의 가까운 일로부터 도리를 「心得」하고 이것을 「躬行」하는 곳에 진실한 「爲己」의 學이 있다. 그것을 게을리하고 겉치레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를 구하는 일에만 전심하는 것은 「己」를 공허하게 한 「爲人」의 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心得而躬行」을 위한 근본을 「爲先主敬」(「敎人」 제1조)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는 後學에 대해서는 붕우처럼하여 「不以師道自處」함이 긴요하며 퇴계 선생은 이것을 스스로 실행하신(金誠一)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도는 어려운 것이며, 특히 「性理大典」 등은 그 「義理精微」하여 初學者는 「猝難領解」하다. (「敎人」 제3조) 따라서 「下學上達」이라고 하더라도 「學者習久無得」에 빠져서 「至中廢」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指示本源」에 힘써(「敎人」 제4조) 諄諄誘掖」(제1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와 같은 「爲先主敬」에 의한 「諄諄誘掖」에는
必以忠信·篤實·謙虛·恭遜(「敎人」 제31조)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퇴계 선생의 敎人은 이와 같이 자신을 교사로서 우선 설정하고 가르쳐 준다는 소위 instructional situation을 유지함이 없이 「主忠信(論語)의 원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心得而躬行」하면서 부단히 「本原」의 지시를 통해서 誘掖하여 학습자의 방향 법칙성을 자극해 가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었다.
-172-
그런데 「心得而躬行」의 이 요령과 궁행은 어떻게 해서 연결이 가능한가 하면 「立志→『方』認知→回看」 事態下에 성현의 말씀이 「節節有味」(「讀書」제3조)와 같이 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於身上方有受用處」로 되어 「平易明白 處用工夫」의 境域에 도달한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궁행」에로 연결이 되어진다. 한국에는 「活看」(활간 論者註)이라는 매우 함축 깊은 용어법이 있는데 이상과 같이 일체화한 「心得而躬行」은 바로 이 「活看」의 경지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찰해 온 바 퇴계 선생의 교육사상은 위와 같이 圖示할 수 있는 역동적 圓環구조로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Ⅵ. 結 論
세상에는 「以師道自處」하고 「爲人之學」을 가르치는 교육이 많다. 교사 자신이 「儆省之實」을 지키고 「主忠信」을 요지로 해서 오히려 일보 후퇴하여 心得躬行을 거듭하면서 「因材」 「對證」의 「本源指示」를 기본 원리로 하는 퇴계 선생의 교육 지도의 실태는 丙寅(명종 21, 서역 1566)年, 內弟 尹剛中이 朱書講學을 위해서 來陶, 수개월 후 安東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그의 부친인 안동부사 尹杏堂公에 보낸 퇴계 선생 自詩에서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
-173-
朱門博約兩工程
百聖淵源到此明
珍重手書留至敎
精微心法發群英
嗟余竭力空頭白
感子收功已汗靑
更遣諸郞詢 見
病中深覺負仁情
朱門은 博約의 兩工程이오(文과 禮)
百聖의 연원이 이이에 이르러 분명하도다.
진중한 手書는 至敎를 留하며
정미한 심법이 群英을 발하니
아―내 있는 힘을 다하여 헛되이 머리는 희어지고
느끼노니 그대의 功을 거둠이 汗靑(?)이라
다시 諸郞을 보내어 見을 묻노니
병중에 깊이 仁情에 힘입음을 깨닫노라
여기에서 尹剛中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師道自處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朱門의 精微한 心法이 「群英을 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74-
(유 정 동 譯)
을 가리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인생의 보편적 근원의 인식인 것이요, 단순한 훈고학적 유학多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퇴계 선생은 李德弘이 처음으로 學에 뜻을 두었을 무렵 「啓蒙」을 공부하고자 희망했으나 선생은 「君第讀四書」(「敎人」장 제5조)를 가르치고 성급하게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즉 四書를 독서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朱子書는 어디서 읽는가 하면 前出된 바와 같이 「知爲學之方」하고 「感奮興起」하여 「做工積習旣久」 「然後」에 四書를 「回看」하면 味讀할 수가 있어서 身上수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에 四書를 읽고 다음에 朱子書를 읽어서 「爲學之方」을 체득한 뒤에 다시 한 번 되돌아와서 四書를 「回看」(회간 論者註)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선생은 「독서」장 제1조에서도
-169-
旣得新知 又必溫故 一卷旣畢 通誦一卷 二卷旣畢亦通誦二卷…….
라고 교시하고 있다. 「回看」은 각각의 독서에 의한 「旣得新知」의 단계를 지난 뒤에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立志 → 「方」 認知→ 回看
이라고 하는 교육의 역동적 구조의 제1相을 교시한 셈이 된다.
선생은 「小學」은 「體用具備」의 書요 『近思錄』은 「義理精微」의 書며 『心經』은 「初學用工之地」격인 書라고 인정되고 있지만 그것도 「以余觀之 無踰於朱子書」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데 이르러는 학습자의 자질과 병통이 萬不同이므로
-170-
因材施敎 對證下藥 (「讀書」장 제5조)
을 취지로 삼았다. 개성에 적합한 교육 방법에의 깊은 자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측에서 말하면 「親切的當」(제8조)임을 지적하고 있다.
初學入門之書를 당시 「小學」으로 삼아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퇴계 선생은 이 「體用具備」의 書인 소학을 마치 「修正基址」와 같은 것으로 가옥에 비유하면 「備其材木」인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大學」은 「大厦千萬間」과 같은 것으로서 「結構於基址」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나(「讀書」 제22조) 이것들의 경우에도 「潛求默玩」(제14조)「止是熟」(제12조)을 힘쓰고
書之所讀 夜必思繹(「讀書」章 제15조)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回看」의 구체상을 지적한 것일 것이다.
Ⅴ. 心得躬行의 學
퇴계 선생은 「爲己之學」과 「爲人之學」과를 峻別하고 계시다. 즉,
「爲己之學」
˚˚ ˚
以道理爲吾人之所當知
˚˚ ˚
(以)德行爲吾人之所當行
近裏著工 期 心得
而者 是也
躬行
그리고 이에 대해서
-171-
「爲人之學」
不務 心得
躬行 而飾虛徇外
以求名取譽者是也
라 하고 계시다(「敎人」장 제11조).
「道理」를 「알」고 「德行」을 「행」하는 일은 吾人의 「장차 해야 할」 바이며 이 양자가 분열, 괴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양자 일체의 착수점은 「近裏著工」이며 일상 생활의 가까운 일로부터 도리를 「心得」하고 이것을 「躬行」하는 곳에 진실한 「爲己」의 學이 있다. 그것을 게을리하고 겉치레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를 구하는 일에만 전심하는 것은 「己」를 공허하게 한 「爲人」의 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心得而躬行」을 위한 근본을 「爲先主敬」(「敎人」 제1조)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는 後學에 대해서는 붕우처럼하여 「不以師道自處」함이 긴요하며 퇴계 선생은 이것을 스스로 실행하신(金誠一)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도는 어려운 것이며, 특히 「性理大典」 등은 그 「義理精微」하여 初學者는 「猝難領解」하다. (「敎人」 제3조) 따라서 「下學上達」이라고 하더라도 「學者習久無得」에 빠져서 「至中廢」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指示本源」에 힘써(「敎人」 제4조) 諄諄誘掖」(제1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와 같은 「爲先主敬」에 의한 「諄諄誘掖」에는
必以忠信·篤實·謙虛·恭遜(「敎人」 제31조)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퇴계 선생의 敎人은 이와 같이 자신을 교사로서 우선 설정하고 가르쳐 준다는 소위 instructional situation을 유지함이 없이 「主忠信(論語)의 원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心得而躬行」하면서 부단히 「本原」의 지시를 통해서 誘掖하여 학습자의 방향 법칙성을 자극해 가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었다.
-172-
그런데 「心得而躬行」의 이 요령과 궁행은 어떻게 해서 연결이 가능한가 하면 「立志→『方』認知→回看」 事態下에 성현의 말씀이 「節節有味」(「讀書」제3조)와 같이 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於身上方有受用處」로 되어 「平易明白 處用工夫」의 境域에 도달한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궁행」에로 연결이 되어진다. 한국에는 「活看」(활간 論者註)이라는 매우 함축 깊은 용어법이 있는데 이상과 같이 일체화한 「心得而躬行」은 바로 이 「活看」의 경지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찰해 온 바 퇴계 선생의 교육사상은 위와 같이 圖示할 수 있는 역동적 圓環구조로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Ⅵ. 結 論
세상에는 「以師道自處」하고 「爲人之學」을 가르치는 교육이 많다. 교사 자신이 「儆省之實」을 지키고 「主忠信」을 요지로 해서 오히려 일보 후퇴하여 心得躬行을 거듭하면서 「因材」 「對證」의 「本源指示」를 기본 원리로 하는 퇴계 선생의 교육 지도의 실태는 丙寅(명종 21, 서역 1566)年, 內弟 尹剛中이 朱書講學을 위해서 來陶, 수개월 후 安東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그의 부친인 안동부사 尹杏堂公에 보낸 퇴계 선생 自詩에서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
-173-
朱門博約兩工程
百聖淵源到此明
珍重手書留至敎
精微心法發群英
嗟余竭力空頭白
感子收功已汗靑
更遣諸郞詢 見
病中深覺負仁情
朱門은 博約의 兩工程이오(文과 禮)
百聖의 연원이 이이에 이르러 분명하도다.
진중한 手書는 至敎를 留하며
정미한 심법이 群英을 발하니
아―내 있는 힘을 다하여 헛되이 머리는 희어지고
느끼노니 그대의 功을 거둠이 汗靑(?)이라
다시 諸郞을 보내어 見을 묻노니
병중에 깊이 仁情에 힘입음을 깨닫노라
여기에서 尹剛中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師道自處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朱門의 精微한 心法이 「群英을 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74-
(유 정 동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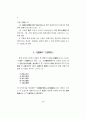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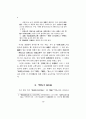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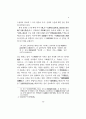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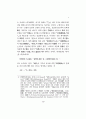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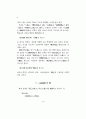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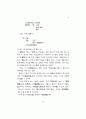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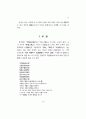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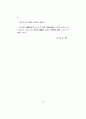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