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정산의 사상형성의 배경과 시대인식
1. 정산의 사회신분적 조건
2. 구도자의 지적 편력
3. 정산의 현실참여 지향적 역사의식
Ⅲ. 중도주의와 그 정치론
Ⅳ. 맺는말 - 중도주의에 의한 통일
Ⅱ. 정산의 사상형성의 배경과 시대인식
1. 정산의 사회신분적 조건
2. 구도자의 지적 편력
3. 정산의 현실참여 지향적 역사의식
Ⅲ. 중도주의와 그 정치론
Ⅳ. 맺는말 - 중도주의에 의한 통일
본문내용
좌우갈등속에서 敎門의 신도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 교도들간에도 좌우 어느편에 휩쓸리어 격해지지 않고 「平常心」을 가지고 난세를 빗겨가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전해진다. 그 일화를 들면 정산이 6·25전쟁전에 「영광쪽을 보니 살기가 떠 있어서 사람이 많이 다치리라 생각되므로 측근들에게 총부 근방으로 오라하였다. 또 총부 근방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아직 내려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며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고 훗날 교도 장성진에 말하였다.
) 박정훈 편저, 앞의 책, p.114.
또 6·25때 그는 총부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박제봉(朴薺奉)을 전주, 임실, 남원으로, 이태연(李泰然)은 영광으로, 정양진(丁良珍)을 김제, 정읍으로 각각 파송하면서 「지방교무들을 만나서 만부득이 어떤 조직에 가입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책임자는 되지 말라고 당부하라」고 말했다. 이 교시에 따라 지방교무들이 처신하였으므로 후일 새 세상이 돌아와서 지난일을 官에서 살펴보았으나 책임자로 활약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문책당할바가 없었다고 한다.
) 박정훈 편저, 앞의 책, pp. 112-114.
사실 당시 교단내외에서 좌우세력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을 때, 정산은 이를 중재하고 탕평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50년대 초반에 혹독한 6·25의 시련을 겪고서 좌우통합이나 상호 견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산의 중도주의는 1957년 3월 교도들에게 「대세계주의가 되라」는 법설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 『圓光』 제18호(1957년 3월), 「大世界主義者가 되라」.
그는 「개인주의, 가족주의, 단체주의, 국가주의를 초월하는 세계주의」를 주창하였으며 세계주의가 大慈大悲, 仁義情神, 博愛情神임을 설파하였다.
1961년에는 그가 이미 주창한 세계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開敎 46주년을 기념하고 정산 宗法師 회갑을 경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三同倫理에 關하여」라는 특별 法說을 폈다.
) 『정산종사법어』 十三 道運편 三四∼三七, 앞의 책, pp.342∼347. 金順任, 「三同倫理의 哲學的 照明」, 『鼎山宗師의 思想』,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편, 원불교출판사, 1992, pp.509-518.
그가 정립한 三同倫理란 앞으로 세계인류가 크게 화합하기 위한 세가지의 大同의 관계를 밝힌 것이다.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同遠道理)로서 모든 종교와 교리가 한 근원이므로 서로 화합하자는 것이다. 둘째 강령인 동기연계(同氣連契)은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이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셋째 강령은 동척사업(同拓事業)으로, 이는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같이 세상을 개척하는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대통화합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그는,
「지금 세계에는 이른바 두가지 큰 세력이 그 주의와 체제를 따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에 선 세력과 그밖에 여러 사업가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분야와 사업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세상에 벌이고 있다.」
고 전제하였다. 이는 당시(60년대) 전세계가 자본주의권, 사회주의권, 그리고 제3세계 권으로 갈라져, 체제와 이념, 정책을 달리하면서 갈등했던 상황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현상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어서 그는 주장하기를,
「그 주장과 방편이 서로 반대되는 처지에 있기도 하나, 그 근본을 추구하여 본다면 근원되는 목적은 다같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하는데 벗어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세계의 모든 사업이 중정(中正)
) 원불교에서 中正의 개념은 작업취사의 표준이 된다. 『정산종사법어』, 제六 經義편 一八, p.152.
의 길로 가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원불교가 중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러한 삼동윤리를 통해서 세계를 교화시키자는 논리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정산의 세계주의와 삼동윤리는 요즈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地球村時代, 世界化時代를 30여년전에 예견한 先見之明이다.
Ⅳ. 맺는말 - 中道主義에 의한 통일
정산의 중도주의와 거기에 연역된 그의 정치론(政治論)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통일과업을 달성하는데에 대한 몇가지 비젼을 시사받을 수 있다.
첫째, 정산의 중도주의와 진보적 자유민주주의론과 복지사회주의적 논리는 북의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소위 개인숭배에 기초한 「주체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을 극복하고 남한내의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체제혁신논리까지도 탕평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념이다.
둘째, 그렇다고 정산의 중도주의는 좌나 우, 어느 편에도 초연한 「中立主義」(neutrality)나 「제3의 길」이 아니라 左와 右 세력이나 주장을 어느편에서도 균형있게 수용하고 상생상화(相生相和)하는 유연하고 변통성(變通性)있는 입장이다.
셋째, 정산의 중도주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느 국가와의 일방적 관계나 편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국가와도 적대하지 않고 주변국가와의 다변적 우호관계를 설정하는 자주적 대외관계을 추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중도주의가 삼동윤리와 연계하여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주변4개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지침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산의 중도주의는 교단내외에 지속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정산종사의 이러한 훌륭한 中道主義의 이상이 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인 同源道理次元에서 원불교가 사회각분야에서 타종교나 타종교를 믿는 신앙인들과 얼마나 화합하고 연합하느냐에 달려있다. 둘째로 삼동윤리의 셋째 강령인 동척사업(同拓事業) 정신을 통해서 원불교인들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특히 경제협력 과정에서 남북간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산의 중도주의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외부의 국외자적 시각에서 볼 때 정산의 중도주의, 공화제는 삼동윤리를 통해서 교단내에 잔재해 있는 가족주의적 패쇄성, 교단내의 각종의 公營事에 대한 「非共和的」 독점성향을 어떻게 완화하느냐하는 문제, 그리고 교도 개개인의 私營과 종단의 공익과 어떻게 조화(調和)를 이룩하느냐 하는 문제가 종단의 후진들에게 남겨진 과업이 아닐 수 없다.
) 박정훈 편저, 앞의 책, p.114.
또 6·25때 그는 총부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박제봉(朴薺奉)을 전주, 임실, 남원으로, 이태연(李泰然)은 영광으로, 정양진(丁良珍)을 김제, 정읍으로 각각 파송하면서 「지방교무들을 만나서 만부득이 어떤 조직에 가입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책임자는 되지 말라고 당부하라」고 말했다. 이 교시에 따라 지방교무들이 처신하였으므로 후일 새 세상이 돌아와서 지난일을 官에서 살펴보았으나 책임자로 활약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문책당할바가 없었다고 한다.
) 박정훈 편저, 앞의 책, pp. 112-114.
사실 당시 교단내외에서 좌우세력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을 때, 정산은 이를 중재하고 탕평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50년대 초반에 혹독한 6·25의 시련을 겪고서 좌우통합이나 상호 견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산의 중도주의는 1957년 3월 교도들에게 「대세계주의가 되라」는 법설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 『圓光』 제18호(1957년 3월), 「大世界主義者가 되라」.
그는 「개인주의, 가족주의, 단체주의, 국가주의를 초월하는 세계주의」를 주창하였으며 세계주의가 大慈大悲, 仁義情神, 博愛情神임을 설파하였다.
1961년에는 그가 이미 주창한 세계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開敎 46주년을 기념하고 정산 宗法師 회갑을 경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三同倫理에 關하여」라는 특별 法說을 폈다.
) 『정산종사법어』 十三 道運편 三四∼三七, 앞의 책, pp.342∼347. 金順任, 「三同倫理의 哲學的 照明」, 『鼎山宗師의 思想』,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편, 원불교출판사, 1992, pp.509-518.
그가 정립한 三同倫理란 앞으로 세계인류가 크게 화합하기 위한 세가지의 大同의 관계를 밝힌 것이다.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同遠道理)로서 모든 종교와 교리가 한 근원이므로 서로 화합하자는 것이다. 둘째 강령인 동기연계(同氣連契)은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이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셋째 강령은 동척사업(同拓事業)으로, 이는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같이 세상을 개척하는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대통화합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그는,
「지금 세계에는 이른바 두가지 큰 세력이 그 주의와 체제를 따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에 선 세력과 그밖에 여러 사업가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분야와 사업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세상에 벌이고 있다.」
고 전제하였다. 이는 당시(60년대) 전세계가 자본주의권, 사회주의권, 그리고 제3세계 권으로 갈라져, 체제와 이념, 정책을 달리하면서 갈등했던 상황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현상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어서 그는 주장하기를,
「그 주장과 방편이 서로 반대되는 처지에 있기도 하나, 그 근본을 추구하여 본다면 근원되는 목적은 다같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하는데 벗어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세계의 모든 사업이 중정(中正)
) 원불교에서 中正의 개념은 작업취사의 표준이 된다. 『정산종사법어』, 제六 經義편 一八, p.152.
의 길로 가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원불교가 중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러한 삼동윤리를 통해서 세계를 교화시키자는 논리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정산의 세계주의와 삼동윤리는 요즈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地球村時代, 世界化時代를 30여년전에 예견한 先見之明이다.
Ⅳ. 맺는말 - 中道主義에 의한 통일
정산의 중도주의와 거기에 연역된 그의 정치론(政治論)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통일과업을 달성하는데에 대한 몇가지 비젼을 시사받을 수 있다.
첫째, 정산의 중도주의와 진보적 자유민주주의론과 복지사회주의적 논리는 북의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소위 개인숭배에 기초한 「주체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을 극복하고 남한내의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체제혁신논리까지도 탕평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념이다.
둘째, 그렇다고 정산의 중도주의는 좌나 우, 어느 편에도 초연한 「中立主義」(neutrality)나 「제3의 길」이 아니라 左와 右 세력이나 주장을 어느편에서도 균형있게 수용하고 상생상화(相生相和)하는 유연하고 변통성(變通性)있는 입장이다.
셋째, 정산의 중도주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느 국가와의 일방적 관계나 편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국가와도 적대하지 않고 주변국가와의 다변적 우호관계를 설정하는 자주적 대외관계을 추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중도주의가 삼동윤리와 연계하여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주변4개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지침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산의 중도주의는 교단내외에 지속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정산종사의 이러한 훌륭한 中道主義의 이상이 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인 同源道理次元에서 원불교가 사회각분야에서 타종교나 타종교를 믿는 신앙인들과 얼마나 화합하고 연합하느냐에 달려있다. 둘째로 삼동윤리의 셋째 강령인 동척사업(同拓事業) 정신을 통해서 원불교인들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특히 경제협력 과정에서 남북간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산의 중도주의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외부의 국외자적 시각에서 볼 때 정산의 중도주의, 공화제는 삼동윤리를 통해서 교단내에 잔재해 있는 가족주의적 패쇄성, 교단내의 각종의 公營事에 대한 「非共和的」 독점성향을 어떻게 완화하느냐하는 문제, 그리고 교도 개개인의 私營과 종단의 공익과 어떻게 조화(調和)를 이룩하느냐 하는 문제가 종단의 후진들에게 남겨진 과업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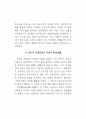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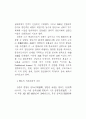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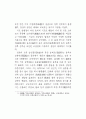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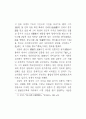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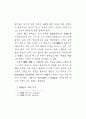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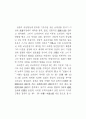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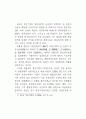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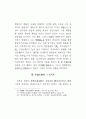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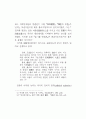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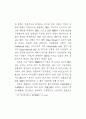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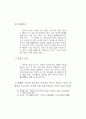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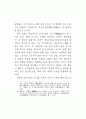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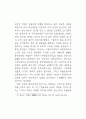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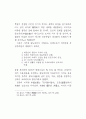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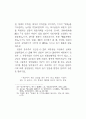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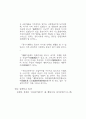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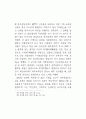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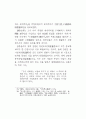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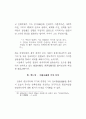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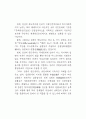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