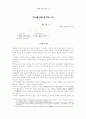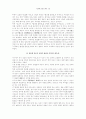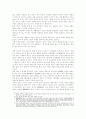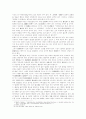목차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신불 사은은 신앙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Ⅲ. 법신불 사은이라고 불러야 하는 뜻
Ⅳ.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당처
Ⅴ. 일원의 내역은 곧 사은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신불 사은은 신앙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Ⅲ. 법신불 사은이라고 불러야 하는 뜻
Ⅳ.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당처
Ⅴ. 일원의 내역은 곧 사은
본문내용
當體-법신불의 체성)와 신앙의 당처(當處)가 함께 할 때 이것이 곧 바람직한 신앙의 활동이 되는 것으로 본 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깨달어 능히 신앙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법신불 일원상에 향하는 일차적인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이 곧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보고, 교리의 최고요 최초인 진경에 일원상만 뫼시는 뜻이 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법신불 일원상이 곧 사은을 떠나 있지 아니하고, 산은은 또한 삼나만상을 떠나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문을 다시한번 새겨보아야 할것이다.
『불교정전』 「개선론」 「법신불 일원상 조성법」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밝힌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신불의 형상을 그려 말하자면 곧 일원상이요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四重恩이니, 법신불 일원상을 숭배하기로 하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무에 금이나 먹으로 각자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비단이나 종이에 그려서 족자를 하던지 하여 벽상에 정결히 봉안하고 심고와 기도를 올릴 것이다.」
) 『불교정전』 「개선론」 「제10장 법신불일원상 조성법」 제8면 앞 뒤.
법신불의 형상을 그려보면 단적으로 법신불 일원상이요 이것은 곧 사은의 상징으로 기도나 불공에서 밝히는 싱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상대처인 사은의 상징으로도 일원상을 뫼셔서 기도나 불공을 할 때에 능히 혼돈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 즉 법신불 일원상은 그 내역이 곧 사은이라고 밝힌 점에서 보면 법신불 일원상은 곧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일원상을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곧 사은이라는 의미가 된다. 사은이란 의미는 첫째 무한한 세계에 다북차 있는 셰계라는 점이요, 둘째 무한한 세계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되어, 능히 세상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법신불 일원상이 곧 우주에 다북차있고, 서로 은혜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원리를 찾아보면 법신불이 곧 보신불로 이루어지는 원리를 찾아서 서로 떠날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알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써 법신불 일원상이 신앙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기도의 대상 또는 불공의 대상으로써 사은에 향하는 것은 당연한 길이 된다는 것을 밝혀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앙의 대상을 따라 신앙의 방법에 들어가 심고와 기도나, 불공의 행위를 할 때에는 신앙의 대상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당처를 찾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법신불 사은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즉 과거에는 천지에게 당한 죄복으로 불공을 할때에도 등상불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으로 불공을 할 때에도 등상불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으로 불공을 할 때에도 등상불에게 불공을 하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으로 불공을 할 때에도 등상불에게 불공해왔으나 우주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불공하는 것이 능히 성공할수 있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정전』 「수행편」 「불공하는법 」 전서 80.
이것은 곧 법신불일원상을 신앙하게 되면 능히 기도하고 불공을 할 때에는 사은에게 당하는 것으로 되고 삼나만상에게 이르는 길이된다.
그러나 이것은 곧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되면 능히 법신불 사은에게까지 그 능력이 미처지는 원리가 있다. 이것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원리라고 본 것이다.
법신불은 어느 개체의 신앙이 아닌 반면 두루개체에 까지 미치는 원리가 담겨져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신불 일원상과 법신불사은과 혼동해서는 아니되지만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되면 법신불 상은의 당처에게까지 능히 신앙할 수 있는 길을 발견되는 것을 깨달어야 한다.
즉 구경의 진리는 현실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경의 진리와 현실의 세계를 혼돈하는 착오를 이르켜서는 않되는 것을 알어야 한다.
이 원리가 소태산 대종사가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밝힌 법신불 일원상을 내세운 원리이다. 대령을 찾아 진경에 이르게 되면 능히 개령에 까지 힘미처지는 것이로되 대령(大靈)이 곧 개령(個靈)이라는 혼돈된 생각을 하게되면 대령과 개령의 의미자체가 흐려진다.
따라서 대종경 교의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밝힌점을 찾아보면 이미 알 수 있다.
「김영신(金永信)이 여쭈기를 「사은 당처에 실지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 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계(齋戒)하고 법신불을 향하여 각기 서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禪定)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어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 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 『대종경』 교의품 16 전서 121.
여기에서 법신불 일원상을 통해서 사은당처에 실지불공하는 길과 형상없는 곳에 진리불공하는 길을 밝힌 의미를 찾어야 하되, 진리불공과 실지불공과 혼돈해서 않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하되 법신불 사은의 당처에게까지 힘 미치도록 하는 불공의 길을 밝힌 점을 능히 찾아내야 할 것이로되 법신불 일원상의 원리를 깨닫고 법신불 사은에게까지 신앙의 공덕이 미처지도록 하는 것을 찾아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깨달어 능히 신앙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법신불 일원상에 향하는 일차적인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이 곧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보고, 교리의 최고요 최초인 진경에 일원상만 뫼시는 뜻이 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법신불 일원상이 곧 사은을 떠나 있지 아니하고, 산은은 또한 삼나만상을 떠나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문을 다시한번 새겨보아야 할것이다.
『불교정전』 「개선론」 「법신불 일원상 조성법」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밝힌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신불의 형상을 그려 말하자면 곧 일원상이요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四重恩이니, 법신불 일원상을 숭배하기로 하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무에 금이나 먹으로 각자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비단이나 종이에 그려서 족자를 하던지 하여 벽상에 정결히 봉안하고 심고와 기도를 올릴 것이다.」
) 『불교정전』 「개선론」 「제10장 법신불일원상 조성법」 제8면 앞 뒤.
법신불의 형상을 그려보면 단적으로 법신불 일원상이요 이것은 곧 사은의 상징으로 기도나 불공에서 밝히는 싱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상대처인 사은의 상징으로도 일원상을 뫼셔서 기도나 불공을 할 때에 능히 혼돈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 즉 법신불 일원상은 그 내역이 곧 사은이라고 밝힌 점에서 보면 법신불 일원상은 곧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일원상을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곧 사은이라는 의미가 된다. 사은이란 의미는 첫째 무한한 세계에 다북차 있는 셰계라는 점이요, 둘째 무한한 세계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되어, 능히 세상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법신불 일원상이 곧 우주에 다북차있고, 서로 은혜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원리를 찾아보면 법신불이 곧 보신불로 이루어지는 원리를 찾아서 서로 떠날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알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써 법신불 일원상이 신앙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기도의 대상 또는 불공의 대상으로써 사은에 향하는 것은 당연한 길이 된다는 것을 밝혀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앙의 대상을 따라 신앙의 방법에 들어가 심고와 기도나, 불공의 행위를 할 때에는 신앙의 대상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당처를 찾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법신불 사은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즉 과거에는 천지에게 당한 죄복으로 불공을 할때에도 등상불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으로 불공을 할 때에도 등상불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으로 불공을 할 때에도 등상불에게 불공을 하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으로 불공을 할 때에도 등상불에게 불공해왔으나 우주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불공하는 것이 능히 성공할수 있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정전』 「수행편」 「불공하는법 」 전서 80.
이것은 곧 법신불일원상을 신앙하게 되면 능히 기도하고 불공을 할 때에는 사은에게 당하는 것으로 되고 삼나만상에게 이르는 길이된다.
그러나 이것은 곧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되면 능히 법신불 사은에게까지 그 능력이 미처지는 원리가 있다. 이것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원리라고 본 것이다.
법신불은 어느 개체의 신앙이 아닌 반면 두루개체에 까지 미치는 원리가 담겨져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신불 일원상과 법신불사은과 혼동해서는 아니되지만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되면 법신불 상은의 당처에게까지 능히 신앙할 수 있는 길을 발견되는 것을 깨달어야 한다.
즉 구경의 진리는 현실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경의 진리와 현실의 세계를 혼돈하는 착오를 이르켜서는 않되는 것을 알어야 한다.
이 원리가 소태산 대종사가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밝힌 법신불 일원상을 내세운 원리이다. 대령을 찾아 진경에 이르게 되면 능히 개령에 까지 힘미처지는 것이로되 대령(大靈)이 곧 개령(個靈)이라는 혼돈된 생각을 하게되면 대령과 개령의 의미자체가 흐려진다.
따라서 대종경 교의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밝힌점을 찾아보면 이미 알 수 있다.
「김영신(金永信)이 여쭈기를 「사은 당처에 실지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 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계(齋戒)하고 법신불을 향하여 각기 서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禪定)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어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 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 『대종경』 교의품 16 전서 121.
여기에서 법신불 일원상을 통해서 사은당처에 실지불공하는 길과 형상없는 곳에 진리불공하는 길을 밝힌 의미를 찾어야 하되, 진리불공과 실지불공과 혼돈해서 않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하되 법신불 사은의 당처에게까지 힘 미치도록 하는 불공의 길을 밝힌 점을 능히 찾아내야 할 것이로되 법신불 일원상의 원리를 깨닫고 법신불 사은에게까지 신앙의 공덕이 미처지도록 하는 것을 찾아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